 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챗GPT는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질문·요구에 대응해 답변을 생성하는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AI)이다. 기존 웹처럼 여러 출처의 정보를 일일이 검색·종합·요약할 필요가 없기에 가히 혁명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모색·세련화·확장이 가능하다. 주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구성 요소, 예컨대 배경·원인·세부이슈·방안을 포괄적으로 정리해준다. 유사 사례를 요소별 비교도 해주고 군더더기를 걷어낸 개조식 요점 정리도 가능하다. 당연한 듯하지만, 당장 답하기는 어렵고 정리하자니 시간이 걸리며 항목도 빠뜨릴 수 있는 주제에 답해주는, 콜럼버스 달걀이기도 하다.
소크라테스의 산파법과 같이 Q&A를 반복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원하는 깊이까지 학습할 수 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는 통계학을, 식을 종이에 써가며 공부하니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디지털화된 소프트웨어를 만지작거리다 보면 원리를 깨우치기도 쉬워졌다. 물어본 질문의 맥락을 이해해 눈높이에 맞춘 답변을 내놓기에 개별 학습이 가능하다. 엔트로피 법칙이나 수인의 딜레마와 같이 어려운 주제라도 원하면 초등학교 수준으로 설명해주기에 본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만큼 학습 동기가 강해지고 자신감도 가지게 된다.
챗GPT는 변해야 할 교육 방식에 유용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학생은 지식을 탐구하는 능동적인 구축자가 되어야 한다. 이들은 정보 검색에 능한 세대이지만, 경험은 부족하다. 그러기에 교사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지만, 일방적 정보의 발신자가 아닐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 변모해야 한다. 마치 미네르바나 태재대학의 액티브 러닝(Active Learning) 방식과 같이.
교육에 필요한 덕목은 인내와 무간섭, 넛지와 같은 조력의 섬세함이다. 지식은 이전의 지식·경험을 새롭게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구성되면서 진화하기에 완전체가 될 수 없다. 창의적으로 되라며 커리큘럼을 꽉꽉 채워 학생의 자유도를 제한하거나 창의적 수업의 조건을 빡빡이 규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가득 참을 경계하는 술잔', 계영배의 정신 없이는 도돌이표다.
아니나 다를까 제대로 된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들 수 있는 인재도 길러내지 못하면서 교육부는 서둘러, 국민의 도입 유보 청원이 한 달 만에 5만명을 훌쩍 넘겼는데도, 세계 최초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며 난리였다. 다행히 연기되었지만, 첨단이네 정보기술(IT)이네 하는, 콘텐츠에는 변화 없는 형식에 구애받기 전에 AI 기초인 벡터·행렬과 같은 선형대수 과목부터 부활할 일이다. 단순 계산 문제를 뭐하러 가르치느냐는 비판도 있으나 이는 필요한 직관·활용도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글 쓰는 능력을 조리 있고 간결하게 답변하는 챗GPT 수준으로 어떻게 끌어올릴지도 고민할 일이다. 인생의 상당 부분을 입시를 위해 공부시킨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에 실제로 살아가고 일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도 갖추지 못한 채 사회에 배출된다. 안전을 위해 수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글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사는 데 더 중요하다. 이대로라면 챗GPT의 일자리 대체는 점차 심각해질 것이다. 교육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콘텐츠다.
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nclee@hansung.ac.kr

 6 hours ago
2
6 hours ago
2

![[기고] 지자체 결산, 핵심은 '전문가적 의구심'이다](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글로벌 이슈/김상운]반세기 만에 재현된 韓日 ‘안보 협력’](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2/12/131021108.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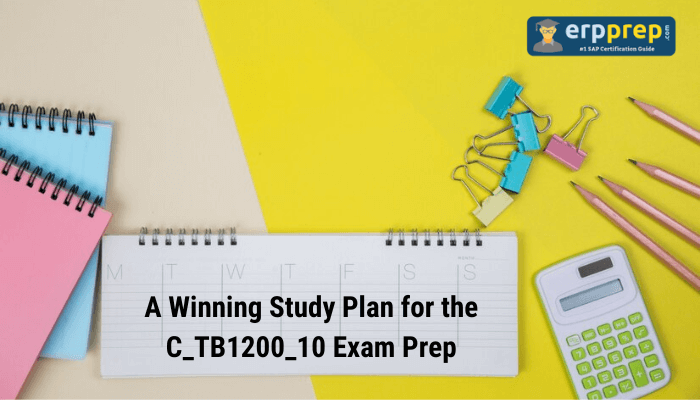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