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 바젤 대학교 연구자들은 자기애(나르시시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배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배척당하는 빈도가 더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진은 ‘과대 망상적 나르시시즘’ 성향을 가진 이들을 분석했다. 이들은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특별대우를 기대하며, 끊임없는 칭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배척당한다는 느낌은 개인이 사회적 신호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른 달라지는 주관적인 경험이다.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배척당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저 배제당한다고 믿을 수도 있다”라고 ‘성격 및 사회심리학 저널’(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에 발표한 논문의 제1저자인 크리스티안 뷔트너(Christiane Büttner·사회심리학 박사후 연구원) 박사가 연구 보도자료에서 말했다.과학연구 전문 매체 스터디파인즈(Studyfinds)에 따르면 연구진은 서로 다른 7개의 연구를 통해 7만 7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살펴봤다. 먼저 독일인 1592명이 응답한 자기애와 소외감에 관한 설문 분석을 통해 나르시시즘 특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룹에서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연구원들은 323명에게 특별히 개발한 스마트폰 앱을 2주 동안 사용하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파티에 초대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명백한 일이든 대화중에 무시당하는 것과 같은 미묘한 일이든 소외감을 느낄 때마다 앱에 기록했다.
이번에도 결과는 같았다. 나르시시스트들이 더 높은 빈도로 소외감을 느낀다는 반응을 보인 것.
연구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세 가지 주요 원인을 찾아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을 배제하는 듯 한 징후에 매우 민감했다. 그들은 보낸 문자에 대한 답이 늦으면 고의적인 무시로 보거나 사소한 결정을 할 때 자신에게 묻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자신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둘째,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와 어울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했다. 25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사람들은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는 일관되게 거리를 두는 선택을 했다. 이는 ‘자기실현적 예언’과 같다. 나르시시스트들의 행동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실제로 그들을 소외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일종의 ‘자업자득’인 셈이다.
셋째, 이는 악순환을 만든다. 연구진은 뉴질랜드에서 14년간 7만 2000여명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누군가의 자기애적 행동이 증가했을 때, 당사자가 다음 해에 더 많은 배제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중요한 점은 배제 경험으로 인해 그들의 자기애적 특성이 이듬해에 더 악화됐다는 것이다.
“나르시시즘은 사회적 배제를 초래할 수 있지만, 배척 자체도 자기애적 특성의 발달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뷔트너 박사는 설명했다.
연구진은 자기애를 나타내는 두 가지 주요 방식을 확인했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업적에 대해 자랑하는 것을 추구한다. 성과를 떠벌리거나 신중하게 연출한 사진으로 자신의 ‘완벽한 삶’을 포장해 소셜 미디어에 게재하는 식으로 존중받길 원한다.
반면 더 적대적인 경쟁적 행동으로 표출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다른 사람이 주목을 받을 때 공격적으로 반응하거나 지위와 인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특징이다.
나르시시즘은 숨길 수 없는 특성으로 보인다.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낯선 사람에 관한 짧은 영상을 보고 그와 함께 일하고 싶은지를 결정했다. 배경 정보가 전혀 없는데도 사람들은 자기애적 특성을 보이는 사람을 꾸준히 피했다. 이는 짧은 만남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자기애적 행동을 알아차릴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런 행동 양식은 직장에서도 일어난다.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이들이 이메일 발송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직장 동료와의 점심 식사에 초대받지 못하거나, 회의에서 그들의 아이디어가 무시당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들은 종종 방어적으로 반응하는데,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조직에서 이런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연구자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행동을 악화시켜 모든 사람에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자기애적 특성이 강한 사람들이 배제당한다고 느낄 가능성이 더 높다면, 이는 직장이나 사회 집단에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일을 초래할 수 있다. 동시에 배제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면 그들이 공격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뷔트너 박사가 말했다.
이번 연구는 이들을 배제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다루는 더 나은 방법을 집단이나 조직이 찾아내야 서로 윈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 day ago
5
1 day ago
5

![“어릴 땐 차범근이 된 듯 축구…지금은 공 차는 자체로 행복”[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2/21/131069593.1.jpg)
![[생성 AI 길라잡이] 신형 PC의 특권? 윈도우 그림판 AI 기능 활용하기](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2/21/131081245.1.jpg)
![[생활 속 IT] 알고리즘의 축복, 유튜브 ‘인급동’ 기준은?](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2/21/131080381.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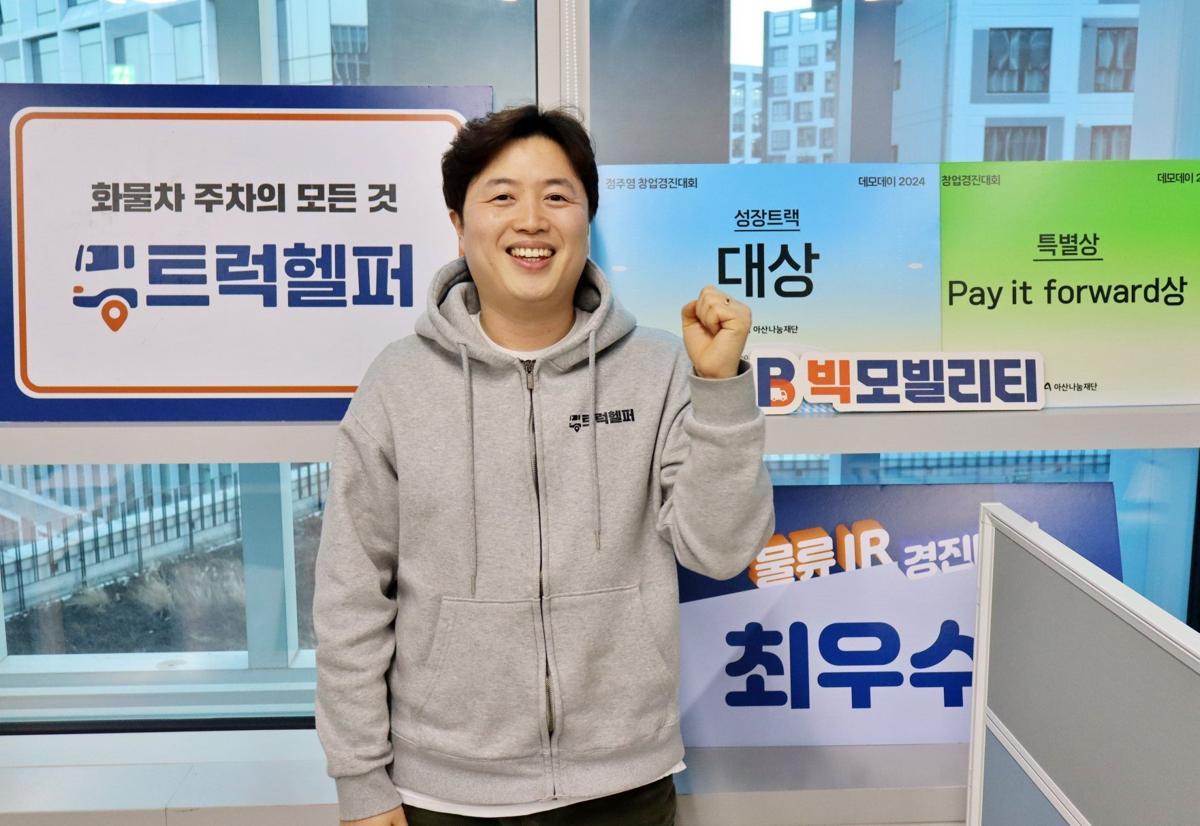
![[리뷰] 성능과 배터리 효율의 극적인 조화, 삼성 갤럭시 북5 프로](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2/21/131079109.1.jpg)

![[크립토 퀵서치] 100만 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 방식이 변경된 이유는?](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2/21/131077791.1.jpg)


![[글로벌 이슈/김상운]반세기 만에 재현된 韓日 ‘안보 협력’](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2/12/131021108.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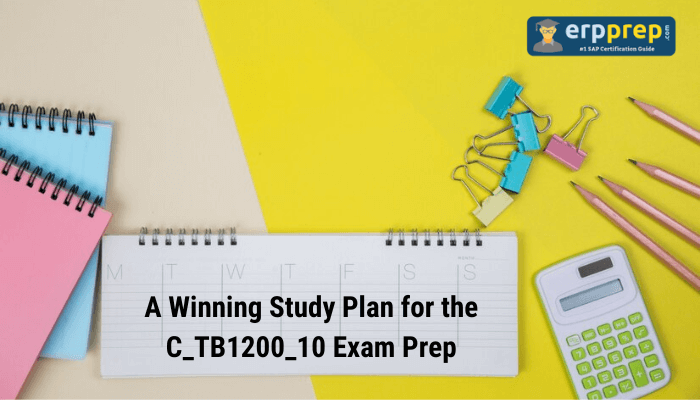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