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미국의 리더십이 무너진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7.26939819.1.jpg)
수출 시장에 먹구름이 물러갈 것 같지 않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는 오랜 동맹국도 얼마든지 적대시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경제적으로 트럼프 정부 내내 인플레이션은 관세 부과의 부메랑이 될 것이다. 관세 부과로 정부 수입은 늘겠지만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면 금리를 움직여야 하므로 미국 국민은 앞으로 생활이 팍팍해지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수출 길이 암울해진 수출국 국민의 삶은 말할 것도 없다. 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외국에 대항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구호는 감정적 애국주의에 직관적으로 호소하는 문구로서는 훌륭하지만 하나씩 따져보면 위대하게 만들 메커니즘이 결여돼 있다.
트럼프 정부의 문제는 미국을 부강하게 하기 위한 정책만을 선호한다는 게 아니다. 원칙 없는 정책, 지난 정권이 약속한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이 무효화하는 행동 등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바이든 정부 때 칩스(CHIPS)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느라 모든 국가가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면서 선거에 이기는 정권은 선례를 찾기 힘드니만큼 다음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는 미국의 정책에 공조하기가 어려워졌다. 굵직한 새 정책이 도대체 몇 년을 갈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경쟁을 벌이는 중국에만 호재일 뿐이다.
쿼드(QUAD)를 비롯해 정치적 동맹도 과연 실상은 어떨지 궁금해진다. 오랜 이웃 캐나다는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정치, 군사적 리더십을 따르고 긴밀히 협력할 것인가. 다음으로 괴롭힐 대상은 멕시코, 일본, 그리고 한국이다. 모두 지리적 이웃이거나 오랜 기간 군사적 동맹인 국가들이다.
당혹스러운 결정은 경제 영역 밖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는 오래전 세계무역기구를 비롯한 다자협정을 비난하거나 탈퇴해왔다. 경제적 다자협정뿐 아니라 최근 인공지능 윤리적 원칙과 거버넌스에 관해 미국은 오랜 기간 협의해왔지만 마지막 순간에 사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근 몇몇 경우에 근거해 생각해보면 일단 미국은 정치적으로나 혹은 기술적으로나 미국이 주도하지 않는 국제정치적 상황을 수용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그 경우 대부분 시장의 자율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탈퇴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트럼프 정부 1기 때부터 바이든 정부까지 미국은 경제 안보를 내걸면서 모든 것은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한 자유주의 접근 대신 산업정책을 도입해왔다. 넓게 보면 반도체산업의 미국 부흥을 노리는 칩스, 미국 주도의 친환경 산업 발전이 목표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모두 전형적인 산업정책이다. 전 정권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실제로 발생했고 미국만 뒤로 빼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국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국의 일련의 행동 기저에는 반드시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단기’에 발생할 ‘직접적’ 이익을 제외하면 미국의 행보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규제가 될 수 있는 글로벌 규범이 불완전한 협상으로 끝난 것은 학습에서 규제의 제약을 더 많이 받을 후발자에게는 기회로 인식될 수 있겠지만 그 기회 역시 장기 로드맵을 세우기에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미국의 동태와 정책당국의 정서를 파악하는 데 온 신경이 몰려 있는 것 같다. 신문의 국제면만 봐도 미국 외 다른 나라의 움직임은 비중이 확 줄었다. 이제 국제 경제는 글로벌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 바야흐로 국가별 각자도생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보인다.

 3 days ago
5
3 days ago
5
![[김순덕의 도발]이재명의 ‘신뢰 리스크’는 어찌 넘을 건가](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3/26/131287679.1.png)
![[사설]“누굴 원망하겠나”… 이웃 돕다 구순 노모 잃은 아들의 눈물](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3/28/131307998.1.jpg)
![[횡설수설/우경임]의대생 일단 복귀는 한다는데…](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3/28/131307657.2.jpg)
![[오늘과 내일/문병기]관세전쟁에 담긴 트럼프의 세 가지 승리 법칙](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3/28/131307987.1.jpg)
![[동아시론/임도빈]이젠 ‘전문성’ 아닌 ‘당파성’ 갖춰야 공직에 오르는 나라](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3/28/131307983.1.jpg)
![[광화문에서/이미지]산불은 바뀌는데 우리는 그대로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3/28/13130797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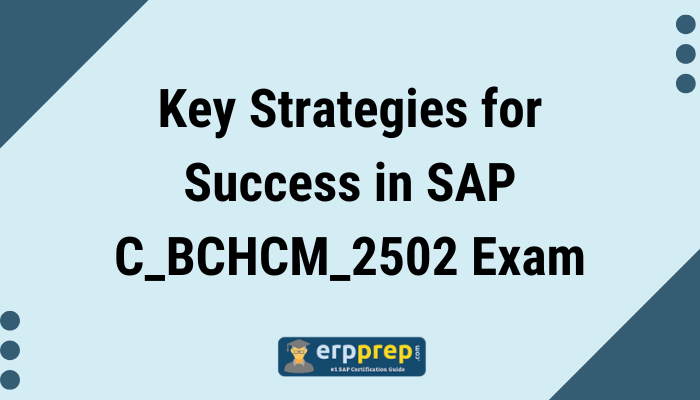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