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진화대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데 이어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번지고, 다음날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을 덮쳐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산림과 재산 피해와 함께 현재까지 사망자만 20명이 넘는다. 그 와중에 어제는 의성에서 산불을 진화하던 30년 된 노후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 사고로 모든 진화 헬기의 운항이 일시 중단됐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자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가적 재난이다.
성묘객의 실화로 시작된 의성 산불이 며칠 만에 경북 북부 지역을 초토화할 만큼 번진 건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이다. 하지만 대형 화재에 대비한 장비와 전문인력 부족이 초기 대응 실패를 부른 것도 사실이다. 경북은 산림이 울창한 산악 지역이 많은 데다 그 절반을 차지하는 게 화재에 취약한 소나무다. 하지만 국내 산불 진화 헬기는 공중에서 물을 충분히 살포할 수 없는 중소형 기종이 대부분이다. 경상북도가 ‘119 산불 특수 대응단’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인력 역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번에 사망한 헬기 조종사가 73세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대피 과정에서의 미숙한 대처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불길을 잡는 노력과 별개로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자임을 감안해 더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시켰어야 했다. 급하게 탈출하려던 차 안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온 점만 봐도 당국의 대처가 안이했음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자연재해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산불은 ‘연중화, 대형화’하고 집중호우와 태풍 등도 더 강력해졌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다. 초대형 산불이 빈발하는 미국은 물론 일본도 며칠째 동시다발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은 불길을 잡고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는 데 모든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겠지만, 사태 수습 후엔 반드시 국가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 생지옥 같은 화마를 겪은 피해 주민들이 충격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국가의 책무다.

 3 days ago
6
3 days ago
6
![[김순덕의 도발]이재명의 ‘신뢰 리스크’는 어찌 넘을 건가](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3/26/131287679.1.png)
![[사설]“누굴 원망하겠나”… 이웃 돕다 구순 노모 잃은 아들의 눈물](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3/28/131307998.1.jpg)
![[횡설수설/우경임]의대생 일단 복귀는 한다는데…](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3/28/131307657.2.jpg)
![[오늘과 내일/문병기]관세전쟁에 담긴 트럼프의 세 가지 승리 법칙](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3/28/131307987.1.jpg)
![[동아시론/임도빈]이젠 ‘전문성’ 아닌 ‘당파성’ 갖춰야 공직에 오르는 나라](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3/28/131307983.1.jpg)
![[광화문에서/이미지]산불은 바뀌는데 우리는 그대로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3/28/13130797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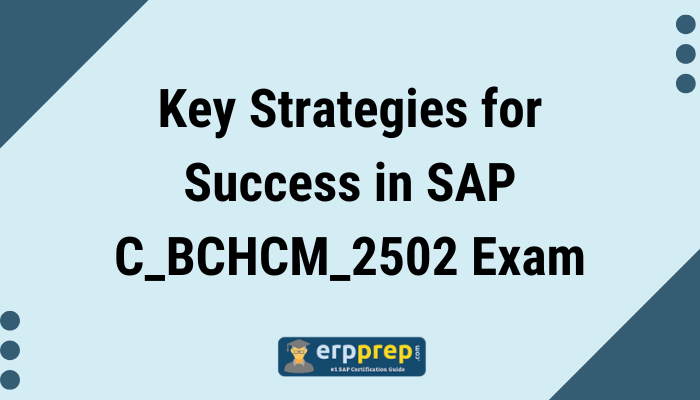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