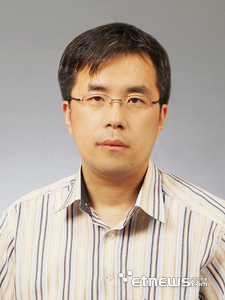 임영철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영철 연구위원·UN/CEFACT 동아시아 지역 라포터
임영철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영철 연구위원·UN/CEFACT 동아시아 지역 라포터2017년 미국 다수의 가정에서 아마존의 인공지능(AI) 스피커 알렉사가 TV에서 나온 소리를 실제 주문으로 착각해 인형 하우스를 대량 주문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주문 오류로 신속히 인식·처리돼 단순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이는 현실세계에서도 자동화된 거래의 오작동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현재 AI는 단순한 검색 및 대화 도구를 넘어, 계약을 검토·체결하고 이행까지 관리하는 AI 에이전트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현재는 사람이 직접 인터넷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주문이나 거래신청을 하지만, 머지않아 AI 에이전트가 사람의 대화나 의견을 바탕으로 주문과 거래신청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AI 관련 법과 제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 AI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은 기술 발전보다 늦게 마련되지만, 지나치게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혁신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힘들 것이다.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2024년 '자동화된 계약 모델법(MLAC)'을 채택해 AI, 스마트 계약, 기계 간 거래(M2M)에서의 계약 성립과 이행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입법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모델법은 자동화된 전자계약과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1996년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2005년 전자계약협약을 기반으로 AI 및 자동화 시대에 요구되는 책임 귀속과 예측 불가능한 행위에 관한 세부 규정을 추가해 자동화 거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미국은 통일전자거래법(UETA) 제14조에서 전자 에이전트간 상호작용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법(ETA)에서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으로 체결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단순히 전자적 방식이라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1항 제2호에서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로 간단히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만으로는 자동화된 전자계약의 효력과 책임 등을 충분히 포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령에는 다음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동화된 전자계약의 정의와 범위를 AI, 스마트 계약, 기계 간 거래(M2M)까지 포함해 규정하고 둘째, '사람의 비개입'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배제하는 조항을 둬야 한다. 셋째, 책임 귀속, 오류 처리 등 운영 규칙을 UNCITRAL모델법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AI 기술은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되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이제는 법률이 신뢰 기반을 확실히 보장해야 할 때이다. 자동화된 전자계약을 명확히 승인하는 법적 근거가 신속히 마련되면 국내 AI 기술 개발과 AI 전환(AX)은 한층 가속될 것이며 동시에 AI강국 진입 및 글로벌 AI경쟁력도 확고히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임영철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영철 연구위원·UN/CEFACT 동아시아 지역 라포터 yclim@kisa.or.kr

 6 hours ago
3
6 hours ago
3
![[기고] 서민 주거권·재산권, 부동산 공정거래 질서에 달렸다](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박준동 칼럼] 과세 무풍지대, 코인 시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509/07.39658782.1.jpg)


![[속보] 특검 “윤, 계엄논의 작년 3월부터 시작…원내대표도 인지 가능성”](https://pimg.mk.co.kr/news/cms/202509/03/news-p.v1.20250903.0f7ed213f6e645018311c6ea68869499_R.jpeg)


![생성형AI 끼고 상담하는 설계사…보험도 인공지능 혁신 진행 중[금융가 톺아보기]](https://pimg.mk.co.kr/news/cms/202509/04/news-p.v1.20250904.4e6ff2e473814eba97c10d2b6c1ee0e0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