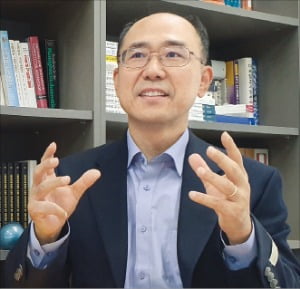
“게임 기업들이 대기업이 되면서 엔지니어들이 개척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샐러리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사진)은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예전처럼 밤샘 개발을 감수하는 문화는 사라지고, 이제는 근로 시간과 수당을 따지는 ‘월급쟁이 마인드’가 업계에 자리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정 근로시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산업 특성에 맞는 유연 근로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게임업계는 퇴근 후에도 일하는 ‘그림자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2018년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공식 근무시간 내 처리하지 못한 업무가 원격 작업이나 무급 초과근무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획일적 규제 속 고강도 근무체제를 일컫는 ‘크런치 모드’가 확산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근로시간을 줄이려던 제도가 되레 보이지 않는 과로를 부추기는 역설이 됐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게임 종사자의 회사 밖 비공식 노동시간은 주당 5.7시간으로, 2020년 2.4시간보다 2.3배 늘었다. 공식 근로시간도 주 44.7시간으로 전 산업 평균 노동시간(38.7시간)보다 15%가량 길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정식 노동과 그림자 노동이 동시에 증가한 업종은 게임업계가 사실상 유일하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업무까지 고려하면 실제 노동 강도는 주 52시간을 크게 웃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지난해 국내 게임 수출액은 83억9400만달러(약 12조 1402억원)로 전년 대비 6.5% 줄며 2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업계에서는 노동 규제가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꼽는다.
위 학회장은 “게임은 프로젝트 단위로 개발되기 때문에 출시 직전과 직후 3~6개월은 버그 수정, 안정화, 신규 콘텐츠 작업이 한꺼번에 몰린다”며 “최소 1년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 해당 시기에는 집중해서 일하고, 그 외 시기에는 쉴 수 있는 유연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 투입량이 성과로 직결되는 개발 파트, 창의성이 중요한 기획 파트, 상시 대응이 필요한 고객서비스(CS) 파트가 뒤섞여 있는데, 단기간 단위 탄력근로제로는 현장 고충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소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탄력근무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 학회장은 “겉으로는 똑같이 52시간제를 적용받지만, 대기업은 초과 수당 지급이나 대체 인력 투입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은 재택근무 권고나 단기 휴가로만 대응한다”며 “중소기업은 인력 풀이 작아 직원 한 명의 공백이 곧바로 프로젝트 차질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게임 개발 주기 또한 제도 개편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콘진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게임의 평균 개발 기간은 19개월로, AAA급 대작은 최소 3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린다. 위 학회장은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하고, 서비스 대응까지 요구되면서 개발 기간은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콘진원 조사에서도 종사자의 58.7%가 주 52시간제 유연화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크런치 모드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43.5%로 전년보다 6%포인트 증가했다.
정부와 노동계는 주 4.5일제·주 4일제 같은 근로일 단축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보다 산업 특성을 반영한 유연화 제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

 8 hours ago
3
8 hours ago
3










![[속보] 특검 “윤, 계엄논의 작년 3월부터 시작…원내대표도 인지 가능성”](https://pimg.mk.co.kr/news/cms/202509/03/news-p.v1.20250903.0f7ed213f6e645018311c6ea68869499_R.jpeg)


![생성형AI 끼고 상담하는 설계사…보험도 인공지능 혁신 진행 중[금융가 톺아보기]](https://pimg.mk.co.kr/news/cms/202509/04/news-p.v1.20250904.4e6ff2e473814eba97c10d2b6c1ee0e0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