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감각전시실… 성덕대왕신종 소리 완벽 체험
4m LED 화면서 종소리 감상… 모서리마다 4대 우퍼스피커
3초 간격 맥놀이 완벽하게 재연… 의자엔 진동기 달아 파동 느껴


성덕대왕신종은 771년 완성된 통일신라의 범종이다. 구경이 약 323cm에 이른다. 국내에 남아있는 가장 큰 종이자 유일하게 소리가 온전히 보전된 대종(大鐘)으로 꼽힌다. 하지만 유물 보호를 이유로 1992년 이후로는 주기적 타종이 중지돼 그 소리를 듣기 어려워졌다. 새로 만든 전시실은 국립경주박물관이 2020년부터 약 3년간 진행한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타종 및 녹음한 종소리를 체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감각전시실은 성덕대왕신종이 내는 특별한 소리의 핵심인 ‘맥놀이(소리 강약이 반복되며 길게 이어지는 현상)’를 제대로 구현하는 게 중요했다. 성덕대왕신종은 고유 주파수인 64.18Hz와 64.52Hz가 서로 간섭하면서 소리가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한다. 종 내외부 구조가 미세하게 비대칭을 이루는 것 등이 그 원인이다.전시를 감수한 조완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성덕대왕신종은 약 3초 간격으로 맥놀이 주기가 발생한다. 1초보다 짧으면 귀에 거슬리고, 10초 이상이면 알아채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대종이 있지만, 이렇게 균형감 높은 맥놀이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전시실은 모서리마다 저주파 소리가 강화된 스피커(우퍼) 각각 1대씩 4대를 배치됐다. K팝 기획사나 레이블에서 자주 사용되는 모델이다. 사운드 디자인을 맡은 곽동엽 씨는 “우퍼 한 대로도 충분한 공간이지만 소리가 중앙으로 모였다가 확산하는 느낌을 내고자 4대를 활용했다”며 “여러 대가 동시 재생되면 동일한 주파수의 소리끼리 부딪쳐 사라질 수 있기에 우퍼별로 2∼3ms씩 시간차를 두고 종소리를 재생한다”고 말했다.
전시실 내 의자에는 ‘셰이커’(소리의 압력을 전달하는 진동기)가 부착돼 있다. 피부로도 맥놀이를 느끼게끔 한 것. 셰이커는 통상 드럼 연주자의 의자나 전자음악 DJ의 발판에 사용되는 장치다. 곽 씨는 “우퍼를 여러 대 쌓아서 음량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진동이 전달되지만 다른 전시실의 유물에 지장을 준다는 문제가 고려됐다”고 했다. 의자에 앉으면 폭 4m, 높이 4m의 대형 LED 화면을 통해 종소리를 눈으로도 감상할 수 있다. 소리 파형이 마치 회오리처럼 빠르게 퍼져나가는 형상을 표현한 미디어아트다. 실제 성덕대왕신종을 쳤을 때 발생하는 음향신호 정보를 토대로 제작됐다. 조 연구원은 “성덕대왕신종 주위로 마이크로폰 120개를 둘러싸고서 신호를 측정했다”며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종소리의 파동 형태를 재구성한 것”이라고 했다.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2 days ago
4
2 days ago
4

![[오늘의 운세/04월 09일]](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08/13137628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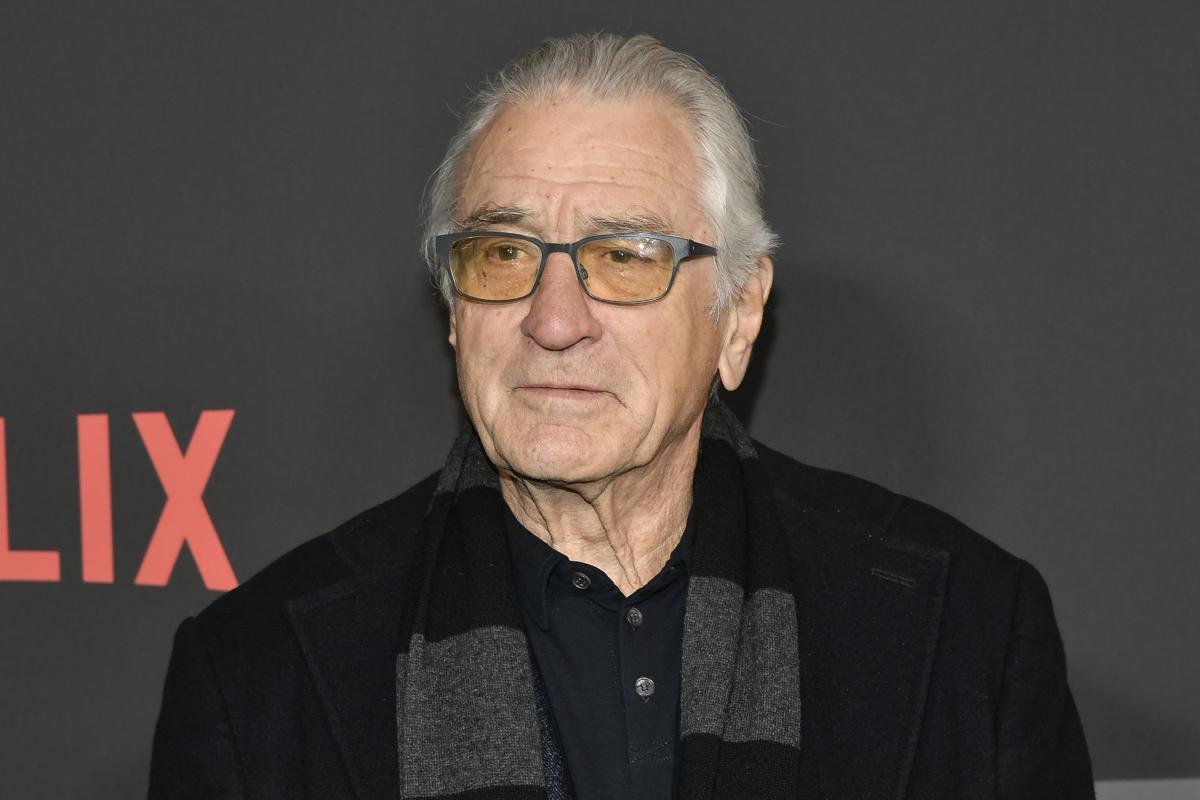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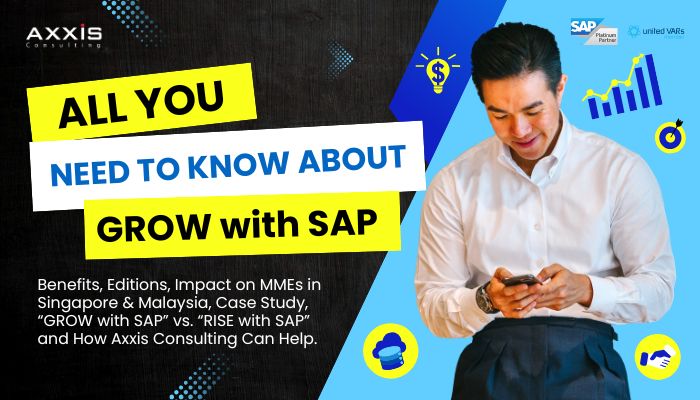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