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칼럼] '빵과 서커스' 유혹을 피하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07.21397599.1.jpg)
‘삶은 죽음을 배경으로 그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언젠가 읽던 책 한구석에 메모한, 역사학자 에른스트 칸토로비치의 낡은 문구가 문득 떠올랐다. 지난달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 15만 명이나 방문했다는 소식이 책이 처한 궁핍한 현실과 ‘삶과 죽음’처럼 선명하게 대비됐기 때문이다.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시대, ‘책의 종언’이란 말이 낯설지 않은 때에 책을 찾는 이들로 행사장이 북새통을 이뤘다. 이보다 초현실적인 장면이 있을까.
매일 아침 노트북을 열자마자 전날 도서 판매량을 살펴본다. 유명 저자를 섭외해도, 표지를 예쁘게 꾸며봐도, 시류에 맞춰 기획해도 별 차이가 없다. 종류와 관계없이 좀처럼 판매가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필자가 몸담은 출판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내 출판산업은 내리막길에 들어선 지 오래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출판업계 총매출은 4조8911억원으로 전년 대비 0.1%(약 52억원) 감소했다. 외형상 국내 출판 시장은 내수 기준으로 라면 시장(약 3조원)과 과자 시장(약 4조원)보다 크다.
반면 실상은 허약하다. 매출의 대부분은 초·중·고교 교과서와 학습참고서 등 교육 도서(4조1622억원)에서 나온다. 통상 ‘책’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단행본 시장은 4653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그나마 지난해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출판업계가 ‘반짝 특수’를 누린 성적이 이 정도다.
사람들은 정말로 책을 안 읽는다. 국내 성인 중 1년간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을 모두 포함해 단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의 비율은 43.0%(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2023년)에 불과하다. 책은 부담스러운 ‘짐’이 된 지도 오래다. 책을 꺼리는 것은 이사업체만이 아니다. 대학과 공공도서관마저 앞다퉈 책을 버린다. 지난해 울산대 중앙도서관은 보유 장서 92만 권의 절반인 45만 권을 한꺼번에 폐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2019~2023년 5년간 주요 대학 도서관에서 내다 버린 장서만 874만 권이 넘는다.
책이 설 자리도 빠르게 좁아지고 있다. 인공지능(AI)은 묻는 말에 빛의 속도로 맞춤형 답변을 제공한다. 그에 비하면 끙끙대며 색인을 뒤져봐도 찾는 정보가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책은 도무지 경쟁 상대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책을 읽자’고 외치는 것은 부질없어 보인다. 허탈한 마음을 감추고자 ‘양서는 늘 소수의 선택이었다’며 자기 위안을 해보기도 한다. 출판업자 사정이 어려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1787~1790년 독일 괴셴출판사가 총 8권짜리 ‘괴테 전집’을 출간했을 때도 <칼비고> 17부, <괴츠> 20부, <이피게니> 312부, <에그몬트> 377부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262부만 판매됐을 뿐이었다지 않나.
그렇다면 오늘날 책만이 지닌 경쟁력은 무엇일까. AI 시대에 책은 너무 구식이다. 집필부터 제작까지 품도 많이 들고 수정도 쉽지 않다. 장서를 갖춘 공간에서 지적 만족을 느끼는 이도 크게 줄었다. 이래저래 ‘안 된다’는 단점만 눈에 띈다.
하지만 책을 읽지 않고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은 분명히 있다. 소위 ‘창조적’인 작업이다. AI가 학습하는 기본 정보도 결국에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가장 부가가치가 큰 정보는 사람만이 생산한다. 무엇보다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판단력을 갖추는 데 책만 한 수단이 없다. 책장에 밑줄을 그어가며 자기 생각을 날카롭게 벼리지 않으면 권력자가 던져주는 ‘빵’ 한 조각, 진실을 가리는 ‘서커스’에 눈이 멀 수밖에 없다. 책이 벼랑 끝에 선 시대에 곱씹어보는 진정한 책의 가치다.

 7 hours ago
1
7 hours ago
1
![운동 좀 한다면 다 이거 찼다…요즘 난리난 '이 시계' 뭐길래 [이혜인의 피트니스 리포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01.41015243.1.jpg)
!["회원권이 10억"…'VVIP 타깃' 20층짜리 강남 초호화 사교클럽 둘러보니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01.41012206.1.jpg)



![[포토] 환구단 앞 '담장 없는 정원' 새단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AA.41014025.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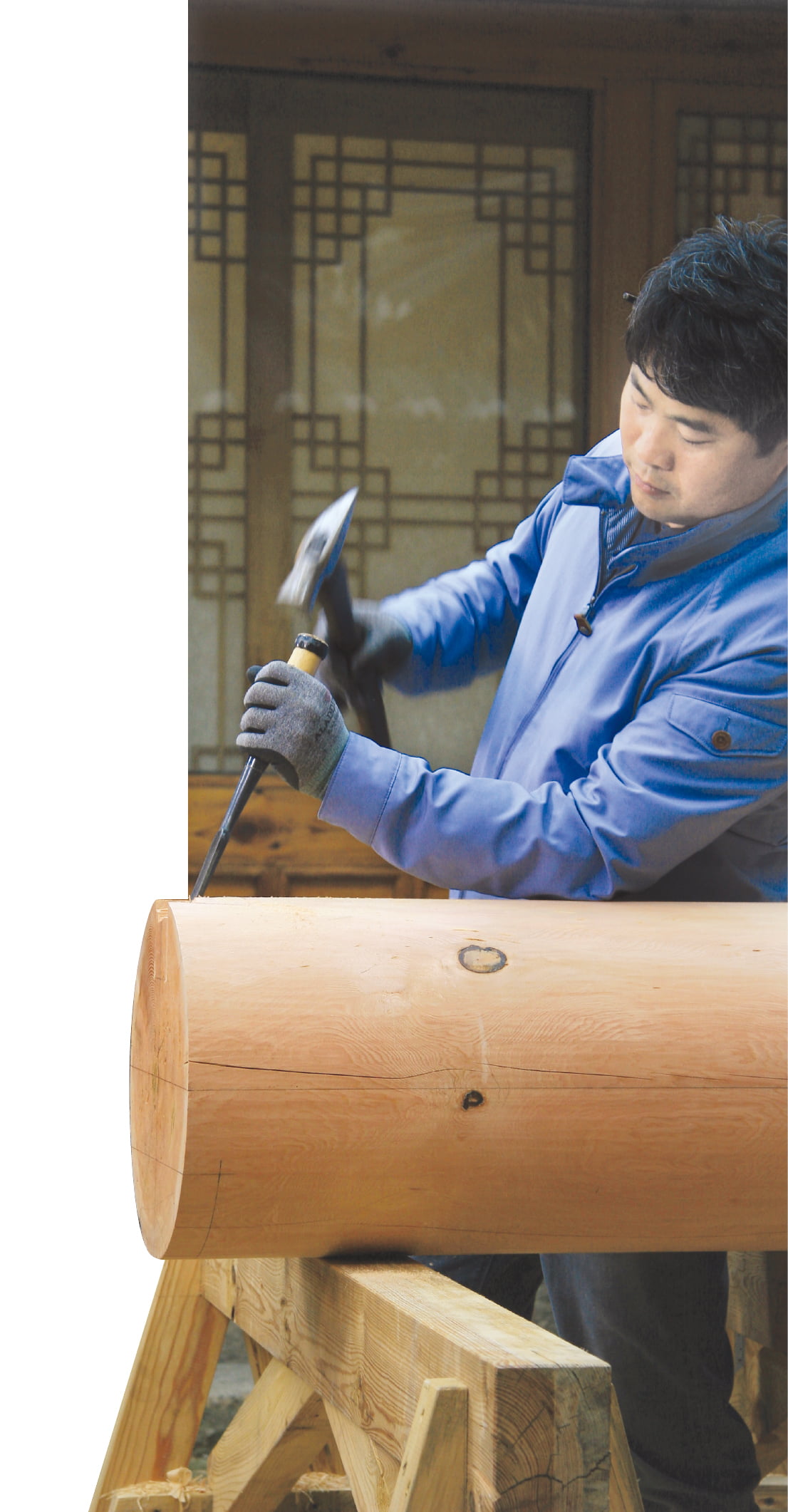





![[속보]李대통령, G7 참석차 내일 출국…“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 조율”](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6/15/131807427.2.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