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올린 거장들이 빚어낸 ‘장미’의 두 얼굴
<The Last Rose of Summer>'Tis the last rose of summer,
Left blooming alone.
All her lovely companions
Are faded and gone.
No flower of her kindred,
No rose-bud is nigh,
To reflect back her blushes,
Or give sigh for sigh!
-Thomas Moore, 1805
<여름의 마지막 장미>
여름의 마지막 장미, 홀로 피어 있네.
사랑스러운 벗들은 모두 시들어 떠났네.
그녀와 비슷한 꽃은 하나도 없고,
가까이엔 꽃봉오리조차 없네.
그녀의 붉은 뺨을 비춰줄 이도,
한숨을 함께 나눌 이도 없네.
-토마스 무어, 1805
홀로 피어 있는 꽃을 통해 상실의 슬픔, 남겨진 이의 쓸쓸함을 표현한 이 시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에 애틋함을 자아낸다. 아일랜드의 시인 토마스 무어는 <젊은이의 꿈>이라고 불리던 아일랜드 전통 민요 선율에 이 시를 얹어 <여름의 마지막 장미(The Last Rose of Summer)>라는 노래를 완성했다. 이 곡은 1813년 그가 발표한 『아일랜드 멜로디(Irish Melodies)』 제5권에 수록되며 널리 알려졌고, 이후 수많은 작곡가에 의해 편곡되었다.

펠릭스 멘델스존은 피아노를 위한 <‘여름의 마지막 장미’ 주제에 의한 환상곡(Fantasy on 'The Last Rose of Summer', Op.15)>을 작곡했고, 더들리 벅은 오르간을 위한 <’여름의 마지막 장미’ 주제에 의한 변주곡(Variations on ‘The Last Rose of Summer’, Op.59)>을 남겼다. 이후에도 이 곡은 재즈 아티스트 니나 시몬, 팝페라 가수 사라 브라이트만 등 다양한 음악가들의 앨범에 실리기도 했다.
시대와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랑을 받은 이 곡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이자 작곡가였던 이들에게도 선택되었다. 벨기에 출신의 앙리 비외탕과 오스트리아 출신의 하인리히 빌헬름 에른스트는 각각 이 노래를 바탕으로 한 작품을 남겼다.

앙리 비외탕은 샤를 드 베리오의 제자로, 프랑코-벨기에 악파의 계보를 잇는 대표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였다. 그는 미국 연주 여행을 통해 접한 아일랜드와 미국의 민요 여섯 곡을 재해석해,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품집 『부케 아메리칸(Bouquet américain, Op.33)』을 완성했다. (당시 미국에는 아일랜드 출신 이민자들이 다수 정착해 있었고, 그들이 부르던 민요는 미국에서 널리 불리고 있었다.)
이 소품집의 다섯 번째 곡인 <여름의 마지막 장미(Last Rose of Summer)>는 ‘risoluto(단호하게)’라는 음악 용어가 적힌 짧은 서주로 시작되며 강렬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리고 곧이어 등장하는 원곡의 민요 선율은 이와 대조적으로 더욱 애수 어린 느낌을 가져다준다.
니콜로 파가니니를 깊이 동경하며 그 뒤를 이어간 하인리히 빌헬름 에른스트는, 극적인 표현력과 초절기교를 겸비한 연주자이자 작곡가였다. 에른스트의 <'여름의 마지막 장미' 주제에 의한 변주곡(Variations on ‘The Last Rose of Summer')>은 『바이올린을 위한 여섯 개의 다성음악 연습곡(Six Polyphonic Studies for Violin)』에 수록된 여섯 번째 곡으로, 왼손 피치카토, 연속된 하모닉스의 진행, 슬러 스타카토 등 고난이도의 테크닉이 총동원된, 변주곡 형식의 작품이다. 또한, 어떠한 반주도 없이 바이올리니스트 혼자 연주해야 하는 독주곡이기 때문에, 연주자가 이 곡을 깨끗하고 유려하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기량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비외탕과 에른스트가 같은 민요의 선율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들이지만, 두 곡은 여러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외탕의 곡은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함께 어우러져 연주하는 곡인 반면, 에른스트의 곡은 오롯이 바이올린 혼자 연주를 이끌어가야 하는 무반주곡이다. 더불어, 비외탕의 곡은 ‘소품집'에, 에른스트의 곡은 ‘연습곡'에 수록되어 있는 만큼, 두 작품이 가진 분위기와 성격도 다르다.
[앙리 비외탕의 <여름의 마지막 장미> – Burkhard Godhoff의 연주]
비외탕의 <여름의 마지막 장미>는 에른스트의 곡에 비해 비교적 부담 없이 연주할 수 있는 소품이다. 이 곡은 약 7분 정도의 길이로, 처음에 강렬하게 등장했던 서주의 선율과 민요 선율이 교차하며 반복되는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 민요 선율이 처음 등장할 때는 바이올린의 단선율로 순수하게 표현되며, 피아노는 그 아래에서 정적인 코드로 받쳐준다. 그러나 곧 조성이 변화되고 주선율의 음역대도 높아지면서 한층 더 고조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된다.
[하인리히 빌헬름 에른스트의 ‘여름의 마지막 장미' 주제에 의한 변주곡 - Yu-Chein Tseng의 연주]
반면, 에른스트의 <여름의 마지막 장미>은 ‘다성음악 연습곡’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변주곡 형식으로 진행된다. 비외탕의 곡에 비해 긴 서주의 진행 이후에 테마가 등장하고, 네 개의 변주, 그리고 피날레가 연이어 나오며 마무리된다. 테마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민요 본래의 선율은 가장 위 성부에 위치하며, 아래 성부의 화성 진행은 이 멜로디를 반주처럼 채워준다. 때문에 연주자 혼자서도 여러 성부를 노래하는 듯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곡은 안토니오 바치니에게 헌정된 작품으로, 단순한 연습곡을 넘어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의 그랜드 피스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떨기 장미꽃'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이 곡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다양한 모습으로 되살아났다. 그리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이올리니스트 비외탕과 에른스트, 이 두 사람은 모두 바이올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여름의 마지막 장미>를 새롭게 재탄생시켰다. 그들의 시선은 달랐어도, 음악에 담긴 마음만큼은 닮아 있었다. 같은 뿌리에서 피어난 두 장미는 서로 다른 향기와 색깔을 지닌 채 우리의 귀를 사로잡는다.
이준화 바이올리니스트

 8 hours ago
1
8 hours ago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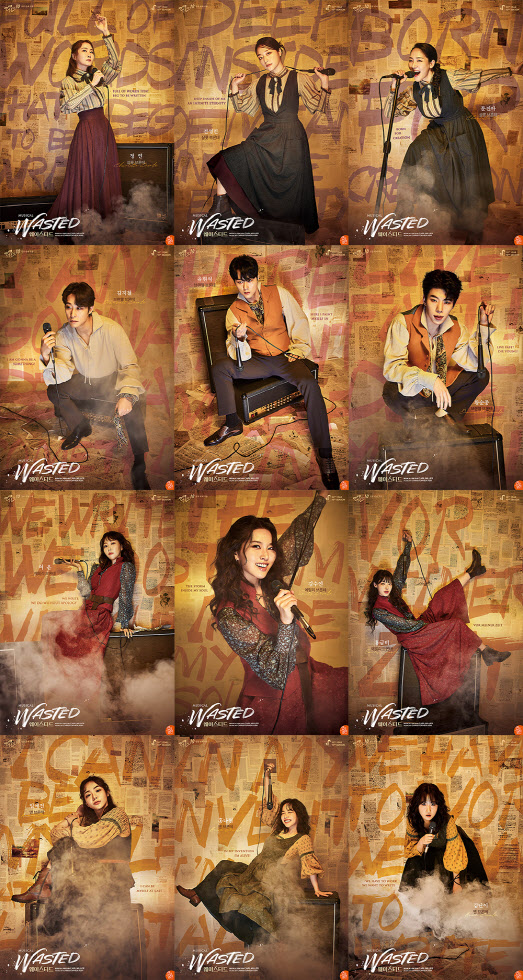






![[속보]李대통령, G7 참석차 내일 출국…“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 조율”](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6/15/131807427.2.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