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 청년들로 붐비는 종로3가역 6번 출구 저녁 7시. 출구 앞에 놓인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면 알록달록 무지개가 뒤덮인 새로운 세상이 등장한다. 작지만 자유로운 세상, 그 세상에 입성하고 나면 그토록 원했던 동지가 있고, 연인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의 ‘내’가 있다. 겹겹의 허울과 위선 없이 지낼 수 있는 곳. 나와 같은 수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 나에게 씌워진 세속의 차별 따위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유일한 곳.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살기 위해 북한 땅에서 온 나지만,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가 있을 둥지를 찾은 듯하다.
박준호 감독의 첫 번째 장편 영화 <3670>(위에 서술한 대로 종로3가역 6번 출구 7시에 일어나는 번개를 의미한다)은 성 소수자이자 탈북민 ‘철준’ (조유현)의 외로운 일상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원하는 상대를 만나 하룻밤을 보내지만 상대는 마음으로 교감하길 원하는 철준이 부담스럽다. 안쓰러운 마음이 든 무명의 상대는 그에게 게이 커뮤니티 앱을 소개해준다. 앱을 통해 철준은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커뮤니티 모임에 나간다. 모임에서 철준은 한없이 자유롭고 쾌활한 동갑내기 친구 ‘영준’ (김현목)과 마주하게 된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철준과 영준은 이후에도 재미난 만남을 이어 나간다. 철준은 그토록 원했던 게이 친구들과 그들의 문화를, 영준은 미지의 세계에서 온 매력적인 친구에 대해 익히고, 애정을 키운다.

한 탈북민, 혹은 게이 청년의 성장영화로 읽힐 수 있지만 <3670>은 사실상 그보다 훨씬 넓고 깊은 이야기와 담론을 제시하는 영화다. 이를테면 영화는 두 가지의 다른 소수성을 가진 인물을 통해 그것의 ‘다른 점’이 아닌 그것의 ‘보편성’에 대해 말한다. 즉 탈북민이라는 문화적 혹은 정치적 소수성과 퀴어라는 성적 소수성이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교차하고 양립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철준이 가진 복합적인 정체성은 사실상 지극히 보편적이면서도 일상적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그를 대하는 게이 친구들의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북에서 왔냐는 누군가의 물음에 철준이 그렇다고 대답할 때, 친구들의 반응은 당황스러움이 아닌, 호기심과 반가움이다. “거기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 “넌 어떻게 알았어?” 등등. 비슷한 맥락에서 ‘복합적인 소수성’은 영준에게서도 보여진다. 그는 게이이면서 취업에 계속 실패하고 있는 취준생이다. ‘엄카’를 쓰기 위해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인 엄마와도 어쩔 수 없이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어쩌면 그의 소수성은 가리려야 가릴 수도 없는 ‘무직’이라는 현실에 더 크게 기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시간이 흘러 철준은 커뮤니티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영준은 그렇게 적응해 나가는 철준에게 묘한 질투심을 품게 된다. 이들 사이의 작은 감정적 균열은 큰 오해의 대립을 만들어내고 둘은 결국 멀어진다. 그럼에도 철준의 삶은 멈춤 없이 진화한다. 그는 대학에 진학했으며, 가까운 탈북 친구들에게 커밍아웃을 했고, 무엇보다 캐나다로 ‘공식적인 방황’을 위해 어학연수를 떠나는 영준과도 화해를 했다. 이제 모임에 갈 때면 혼자 옷도 차려입을 줄 알고, 처음 만난 친구들 앞에서 주저 없이 노래를 하는 숫기도 생겼다. 이 작은 낙원동에서 그는 더 큰 세상과 마주할 용기와 이제껏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멋진 자아를 찾은 것이다.

<3670>은 실로 가슴 벅찬 영화다. 영리하게 만들어진 이야기와 캐릭터도 감탄스럽지만 이 작은 영화가 전하는 세계관과 가치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영화의 두 메인 캐릭터, 철준과 영준은 20대 청년이면서 게이이고 직업이든 전공이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무제(無題)의 존재들이며, 저 나라에 살지만 이 나라로 가보고 싶은 방랑민이다. 말하자면 이들이 가진 갖가지 소수성, 혹은 마이너리티의 기질들은 우리 모두가 가진 그것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가 동경하는 그것이 아닐까. 소수에서 보편을 찾지 못한다면 (그 어떤) 커뮤니티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자격이 없다. 영화 <3670>은 유연하지만 단호하게 말한다.
김효정 영화평론가•아르떼 객원기자

 2 weeks ago
14
2 weeks ago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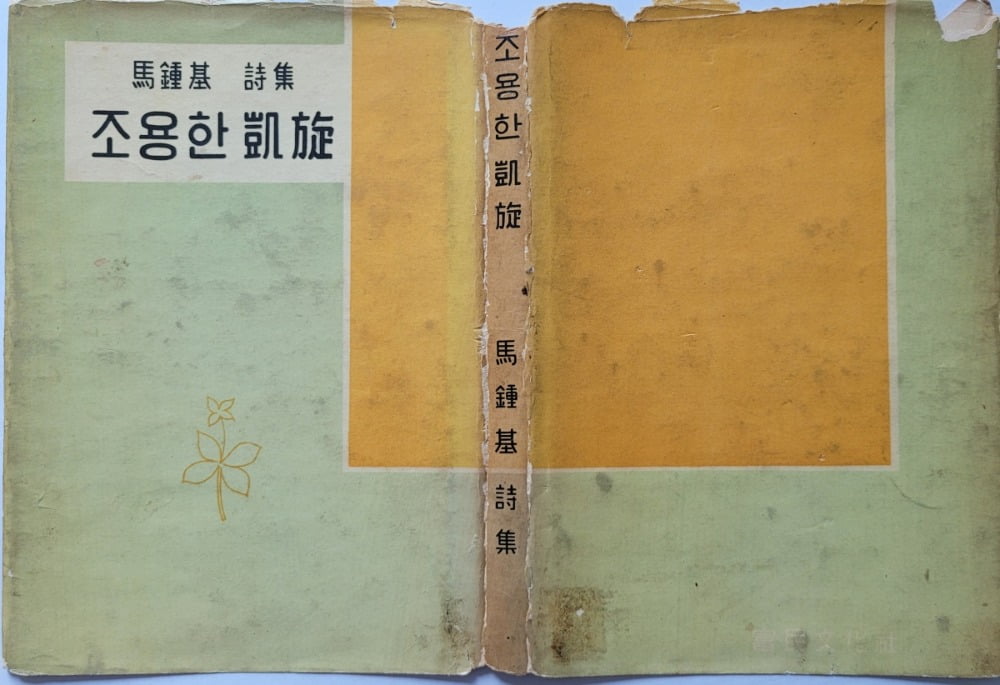
![[포토] 서울숲재즈페스티벌2025](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9/PS2509220124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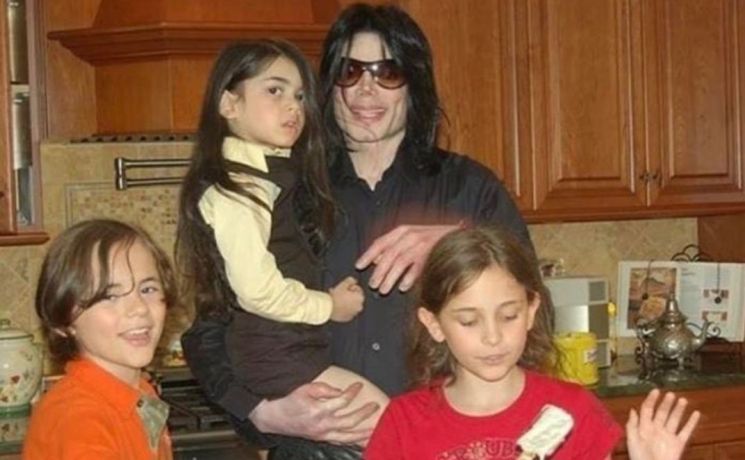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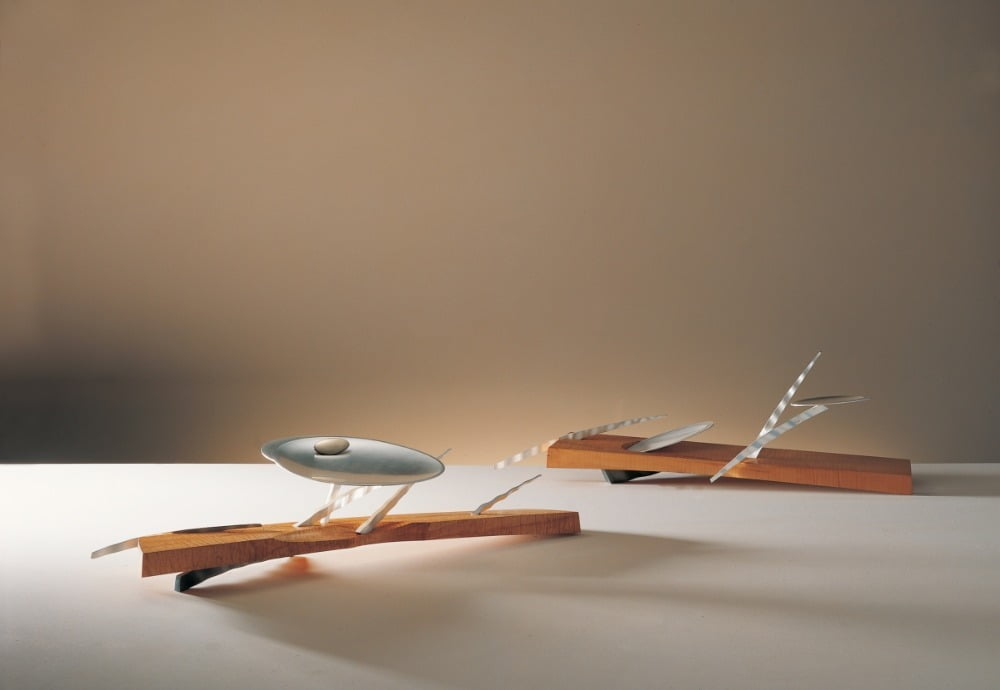




![[속보] 특검 “윤, 계엄논의 작년 3월부터 시작…원내대표도 인지 가능성”](https://pimg.mk.co.kr/news/cms/202509/03/news-p.v1.20250903.0f7ed213f6e645018311c6ea68869499_R.jpeg)


![생성형AI 끼고 상담하는 설계사…보험도 인공지능 혁신 진행 중[금융가 톺아보기]](https://pimg.mk.co.kr/news/cms/202509/04/news-p.v1.20250904.4e6ff2e473814eba97c10d2b6c1ee0e0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