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ESG] 스페셜 리포트③ - 새 정부에 바라는 ESG 정책은 1. 기후·에너지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 지구환경학 박사 기고
![[이재명 ESG 정책-기후·에너지] “기후 위기 먼 미래 아냐…기후 인식·정책 수용성 높여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506/01.40918546.1.jpg)
딱 석 달 전, 안동에서 단 며칠 만에 여의도 면적의 166배에 달하는 숲이 사라지는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다. 1만8000여 가구가 불탔고, 30명이 사망했으며, 2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안동에 산불이 나기 두 달 전에는 미국 LA에서 서울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숲이 불탔으며, 경제적 피해는 약 200조 원으로 추정된다. 기후 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일상과 직결된 재난임을 알 수 있다.
에너지 가격 불안정, 자원 경쟁, 식량 위기까지 이어지는 복합적 충격은 우리 삶과 정치·경제·사회 전체의 전환을 요구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1990년 약 5.8톤이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6년 12.1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23년에도 약 11.8톤으로 세계 평균(약 4.9톤) 2.4배에 달한다. 기술 발전만으로는 실질적 전환을 이루기 어렵다.
에너지 절약 기술이 오히려 더 큰 냉장고, 더 큰 차를 소비하게 만드는 마케팅 수단이 되는 역설도 존재한다. 이제는 국민의 기후 인식과 정책 수용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 기후를 고려한 의사결정과 생활방식이 보편화되도록 하고, 시민이 기후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용성 높이는 ‘공정하고 참여적인’ 정책 설계 필요
기후 정책 수용성은 정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의 2024년 국민 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6.5%가 정부의 기후 대응을 ‘중요하다’고 평가했지만, 정책에 공감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청년층의 공감도가 낮았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에서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수요 감축을 강조한다. 특히 시민들의 일상적 행동과 의사결정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2050년까지 40~70%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유럽기후조약’(2021)을 통해 시민참여형 기후 행동을 제도화하고 있다. 한국도 이처럼 제도적 시민참여를 통해 정책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시민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기획자’로서 기후 전환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행동과학에서는 단순한 정보 제공만으로는 행동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영국 바스대학교의 2020년 연구(CCC & CAST) 결과에서는 “지식은 정서적 공감, 사회적 규범, 구조적 제약과 결합될 때 비로소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2021년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린 연구도 친환경 행동을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회적 비교’와 ‘재정적 유인’을 꼽았다.
서초구 방배숲환경 도서관은 시민의 약 70~80%가 텀블러를 사용하고, 제로웨이스트 카페와 무포장 판매 등 환경 설계를 통해 하루 1000명이 이용해도 쓰레기양이 20리터 한 봉지에 불과하다. 노원구의 데이터 기반 학교 에너지 절감 교육도 실천을 병행하며 전기 사용량 감소와 에코 리더 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기후 행동은 시민의 결단이나 희생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행동 전환을 위해서는 제도와 시스템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배달 앱의 ‘일회용품 기본 미제공’ 구조 변경이 가져온 거대한 일회용품 감축 효과가 대표적 사례다.
국제환경개발연구소(IIED)와 레어(Rare)는 실질적 기후 행동을 위해서는 3가지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첫째는 ‘모두가 실천한다’는 사회적 규범 형성이고, 둘째는 시간·비용·정보 부족 같은 실천 장벽 제거, 셋째는 즉각적 보상과 성과의 시각화를 통한 긍정적 피드백 제공이다. 또 개인 실천이 공동 효과로 확장된다는 성공 사례의 공유와 시각화, 반복 가능한 체험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제품 수리권 보장, 과잉 포장 규제, 공동 실천 피드백 제공 등은 시민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도서관, 학교, 지역사회는 행동 실험장이자 확산의 거점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 행동을 설계하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행동 과학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협업해야 한다.
기후 정책은 단순히 기술개발이 아니라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다. 인식·수용성·행동을 연계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시민과 정책을 연결해야 한다. 정책은 시스템을 바꾸고, 시스템은 행동을, 행동은 미래를 바꾼다. 새 정부가 기후 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문을 열고 길을 만들어가는 설계자이며 시민의 강력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 지구환경학 박사

 9 hours ago
3
9 hours ago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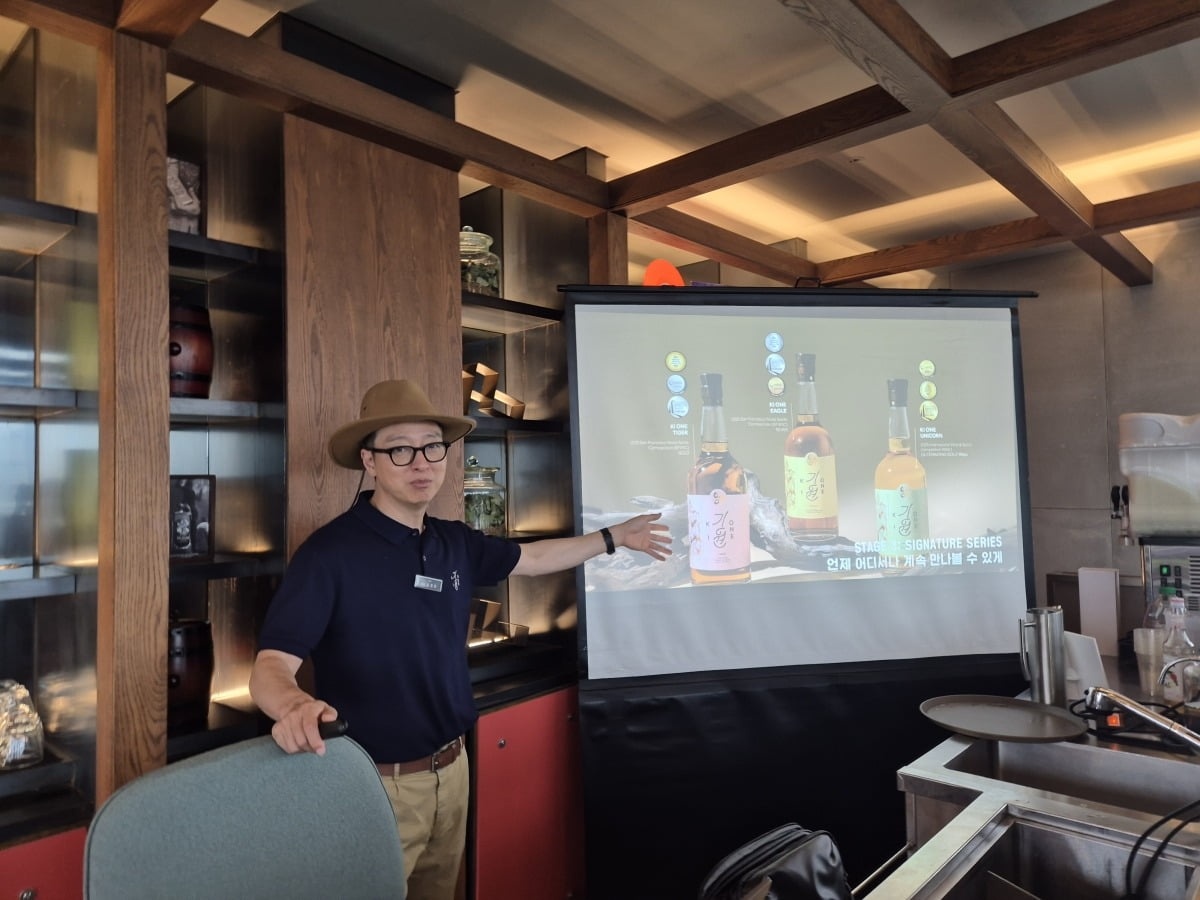


!['트럼프 OBBB', 친환경 에너지 '축소'·석유·가스 '확대' [원자재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01.41011120.1.png)








![[속보]李대통령, G7 참석차 내일 출국…“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 조율”](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6/15/131807427.2.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