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민 칼럼] 마크롱·고이즈미 불러낸 미완의 연금개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7.36042267.1.jpg)
연금 개혁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2004년 일본 연금 개혁의 주역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모토는 “권위(authority)는 작가(author)에게서 나온다”는 말이다. 리더는 가장 먼저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자기 언어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고이즈미가 일본 국민에게 던진 연금 개혁의 명제는 ‘들어올 돈보다 나갈 돈이 많으면 망한다. 따라서 더 내고 덜 받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단순 진리를 밀어붙이는 것이었다.
연금 개혁에서 거론되는 방법론이 거의 다 동원됐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 등 모수 개혁은 물론 기대여명과 가입자 수에 따라 실질 연금액을 깎는 자동조정장치도 도입했다. 이른바 ‘거시 경제 슬라이드‘다. 고이즈미 연금 개혁의 화룡점정은 공무원 연금 같은 직역연금과 ‘후생연금’으로 불리는 국민연금의 통합 작업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그의 임기 중 실현되지 못했다. 연금 개혁으로 인기를 잃어 실각하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그러나 이후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이를 되살려 통과시켰다. ‘100년 안심 플랜’이라는 일본 연금 개혁은 이처럼 정치적 희생을 감수한 리더십과 정권을 넘어선 국가 과업 완수 의지로 이뤄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개혁 과정에도 정치 명운을 건 절박함이 가득하다. 마크롱은 집권 1기 연금 개혁이 노조 반발로 실패한 뒤 2기 집권 때 또다시 밀어붙여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개혁안을 관철했다. 여론 70% 반대와 의회 반발에 막히자 의회 동의 없이 정부 단독 입법을 가능케 한 프랑스 헌법 특유의 조항까지 가동했다. “연금 개혁으로 떨어진 인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단기 여론조사 결과와 국가의 일반적 이익 중에서 택하라면 후자다.”
여야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청년층에서 역풍이 거세다. MZ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연금안 거부를 위해 거리로 나서자”는 글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혜택은 기성세대가 보고, 부담은 젊은 세대에 떠넘긴다는 불만이 그 하나다. 나머지 하나는 이번 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 또한 현재 41.5%에서 43%로 인상하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점진으로 오르는 데 반해 소득대체율은 내년에 단박에 1.5%포인트 인상된다. 연금 수령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 이상 86세대가 꿀을 빨고, 앞으로도 한참을 더 돈을 내야 하는 청년만 독박 쓴다는 원성이 나올 법하다.
근본적 문제는 연금 소진 시기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연장에 그쳤다는 것이다. 지금 20세 청년은 2064년이 돼도 연금을 붓고 있을 텐데, 내 연금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연금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겠는가. 국내 정치인 중 대표적 연금 전문가인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연금 개혁을 “기성세대나 청년세대나 고갈 걱정 없이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동일한 보험료율로 보장받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이 기준이라면 이번 개혁안은 그저 미세 조정에 불과하다.
우리 정치인과 관료들은 비겁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고이즈미 정부처럼 연금 개혁을 다잡고 달려들기보다 총선을 앞두고 공론화위원회로 넘겼다. 정부안 때부터 ‘더 내고 더 받자’는 김빠진 안을 낸 보건복지부, 민주노총 눈치 보기에 급급한 더불어민주당, 협의 과정에선 침묵하다가 청년 불만에 편승해 이제 와서 거부권 운운하는 국민의힘 잠룡이 다 그렇다.
이번 개혁안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허점투성이다. 적립식을 채택한 나라 중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민주당은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화한 유례가 없다고 하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분의 2가 도입한 자동조정장치에는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이번 개혁에선 27년 동안 손대지 못한 보험료율을 올린 의미가 적잖다. 연금 개혁은 우리 공동체 존립 기반이 걸린 사안이다. 미진한 개혁 완수를 위해 고이즈미, 마크롱 같은 용단의 지도자를 소환하고 있다.

 3 days ago
7
3 days ago
7
![[부음] 김인철(삼성전자 DS부문 커뮤니케이션팀 상무)씨 부친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김순덕의 도발]이재명의 ‘신뢰 리스크’는 어찌 넘을 건가](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3/26/131287679.1.png)
![[사설]“누굴 원망하겠나”… 이웃 돕다 구순 노모 잃은 아들의 눈물](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3/28/131307998.1.jpg)
![[횡설수설/우경임]의대생 일단 복귀는 한다는데…](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3/28/131307657.2.jpg)
![[오늘과 내일/문병기]관세전쟁에 담긴 트럼프의 세 가지 승리 법칙](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3/28/131307987.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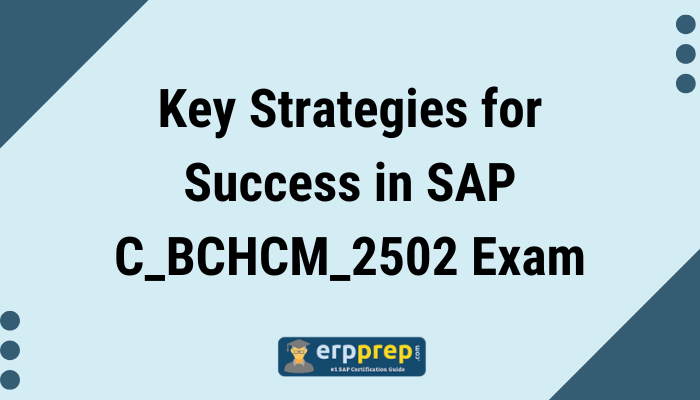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