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떼어내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이관하지 않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이 확정되자 전직 경제수장들이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제 정책 조직이 지나치게 파편화된다”며 “부처 간 정책 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맡은 유일호 전 부총리는 “세제만 담당하는 부총리 조직은 해외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 회의에서 정책만 논의하는 것과 정책·예산을 함께 조율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며 “예산이 빠진다고 해서 다른 부처 공직자들이 가볍게 처신하진 않겠지만, 정책 기능만 남게 되면 조정·통합 기능이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전 부총리는 “거시정책을 컨트롤하는 핵심 수단은 예산인데, 이를 따로 운영할 경우 미국과의 협상 등에서 어려움이 생기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을 지낸 윤증현 전 장관은 “부총리의 권한이 세제와 일부 기능으로만 제한되면 부총리 위상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총리는 정치권의 견제를 받으면서도 예산을 관리·조정하는 역할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하는데, 이번 개편으로 그 기능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 전 장관은 “예산 기능을 부총리에게서 떼어낸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대통령실이 예산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원칙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 정부 경제수장 출신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대중 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진념 전 부총리는 “세제만 남은 부처를 ‘경제 컨트롤타워’라고 부를 수 있겠냐”며 “부총리가 부처 간 경제 정책을 조정할 근거 자체가 약화했다”고 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국내에선 1%대 저성장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상황인데 재경부에 세제 기능만 남게 된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기재부 장관도 “경제를 총괄하는 부처가 기능은 거시와 세제뿐이니 이름만 경제부총리가 됐다”고 했다. 그는 “경제 부처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경제성장수석과 재정기획관이 따로 있다”며 “경제 관련 조직들을 너무 파편화하면 조율과 융합 측면에서 불협화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광식/김익환/정영효 기자 bumeran@hankyung.com

 5 hours ago
6
5 hours ago
6

![[속보] 우체국 금융 서비스 복구 완료…“우편 29일 재개 목표”](https://pimg.mk.co.kr/news/cms/202509/28/news-p.v1.20250928.bbd4970471a44071a79e37a27b10334f_R.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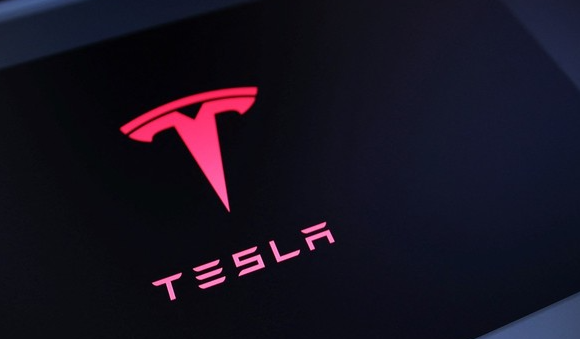
![[속보] 특검 “윤, 계엄논의 작년 3월부터 시작…원내대표도 인지 가능성”](https://pimg.mk.co.kr/news/cms/202509/03/news-p.v1.20250903.0f7ed213f6e645018311c6ea68869499_R.jpeg)

![생성형AI 끼고 상담하는 설계사…보험도 인공지능 혁신 진행 중[금융가 톺아보기]](https://pimg.mk.co.kr/news/cms/202509/04/news-p.v1.20250904.4e6ff2e473814eba97c10d2b6c1ee0e0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