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이끈 동진쎄미켐 창업자 이부섭 회장이 지난 2월 향년 85세로 별세하면서 상속세가 재차 주목받고 있다. 고(故)이부섭 회장의 동진홀딩스 지분(지난해 말 기준 55.7%)이 장남인 이준규 부회장과 차남 이준혁 부회장에게 상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동진홀딩스는 동진쎄미켐 지분 35.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동진쎄미켐 지분 가치 상승분을 반영한 상속세 규모는 최소 124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당장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호지영 과장은 6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상속 재산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 현금성 자산이 아닐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낼 재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이럴 때는 연부연납과 물납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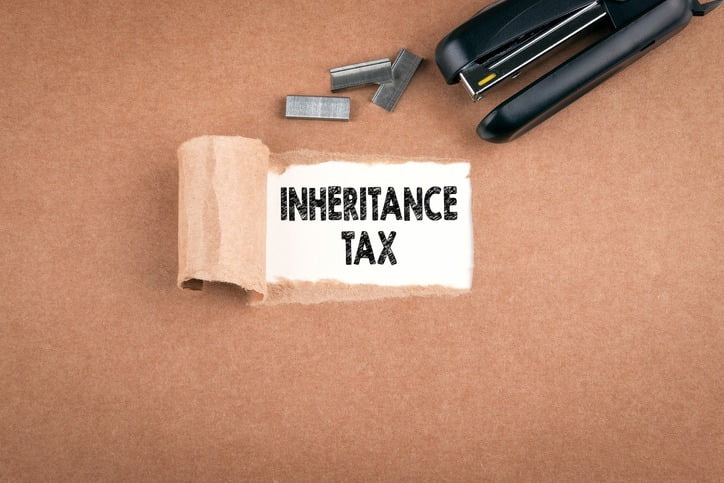
연부연납·물납 제도로 상속세 부담 낮춰
우선 연부연납 제도가 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2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일종의 '할부'와 같은 개념으로 상속세를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연부연납은 과세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세금을 10년간 나눠 내는 만큼 연 3.1%(1일 기준)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납세 담보는 유가증권(국채·주식 등)과 부동산 등이다. 다만 비상장사 주식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이 제도를 활용해 상속세를 냈다. 삼성가(家)는 지난 2020년 고(故)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2021년 4월부터 약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분할 납부 중이다. 구광모 회장도 지난 2018년 고(故)구본무 선대회장이 별세 후 연부연납을 통해 5년간 6회에 걸쳐 72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냈다. 호 과장은 "요건을 갖추지 않고 신청하면 연부연납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요건 미충족으로 거절당할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게 되기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내는 물납 제도도 있다.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일정 요건을 모두 갖췄을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과세당국의 평가를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이 상속 재산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세액이 2000만원을 넘어야 한다.
넥슨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2022년 넥슨 창업주 고(故)김정주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유족들은 5조30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야 했다. 이들은 지주회사 NXC 지분(29.3%)을 정부에 물납하는 방식으로 4조7000억원의 상속세를 냈다. 호 과장은 "캠코가 해당 자산의 유동성과 처분 가능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무조건 물납이 승인되진 않는다"며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 미술품이 물납 대상에 포함됐지만 실제 승인을 통과한 건 4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상속세 부담에 기업 승계 포기·매각 잇따르기도
우리나라의 명목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1999년 45%에서 50%로 상향된 후 25년째 이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최대주주가 상속받는 주식에 대해 20% 더 과세하는 '최대주주할증과세'를 적용할 경우 최고 세율이 60%로 뛰어 오른다.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업 승계를 포기한 채 매각하거나 폐업에 나서는 기업들도 많다.
밀폐용기 등 주방용품 업체로 유명한 락앤락이 상속세 문제로 회사가 매각된 사례다. 락앤락은 지난 2017년 창업주 김준일 회장은 4000억원이 넘는 상속세 부담에 회사를 홍콩계 사모펀드에 넘겨야 했다. 국내 1위 가구·인테리어 업체 한샘도 거액의 상속세 문제를 고심한 끝에 2021년 사모펀드 운용사에 매각됐다. 세계 1위 손톱깎이 생산업체로 유명한 쓰리세븐(777)도 유사 사례로 꼽힌다. 2008년 창업주 김형규 회장 별세 이후 상속인들은 15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회사를 제약업체 중외홀딩스에 넘겼다.
호 과장은 "부동산 등을 처분해서 상속세를 납부하려 해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바로 거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가업 승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주식을 양도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23 hours ago
3
23 hours ago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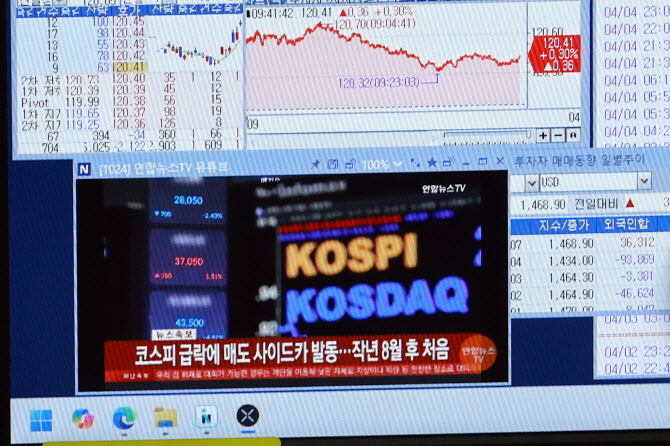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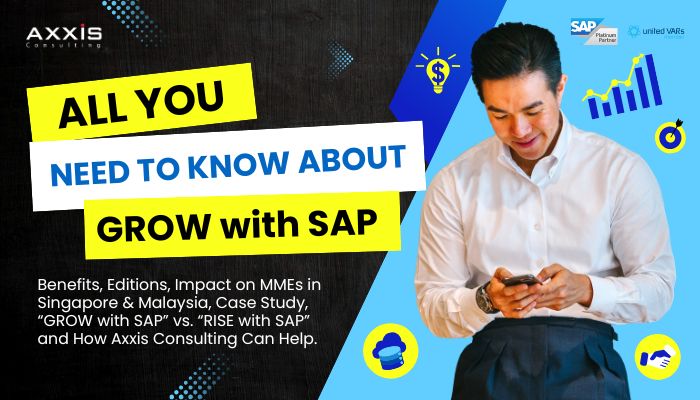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