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뮤지컬 구조는 줄리안 마쉬(남자) - 도로시 브룩(여자) - 페기 소여(여자)로 되어 있다. 줄리안 마쉬가 공연의 성공을 위해 도로시 브룩이 투자자인 애인 애브너 딜런 몰래 숨겨둔 연인 팻 대닝을 만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갱을 고용하는 장면, 주인공을 맡게 된 페기 소여를 무대 위에 완벽하게 올리기 위해 그를 다그치는 장면 등은 냉철한 쇼 비즈니스 세계의 일환으로 그려졌다. 그런데, 줄리안 마쉬가 남성의 신체에서 여성의 신체로 바뀌는 순간 극의 구조는 여자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된다. 이에 작품은 이전까지와 다른 맥락을 획득하게 된다. 스타 연출가 – 한 때 스타였던 배우 – 이제 스타가 될 신인 배우의 구조가 동일한 신체를 가지게 됨으로써 이들의 성장 과정이 세 사람 모두에게 함축되며, 페기 소여의 성공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과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동시에 앞으로도 스타로 살아갈 이들의 모습이 동시에 드러나게 된다.
이는 박칼린의 줄리안 마쉬가 페기 소여를 캐스팅하는 순간, 페기가 줄리안의 손을 잡았다가 놓는 장면에서 지금은 유명한 연출가로 자리매김했지만, 그 또한 무명이자 신인이었던 시절이 있었음을 잠시 환기한 듯한 느낌에서 비롯한다. 더불어 도로시 브룩이 페기 소여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는 장면에서도 말이다. 이 과정에서 도로시 브룩 또한 세월이 지나 예전만큼의 기량이 나오지 않게 됨으로써 투자자에게 기대어 진실되지 못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돈의 힘으로 주연의 자리를 지키려고 아등바등하던 것을 그만두고, 자신의 진실한 사랑을 찾아간다. 이를 통해 처음에는 <프리티 레이디> 공연을 위해 모였고, 지금도 이 공연의 성공을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단순한 쇼 비즈니스를 넘어 인간 간의 연대감을 보여준다. 누구나 힘들었을 때가 있고, 그때 도와주는 어른의 아름다운 모습과 함께 말이다.
이렇게 박칼린의 줄리안 마쉬는 기존에 익숙했던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를 새로운 감각으로 읽히게 하는 데 성공했다.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는 화려한 쇼뮤지컬에서 더 나아가 삶이 흔들리던 대공황 시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내고자 했던, 그리고 자신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력으로 잡아 살아가려고 했던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즉, 원래 작품이 여성 서사의 맥락에서 쓰이지 않았지만, 줄리안 마쉬의 크로스 젠더 액팅(acting)을 통해 현대적 맥락에서 여성 서사의 층위를 자연스럽게 획득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도로시 브룩, 페기 소여 그리고 줄리안 마쉬의 넘버를 통해서 더욱 감각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도로시 브룩의 노래 실력을 보고 싶다는 줄리안 마쉬의 요청에 따라 도로시 브룩이 무대 위에 등장해서 처음으로 노래 부르는 넘버 ‘Shadow Waltz’에서 시작된 재즈의 멜로디는, 이후 도로시 브룩이 무대를 앞두고 긴장한 페기 소여를 다독여주며 함께 부르는 넘버 ‘About a Quarter to Nine’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멜로디는 극의 마지막 넘버이자 줄리안 마쉬의 넘버 ‘42nd Street(reprise)’로까지 연결된다. 이 리프라이즈 넘버는 처음에는 앞서 도로시 브룩이 주인공으로 데뷔하는 극중극 무대인 넘버 ‘42nd Street’의 멜로디로 시작하지만, 이내 앞서 등장한 도로시 브룩과 페기 소여의 멜로디가 들어온다.
이때 페기 소여의 행운의 노란 스카프를 들고 줄리안 마쉬가 노래 부르는 연출이 인상 깊게 다가온다. 줄리안 마쉬가 노란 스카프를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었던 것은, 무대 위에 이 스카프를 하고 올라가려는 페기 소여에게서 가져온 것이었다. 줄리안 마쉬가 이 노래를 작품이 성공하고 자신이 다시 한번 유명한 연출가로서 이름을 떨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부르는 만큼, 페기 소여의 노란 스카프의 행운이 줄리안 마쉬에게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존에 뉴욕 공연을 36시간 남기고 페기 소여를 완벽하게 무대 위에 올리기 위해 줄리안 마쉬가 그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기존에 연출의 권위를 이용한 힘없는 신인 여배우의 착취에 가깝다는 해석과 또 다르게 읽히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다시 본다면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를 잡은 페기 소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그리고 페기 소여의 모습에 치열하게 살아온 자신의 과거 모습을 대입해 보고 있는 줄리안 마쉬의 면모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남성 권위의 음색으로 들리던 훈육이 여성 연대의 코칭으로 굴절된다.
그리고 덧붙여 생각해 보면,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그리고 이 작품의 극중극인 <프리티 레이디>에서 사용되는 주요 색깔은 노란(황금)색이다. 의상, 무대, 조명 말이다. 이 노란색은 그저 시각적으로 화려함을 더해주는 요소일까, 아니면 경제 대공황 시대에 돈(금)을 갈망하던 사람들의 욕망일까. 그것도 아니면 소중한 꿈을 가지고, 이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별처럼 반짝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까? 반짝이는 노란색은 줄리안 마쉬 – 도로시 브룩 – 페기 소여, 그리고 페기 소여를 꿈꾸는 수많은 코러스 걸에 이르기까지 무대를 사랑하는 이들의 반짝이는 꿈을 상징한다.

이미 브로드웨이에서는 뮤지컬 <하데스타운 Hadestown>의 헤르메스 역을 릴리아스 화이트(Lillias White)가, 뮤지컬 <겨울왕국 Frozen>의 올라프 역을 라이언 레드먼드(Ryann Redmond)가 연기하고, 신시아 에리보(Cynthia Erivo)가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Jesus Christ Superstar> 리바이벌 버전에 예수 역으로 캐스팅됐다. 더 나아가, 웨스트엔드에서는 뮤지컬 <컴퍼니 Company>의 남자 주인공 바비(Bobby)를 여자 주인공 ‘바비(Bobbie)’로 젠더 스와이프(gender swap)함으로써 전체 관계 설정이 바뀐 리바이벌 버전을 선보인 적이 있다. 고전 작품 혹은 남성의 신체로 연기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인식되던 캐릭터를 여성의 신체로 다시 씀으로써 작품에 이전과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5년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의 헤롯왕에 뮤지컬 배우 김영주를 캐스팅한 사례를 시작으로, 뮤지컬 <하데스타운>의 헤르메스 역에 뮤지컬 배우 최정원을 캐스팅하는 등 기존의 젠더를 다른 젠더로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다. 대학로에서도 뮤지컬 <해적>, <더 라스트 맨> 등 캐릭터를 구현하는 데 있어 하나의 성별만을 지정하지 않으려는 흐름이 있다. 이에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에 등장한 박칼린의 줄리안 마쉬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눈길이 가는 것은 고정된 리더의 남성 역할에 여성이 캐스팅되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작품이 완전히 새롭게 읽힐 수 있다는 것을 관객에게 자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젠더 스와프처럼 기존 인물의 성별을 뒤집어서 서사와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새로 각색하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박칼린의 줄리안 마쉬를 통해 <브로드웨이 42번가>는 쇼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한 쇼 뮤지컬의 화려함을 넘어, 무대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연대라는 깊은 층위를 재조명하며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임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번 해석이 보여준 가능성은 국내에서 오랜 기간 상연되어 온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헤드윅> 같은 작품이 여성으로 다시 쓰이게 된다면, 각 작품은 또 어떤 새로운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을지 기대하게 만든다.
김소정 뮤지컬 평론가

 2 weeks ago
18
2 weeks ago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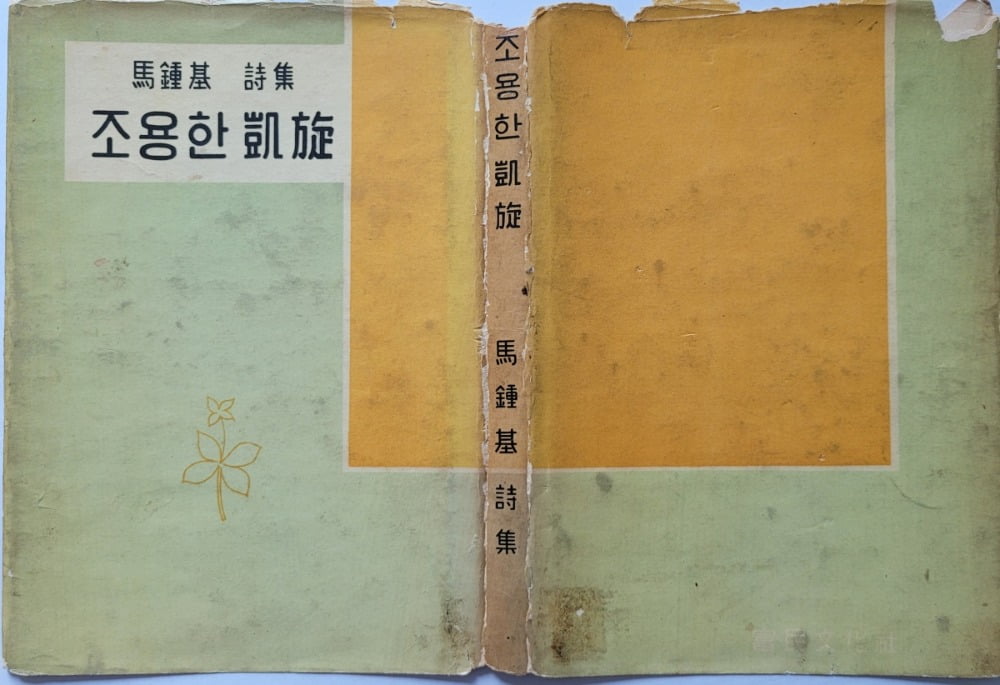
![[포토] 서울숲재즈페스티벌2025](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9/PS2509220124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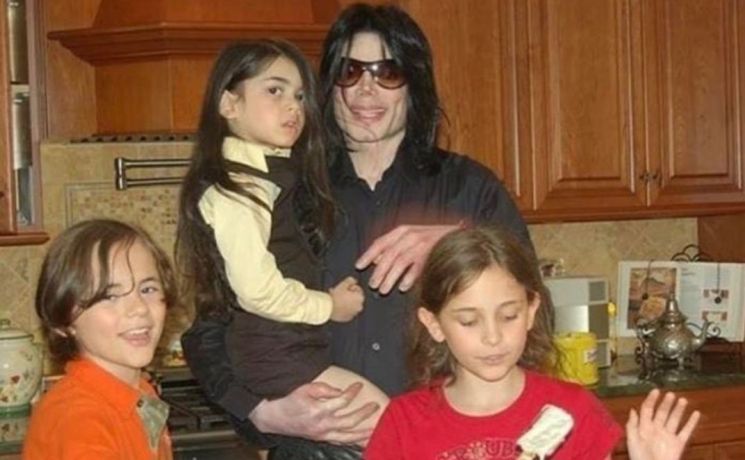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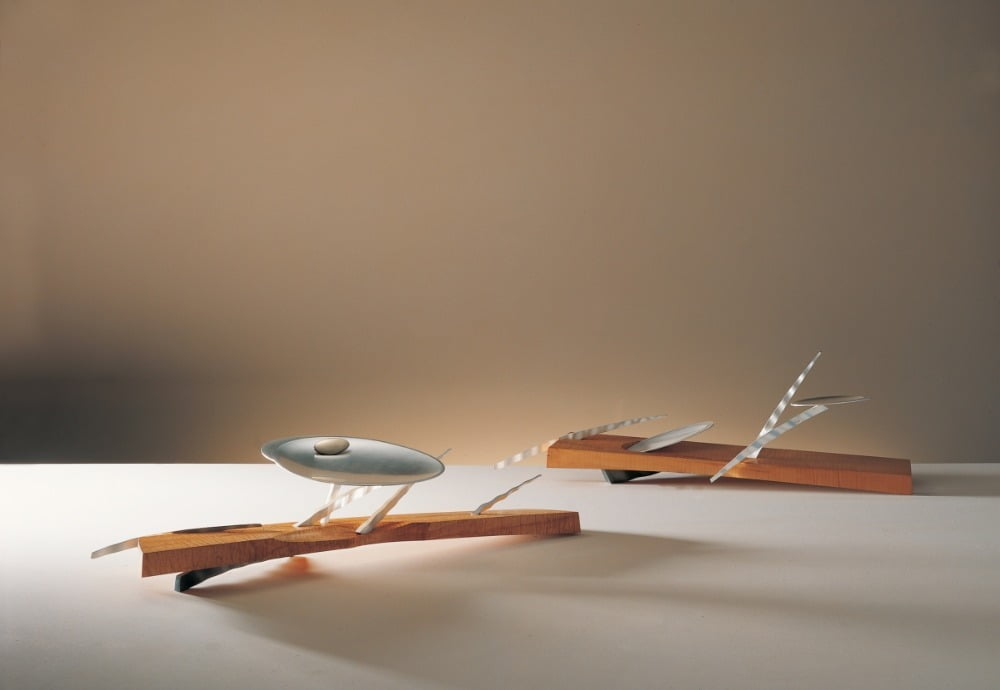




![[속보] 특검 “윤, 계엄논의 작년 3월부터 시작…원내대표도 인지 가능성”](https://pimg.mk.co.kr/news/cms/202509/03/news-p.v1.20250903.0f7ed213f6e645018311c6ea68869499_R.jpeg)


![생성형AI 끼고 상담하는 설계사…보험도 인공지능 혁신 진행 중[금융가 톺아보기]](https://pimg.mk.co.kr/news/cms/202509/04/news-p.v1.20250904.4e6ff2e473814eba97c10d2b6c1ee0e0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