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부(잠정)'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이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독일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외신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지난 5월 연방경제기후보호부에서 기후위기 대응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부처 명칭을 ‘연방경제에너지부’로 개편했다. 이는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연방경제에너지부에 기후 기능을 통합한 지 4년 만에 되돌린 것이다.
이는 경기 침체와 제조업 경쟁력 악화 등을 겪게 된 독일 정부와 유권자가 산업 회복을 기후위기 대응보다 우선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독일 등 유럽연합(EU)은 친환경 규제 정책을 선도해왔지만, 2022년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후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는 분석도 있다.
친환경 투자자본과 기업들이 IRA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대거 쏠렸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연방경제에너지부의 재탄생은 경기 침체와 제조업 경쟁력 약화 속에서 유권자들이 기후보다 산업 회복을 더 중시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친환경 전환을 선도하던 독일 정부조차 경제 현실을 고려해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했다"고 분석했다.
영국도 유사한 흐름을 거쳤다. 영국에서는 1983년부터 산업통상부가 유지돼 왔다. 이후 2008년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 전담 부처인 '에너지기후변화부'를 신설하며 산업정책과 기후정책을 분리했다. 그러나 2016년 산업계와 에너지 정책, 탄소중립 정책은 연계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에너지기후변화부를 기업혁신기술부와 통합해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로 확대 개편했다.
하지만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의 정책 영역이 과도하게 넓다는 비판이 지속됐고, 결국 2023년에는 이를 기업통상부,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과학혁신기술부 3개 부처로 다시 나눴다. 이때 신설된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의 명칭에 '에너지안보'를 탄소중립보다 앞세운 것은 러시아 전쟁 이후 기후위기보다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영국은 2008년 에너지기후변화부 설립 이후 산업과 동떨어진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을 추진하다가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게 됐다"며 "영국은 그나마 금융서비스업이 발달한 나라지만, 제조업 비중이 월등히 높은 한국에서는 함부로 산업과 에너지를 분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하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사실상 반대했다. 그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는 제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며 "원전과 재생에너지 산업 등 에너지 자체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을 하는 등 산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6 hours ago
1
6 hours ago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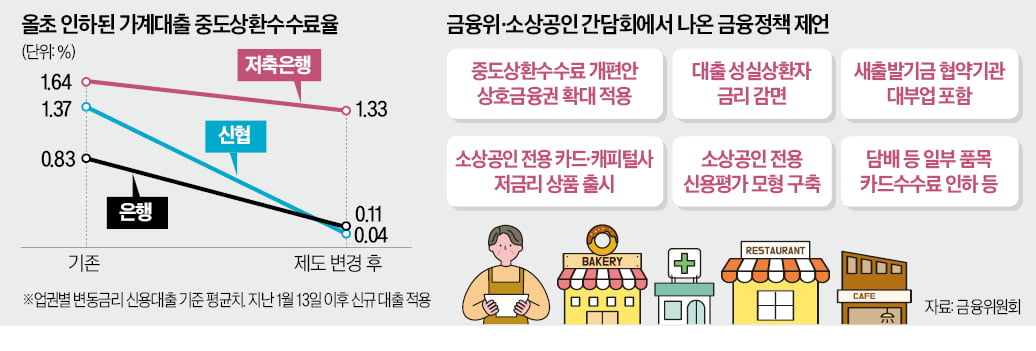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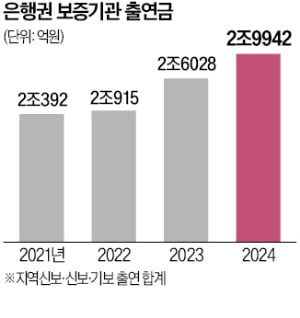
![[포토] 부산銀-동의과학대 동반 성장 업무협약](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AA.41181558.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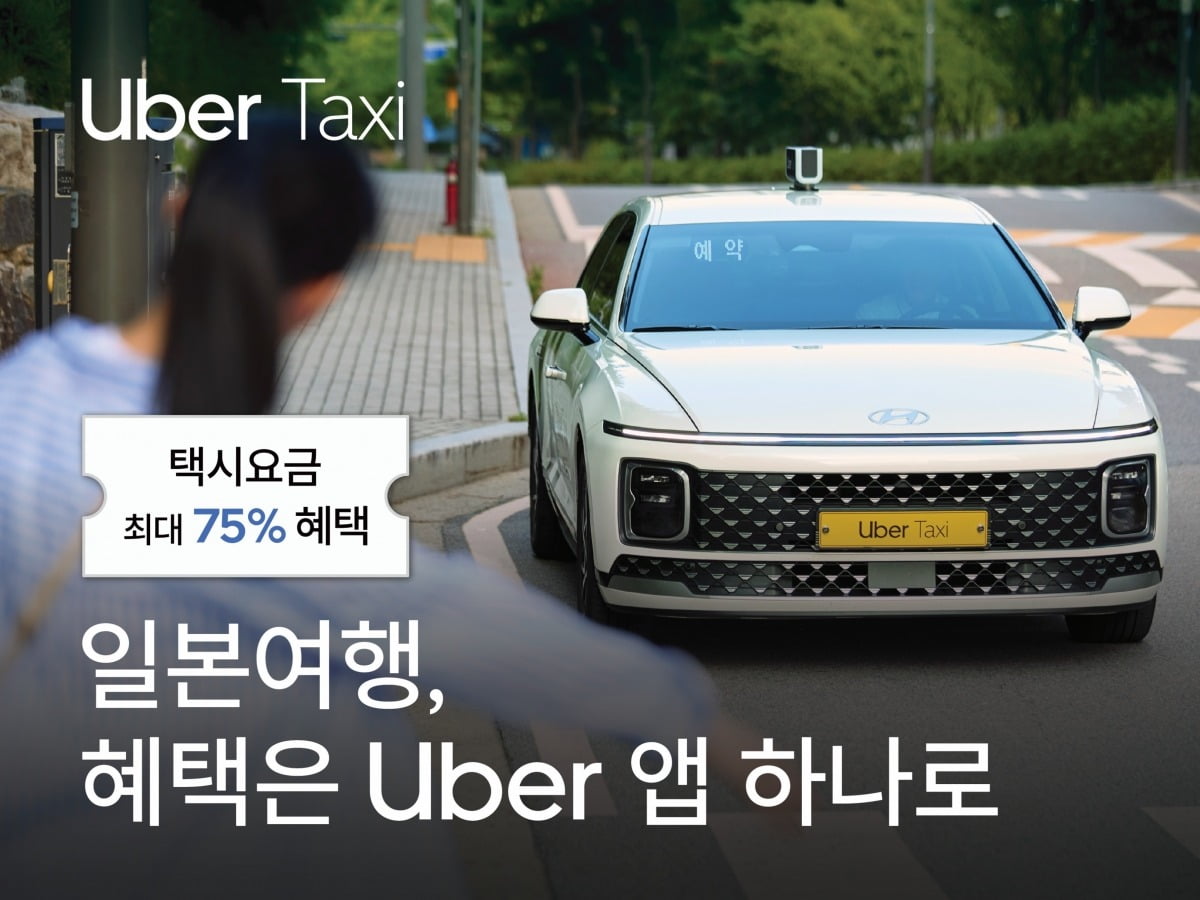






![이준영·아이들 슈화·크래비티 앨런·키키 수이, 'ACON 2025' MC 발탁[공식]](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7/2025070309484071779_6.jpg/dims/optimize/)
![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집값, 가계대출 불안에 인하 유보 [HK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ZN.41075682.1.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