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직’ 전환 미는 금융위
‘민간조직’ 앞세우는 금감원
통합조직 주도권 놓고 다른 셈법
![[사진=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8/09/news-p.v1.20250808.d71dcaeaa393411893ce5a6933c4c8ce_P1.png)
금융당국 조직개편 관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이번엔 ‘공조직 대 민간조직’ 논쟁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국정기획위원회 최종 제출안에 따라 두 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로 합쳐질 것이 유력하다. 하지만 기관 성격이 공조직(금융위 입장)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민간조직(금감원 입장)이어야 하는지를 두고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표면적 이유는 금융감독권한 행사의 법적 근거 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물밑으로는 ‘통합시 어느 조직이 우위에 서느냐’를 둘러싼 계산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이 공조직으로 전환한 뒤 통합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근거는 금융감독권은 행정부의 권한에 해당하므로 공직유관단체인 금감원이 이를 전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66조4항은 행정권한이 원칙적으로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의해 행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조직법 제6조는 민간조직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업무의 한계를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총 인원이 약 300명에 불과한 금융위가 2300명 가량의 직원이 속한 금감원과 통합할 경우 덩치에서 밀리게 된다는 고민도 담겨 있다. 그러느니 차라리 금감원을 공조직으로 전환해 구별을 두지 않는 쪽이 유리하다는 셈법이다.
반면 금감원은 공조직 전환에 대해 고개를 젓는 분위기다. 가장 큰 걸림돌은 ‘급수 대우’다. 금감원은 금융위 산하기관이기에 실제 영향력은 장관급 이상인 원장도 공무원 급수로는 차관급으로 분류된다. 아래 직급에도 이러한 전환 원칙이 적용되면 금융위 직원들보다 대략 1~2급씩 낮은 급수를 부여받게 될 것이 유력하다.
이 때문에 금감원에선 금융위가 해체돼 기존 금감원 조직과 통합되는 만큼 금감위 역시 민간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 직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금감위 사무처에 금융위 직원들이 일부 남아 ‘옥상옥’ 조직이 되는 시나리오다. 소수 조직으로라도 금융위 직원들이 잔존하게 되면 조직 확장 논리에 따라 인원 확장이 이뤄지면서 결국 통합의 의미가 없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 1999년 금감위가 처음 출범했을 때 10명 남짓이었던 사무처 직원들이 점점 불어나 금융위 분리 직전인 2008년엔 200명 이상이 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으로선 가장 피하고 싶은 통합 형태가 공조직이 일부 위에 남아있는 중첩 구조”라며 “시간이 흐르면서 공조직이 다시 커지고, 그렇게 되면 개혁안 취지와도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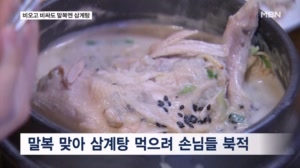






!["韓 떠나는 K애니 인재들… 정부·기업 과감한 지원 나서야"[만났습니다]②](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7/PS25071800014.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