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지브리풍 열풍과 AI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7.39806375.1.jpg)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보니 ‘지브리 화풍’ 프로필 사진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대중화를 실감하는 순간이다.
AI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상적인 순간이 세 번 있다. 첫 번째는 2016년 이세돌 9단과 딥마인드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다. 당시만 해도 AI가 세계 최강 프로기사를 이길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결과는 알파고의 4승1패. 이후 기업들은 AI 기술에 본격 투자했고 유통 분야에서는 수요예측과 물류 최적화, 금융에서는 신용평가와 대출 심사, 의료에서는 영상 진단 보조와 신약 개발 등 산업 전반에서 AI 기반 혁신이 이어졌다.
두 번째는 오픈AI 챗GPT의 등장이다. 누구나 똑똑한 개인 비서를 두고 일하는 시대가 열렸다. 리서치, 번역, 요약은 물론 개발자는 코드 작성과 디버깅을, 마케터는 광고 문구와 디자인 초안을 빠르게 생성하며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이다. 손쉽게 특정 화풍을 반영한 그림이 유행하고, 60대 후반 부모님도 가족사진을 AI로 바꿔 SNS에 올린다. 아이들은 챗GPT와 그림 그리고 퀴즈를 즐긴다. 산업의 중심에서 일상으로, 이제 AI는 전 연령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 기업은 AI를 통해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에잇퍼센트 역시 신용평가 자동화, 대량 거래 처리 등에 AI를 적용해 더 많은 이가 합리적인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돕고 있다.
하지만 AI의 확산은 일자리 대체라는 중대한 질문도 남긴다. 유발 하라리는 <넥서스>에서 “대부분의 일은 AI가 수행하고, 인간은 소수만이 결정권을 가진 역할로 남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부의 재분배와 사회 구조 재설계가 필요한 시대임을 뜻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일을 통해 인간이 느끼던 자기 효능감의 상실이다. 특히 창작 영역에서 AI가 인간을 대체할 때 느끼는 상실감은 더 크다. 지브리 화풍의 AI 그림이 유행하는 가운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2016년 한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AI가 만든 결과물은 고통을 모른다. 완전히 역겹다. 삶에 대한 모욕”이라며 AI로 이뤄지는 작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인간의 존재 가치와 새로운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I 기술의 확장은 저작권 소송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오픈AI는 일부 언론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뉴욕타임스와의 소송은 불리하게 전개 중이다. 국내에서도 지상파 방송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 기술 발전을 외면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기술과 규범의 균형을 이뤄가는 AI 선진국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4 days ago
7
4 days ago
7
![[투데이 窓]경제 혁신의 길 '창업허브 국가로 대전환'](http://thumb.mt.co.kr/21/2025/04/2025041315290677457_1.jpg)
![[MT시평]중국 해양 간첩 사건](http://thumb.mt.co.kr/21/2025/04/2025041314494862910_1.jpg)
![[사설]“메시지 계엄” “담 넘은 건 쇼”… 첫 공판부터 ‘억지’ 일관한 尹](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14/131415051.1.jpg)
![[횡설수설/윤완준]1명만 더 사퇴하면 위헌… 위태로운 국무회의](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14/131414786.2.jpg)
![[오늘과 내일/이정은]‘적보다 나쁜 친구’와의 관세 협상 방정식](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14/131415017.1.png)
![[한규섭 칼럼]‘비상식 대 비상식’이 부른 20대 민심의 두 차례 변곡점](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14/131415005.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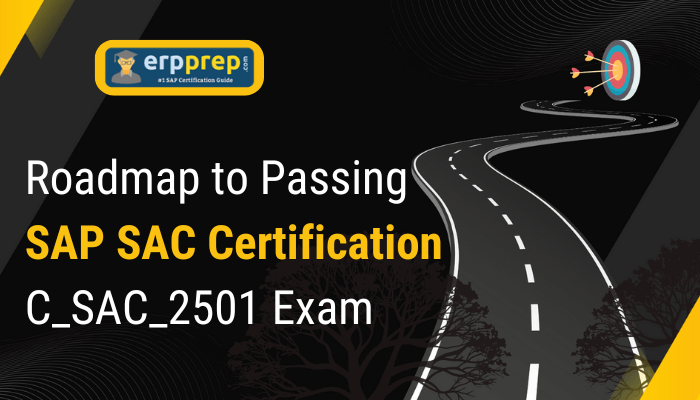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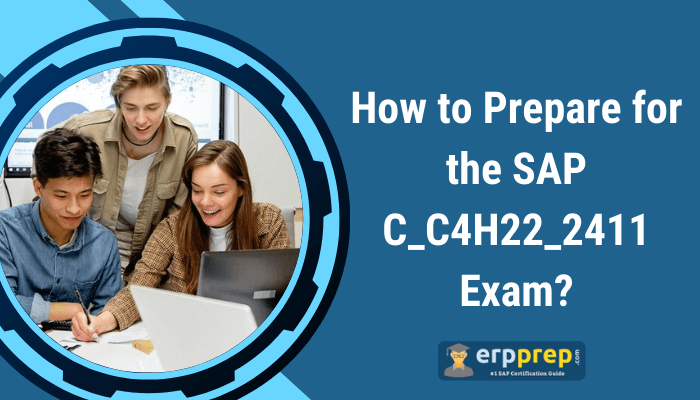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