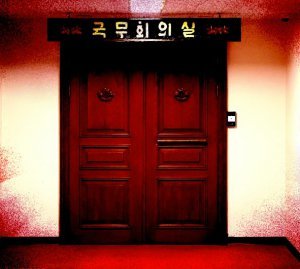
▷어디서 장관을 꿔 올 수도 없는 현 정부는 한 명이라도 더 사퇴하면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위헌 상황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국무회의 효력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정국에서 가장 먼저 사퇴한 이는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다. 면직 당일 열린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김 전 장관이 출석해 계엄 전말을 증언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사퇴 경위도 비슷했다. 이 전 장관이 계엄 옹호 발언 등으로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다음 날 사의를 밝히자마자 윤 전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했다. 더군다나 당시는 윤 전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상태에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 의도가 더욱 의심됐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쪽지를 본 뒤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이 드러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대선에 출마하며 사퇴해 한 명 더 줄었다. 여가부 장관 자리는 지난해 김현숙 전 장관이 잼버리 파행으로 물러난 뒤 윤 전 대통령이 어정쩡한 상태로 방치해 1년 넘게 비었다. 4명 공석 다 윤 전 대통령이 초래한 것인데, 남은 장관을 15명으로 유지해도 국무회의 참석자가 의사정족수 11명이 안 돼 회의조차 열 수 없는 상황을 정부가 우려할 지경이 됐다. 통상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월요일인 14일로 앞당긴 것도 15일 장관들의 해외 출장과 국회 일정 등이 겹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계엄 직전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위해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할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없었다.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시늉을 했지만 정상적 회의 절차를 무시한 채 계엄을 강행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했다. 국무회의를 무시했던 윤 전 대통령의 위헌적 행태가 국정 기능이 자칫 마비될 수도 있는 작금의 위태로운 상황을 낳았다.
윤완준 논설위원 zeitung@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 day ago
4
1 day ago
4

![[전문기자칼럼] ''여행''은 외교적 자산이다](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광화문]"역사는 반복된다" 또 야만의 시대](http://thumb.mt.co.kr/21/2025/04/2025041509002554563_1.jpg)
![[기고]지급결제의 혁신, 스테이블 코인](http://thumb.mt.co.kr/21/2025/04/2025041506053928075_1.jpg)
![[우보세]선거 재테크](http://thumb.mt.co.kr/21/2025/04/2025041513505760212_1.jpg)
![[기자수첩] 정년연장, 선택이 아닌 필수](http://thumb.mt.co.kr/21/2025/04/2025041407412534340_1.jpg)
![[MT시평]4년 중임제, 주의할 점](http://thumb.mt.co.kr/21/2025/04/2025041513340233047_1.jpg)
![[투데이 窓]암기식 방향, 이해식 방향](http://thumb.mt.co.kr/21/2025/04/2025041513293266594_1.jpg)
![[사설]美 “먼저 하면 이득”… 서둘다 ‘원스톱 쇼핑’ 당하는 일 없어야](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15/13142406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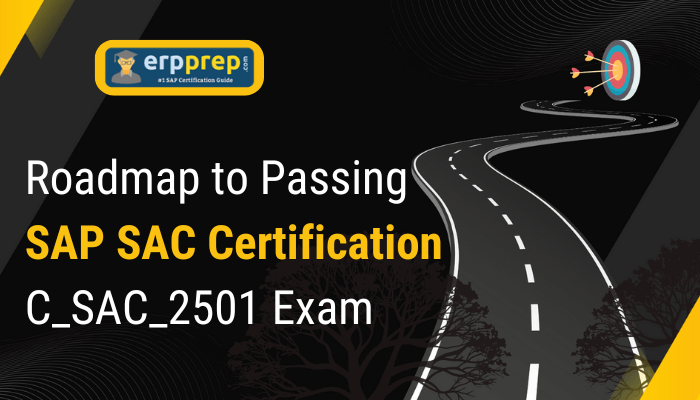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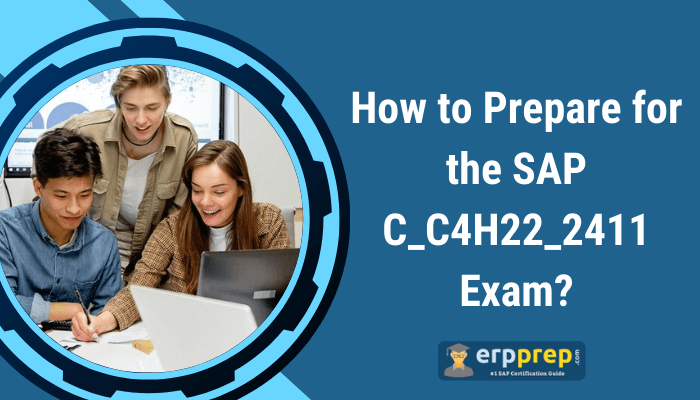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