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마 디그레핀리는 자신의 고용을 거절한 자동차 공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인종과 성별을 이유로 고용이 거절됐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채용 과정에 차별이 없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실제로 그녀의 고용을 거절한 자동차 공장은 흑인과 여성을 모두 고용했는데, 여성은 모두 백인이자 사무직이었으며, 흑인은 모두 남성이자 공장 근로자였다. 하지만 여성이자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엠마는 여성으로서도, 흑인으로서도 모두 보호받지 못했다. 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 철학자인 킴벌리 크렌쇼는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교차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그는 우리가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특정한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폭넓은 범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영상] ▶▶▶ '엠마 디그레핀리 TED강연' 바로보기
건축가 알레한드로 아라베나는 디자인과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질문을 하고 협의와 종합을 통해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건축 과정에서 마주하는 한정된 자원과 시간, 규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령, 칠레 북부 이키케 도심의 빈민가를 개선하는 프로젝트에서 그는 빈민을 쫓지 않고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했다. 건물의 절반만 완성하고, 나머지 절반을 완성하는 일은 그곳에 사는 이들에게 맡겨 예산을 절약했다. 지진과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은 칠레 남부 콘스티투시온 재건 사업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됐다. 그는 공공 공간의 부족을 채우고, 물가에 모두가 접근할 수 있으며, 해일에 대비할 방법으로 도시와 바다 사이에 숲을 두었다. “건축의 가장 내밀한 핵심에 삶의 힘”을 두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한 결과다.
[관련 영상] ▶▶▶ '알레한드로아라베나 TED강연' 바로보기


커피 생산의 가치사슬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주로 작물 재배와 분류 등에 한정돼 있다. 운반과 마케팅, 최종 판매는 남성들의 역할인 경우가 많다. 어떤 커피 산지는 여자에게 땅을 물려주지 않는 가부장적인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여성 농장주들은 남성 농장주보다 커피 가격을 평균 40% 낮게 책정받는다. 커피를 구매하는 ‘코요테’들이 대부분 남성이고, 이들은 여성 앞에서 상대적으로 협상의 우위를 가지기 때문이다. 커피 농장에서 여성들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가 복잡하게 교차한 가운데 차별받고 있다. 여성 농부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기업 ‘빈보야지’의 대표 탁승희는 커피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교차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빈보야지는 여성 농부를 교육하거나 커피 생산지의 정부 단체에 성평등 정책을 입안시키는 등의 활동을 펼치며 차별의 교차로 위에 있는 이들을 돕고 있다.
정성윤은 보난자 커피 로스터스, 타르틴 베이커리 등의 업체에서 로스터로 경력을 쌓아오면서 커피산업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자신이 열게 될 카페는 실용적이고 유용한 공간이 되기를 바랐다. 커피 산업이 마주한 한정된 자원과 시간, 규모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말의 도움이 돼야 생각했기 때문이다. 카페 이름인 유틸리티 커피 로스터스는 과도한 포장과 비효율적인 접근을 통해 버려지는 돈과 시간, 자원 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 공간에 붙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이름이었다.


정성윤은 주어진 공간의 색과 분위기에 벗어나지 않게 스테인리스 소재를 적극 활용했다. 작업공간에는 별도의 테이블을 들이는 대신 냉장고 상판을 사용했고, 테이블과 의자는 철제 양동이(페일 캔)와 플라스틱 접이식 의자나 말비계(도배 사다리), 나무 벤치 등으로 대체했다. 커피잔에는 각인을 세기기보다 투명 스티커를 붙여 공간의 분위기와 통일감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했다. 모든 요소가 그 자체의 쓸모에 집중하는 유틸리티가 됐다. 그리고 각 유틸리티의 쓸모를 적극 활용한 공간에서 아낀 비용과 에너지는 커피에 제값을 지불하는데, 공간을 찾은 이들에게 더 나은 커피를 제공하는 데 쓰인다.

커피에 제값을 지불한다는 개념은 커피 산업의 핵심에 삶의 힘을 두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카페를 운영하고 커피를 파는 일은 단순히 생두를 볶고 커피를 내리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정성윤은 커피가 유통되는 모든 과정에 최소한의 윤리성을 따지는 것 또한 바리스타와 로스터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커피를 통해 만난 인연 중에는 산업의 가치사슬에 속해있는 모든 이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들이 있었다. 앞서 소개한 빈보야지의 대표 탁승희와의 인연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윤리적인 구매와 농부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는 생두 업체 팔콘 커피, 국내 스페셜티 커피 업계 최초로 비콥인증인증을 받은 커피리브레 또한 카페의 쓸모를 더해주는 인연이다. 정성윤은 그들이 애써 들여온 커피가 가장 쓸모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커피는 맛있기도 해야 하지만, 윤리적이기도 해야 한다. 정성윤은 최소한 자신이 생각하기에 일말의 부끄러움이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 모든 요소에 쓸모를 생각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당장 지구 온난화와 차별, 빈부격차를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문제들은 손을 댈 수 없이 커져, 더 이상 내일의 커피를 마시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커피 한 잔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고 소통하며, 느슨한 연대를 통해 사소한 변화라도 일으켜야 한다. 비어 있는 공간은 꼭 물리적인 요소로만 채울 필요는 없다. 커피를 내리는 사람과 마시는 사람이 연대할 때, 그 연대가 최소한의 윤리를 지키려고 할 때, 공간의 힘은 더할 나위 없이 커지게 된다.

조원진 칼럼니스트

 10 hours ago
3
10 hours ago
3
![알카라스- 신네르의 '빅2', 남자 테니스의 새 황금기를 열다 [조수영의 오 마이 스포츠 히어로]](https://img.hankyung.com/photo/202509/01.41791545.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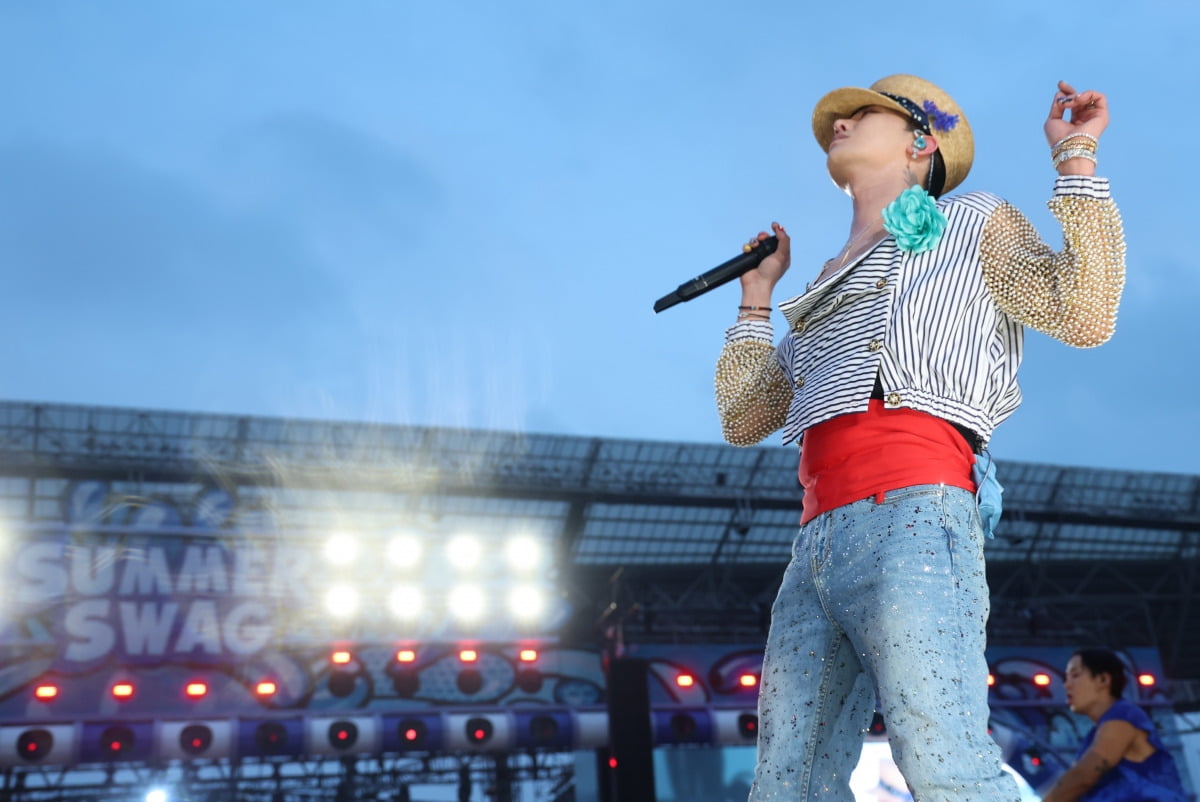


![[속보] 특검 “윤, 계엄논의 작년 3월부터 시작…원내대표도 인지 가능성”](https://pimg.mk.co.kr/news/cms/202509/03/news-p.v1.20250903.0f7ed213f6e645018311c6ea68869499_R.jpeg)

![생성형AI 끼고 상담하는 설계사…보험도 인공지능 혁신 진행 중[금융가 톺아보기]](https://pimg.mk.co.kr/news/cms/202509/04/news-p.v1.20250904.4e6ff2e473814eba97c10d2b6c1ee0e0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