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따스한 색채로 가벼워 보이는 그림과 꽉 짜여진 구조로 긴장감이 느껴지는 그림이 동시에 시선을 붙든다. 붓질은 부드럽지만 빛의 떨림까지 포착한 르누아르, 색을 단단하게 쌓아올려 선을 살려낸 세잔. 서로 다른 결을 지닌 두 거장의 작품이 나란히 걸린 '오랑주리-오르세 미술관 특별전 : 세잔, 르누아르'(이하 특별전)는 마치 19세기 파리 살롱전과 같은 긴장과 조화가 공존했다.

이번 전시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기획됐다.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과 오랑주리 미술관이 협력해 엄선한 50여 점이 홍콩과 도쿄를 거쳐 서울에 왔다. 오랑주리 미술관 소장품이 한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보급에 해당하는 작품을 손상없이 운반하기 위해 미술관 측은 특별한 케이스와 완충제를 제작했고 비행기 4대가 동원됐다. 모네의 수련으로 유명한 오랑주리 미술관의 소장품 가운데 세잔과 르누아르의 작품이 한국에 왔단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개막 전날인 19일 둘러본 전시는 총 6개 섹션으로 이뤄졌다. 초입에는 두 사람이 남긴 야외 풍경화가 주축을 이룬다. 르누아르는 햇살 속 따뜻한 공기와 흔들리는 바람의 결을, 세잔은 산맥과 나무의 구조적인 상을 화면에 담아냈다. 야외 풍경화에서 느껴지는 두 사람의 전혀 다른 화법을 느끼며 발걸음을 옮기면 보다 비교가 확연한 정물 코너가 등장한다. 르누아르가 색채의 조화로 정물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면 세잔은 원근법을 해체하며 사과와 병을 기하학적으로 배치한 점이 특징. 인물화에서 조차 두 사람의 붓은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내놨다. 세잔은 감정을 절제한 구조적인 초상(심지어 아내의 초상도 무표정하게 그렸다), 르누아르는 인물들에 대한 자신의 친밀감을 강조했다. 세잔 아내의 초상과 르누아르의 막내 아들의 초상은 표정부터 색깔까지 완전한 반대를 이루고 있었다. 달라도 너무 다른 화풍의 두 사람의 전시를 한데 모아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날 도슨트로 나선 세실 지라르도 오랑주리 미술관 부관장은 "두 사람의 작품이 접점없이 달라보이지만 동시대를 살았던 거장으로서 공통된 실험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법상 두 화가가 다른 길을 걸었지만 20세기 미술을 여는 정신적 지주가 됐지요. 서로를 존중하고 깊은 존경심으로 우정을 나눴던 이들의 생애와 작품의 교차점을 파악하도록 이번 전시를 기획했어요." 지라르도 부관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18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예술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고 한다.

전시의 마무리는 두 화가가 남긴 예술적 유산을 조명했다. 세잔의 분석적인 작법은 피카소와 브라크의 입체주의로 이어졌다. 르누아르의 유연한 곡선과 온화한 색채는 피카소가 고전주의로 회귀했을 때 영향을 미쳤다. 세잔을 자신의 유일한 스승이라고 언급했던 피카소지만 실제로 르누아르의 그림 7점을 소장했던 바 있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비교를 넘어 19세기 인상주의에서 현대미술로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을 관객이 직접 느껴보도록 만든다.
이번 특별전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큐레이터 전시 해설이 하루 두 차례 진행되고 어린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세대와 관심사를 아우르는 배움의 장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꾸렸다"고 말했다. 20일 개막하는 이번 전시는 내년 1월 25일까지 이어진다.
이해원 기자

 1 day ago
7
1 day ago
7

![[이 아침의 작가] 19세기 서구 열강의 탐욕을 고발하다](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속보] 특검 “윤, 계엄논의 작년 3월부터 시작…원내대표도 인지 가능성”](https://pimg.mk.co.kr/news/cms/202509/03/news-p.v1.20250903.0f7ed213f6e645018311c6ea68869499_R.jpeg)

![생성형AI 끼고 상담하는 설계사…보험도 인공지능 혁신 진행 중[금융가 톺아보기]](https://pimg.mk.co.kr/news/cms/202509/04/news-p.v1.20250904.4e6ff2e473814eba97c10d2b6c1ee0e0_R.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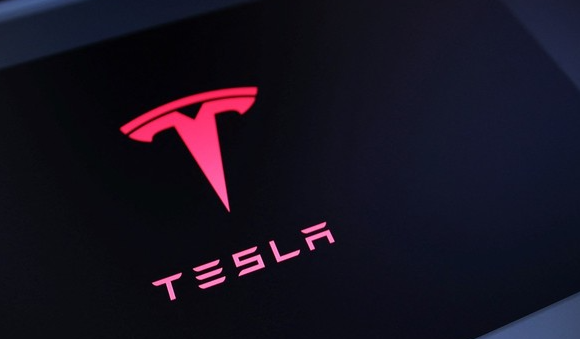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