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이 읽기 어렵고 딱딱한 것은 판사들이 느끼는 이런 중압감 탓도 크다. 그렇다고 외계어 같은 어휘와 번역 투의 장문들이 판결문에 난무하는 게 정당화되진 않는다. 판결문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혼나야 할 사람이 왜 혼나는지 이해할 수 있고, 그 판례를 적용받을 국민들도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판결문이 어려우면 법관이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을 해도 난해한 문장들에 가려져 잘 드러나지 않는다. 미국 법률가들이 “법의 언어는 그 법에 따라야 하는 사람들 귀에 외국어로 들려선 안 된다”(법철학자 빌링스 러니드 핸드), “독자가 판결문의 문장을 다시 읽어야 한다면 실패한 판결문”(전 연방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같은 말들을 신조로 삼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쉽고 공감 가는 ‘법의 언어’ 보여준 헌재
잘 쓴 판결문이 꼭 유려한 문체의 명문을 뜻하는 건 아니다. 상식에 맞는 논리로 쉽고 명쾌하게 썼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두고 ‘고개가 끄덕여졌다’는 반응이 많은 것은 잘 쓴 판결문에 가깝다는 의미일 것이다. 특히 화제가 된 문장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신속 결의할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란 대목이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돼 아무 일도 없었고,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에 대해 헌재가 계엄이 좌절됐을 뿐 윤 전 대통령 스스로 멈춘 게 아니라고 꼬집은 것이다.헌재가 12·3 계엄의 수많은 장면 중 그날 밤 국회에서 군인들을 맨몸으로 막아선 시민들, 멈칫멈칫하며 몸싸움을 피하는 장병들에게 주목한 것은 헌법의 시선이 국민의 눈높이와 일치한다는 걸 보여준다.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이면서 그 어떤 법 기술로도 희석시킬 수 없는 반(反)헌법의 증거가 바로 그 장면이다. 문형배 헌재소장이 그 대목을 낭독할 때 많은 국민이 감명을 받은 건 우리 사회가 지향해온 가치와 상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헌법의 언어로 확인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좋은 판결문은 복종 대신 승복 끌어내
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을 조목조목 따질 때도 눈과 귀에 쏙쏙 들어오는 보통 사람들의 언어를 썼다.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 등의 대목에선 쉬운 말로 헌법의 가치를 일깨웠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을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국회를 배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해 헌법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 헌재 결정 이후 우려했던 불복 움직임이 벌어지지 않은 건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과 함께, 결정문이 국민의 보편적 상식을 쉽고 명료한 문장으로 풀어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판결에 시비를 걸려면 난해하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펼 수밖에 없는데 그걸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렵다. 잘 쓴 판결문은 읽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복종 대신 승복을 끌어내는 힘이 있다.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3 days ago
6
3 days ago
6

![[투데이 窓]경제 혁신의 길 '창업허브 국가로 대전환'](http://thumb.mt.co.kr/21/2025/04/2025041315290677457_1.jpg)
![[MT시평]중국 해양 간첩 사건](http://thumb.mt.co.kr/21/2025/04/2025041314494862910_1.jpg)
![[사설]“메시지 계엄” “담 넘은 건 쇼”… 첫 공판부터 ‘억지’ 일관한 尹](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14/131415051.1.jpg)
![[횡설수설/윤완준]1명만 더 사퇴하면 위헌… 위태로운 국무회의](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14/131414786.2.jpg)
![[오늘과 내일/이정은]‘적보다 나쁜 친구’와의 관세 협상 방정식](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14/131415017.1.png)
![[한규섭 칼럼]‘비상식 대 비상식’이 부른 20대 민심의 두 차례 변곡점](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14/131415005.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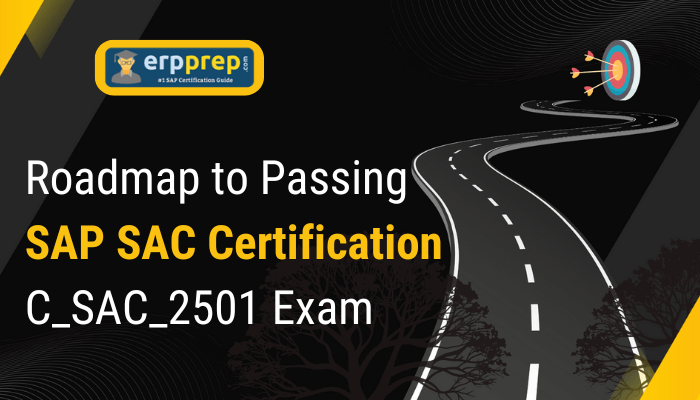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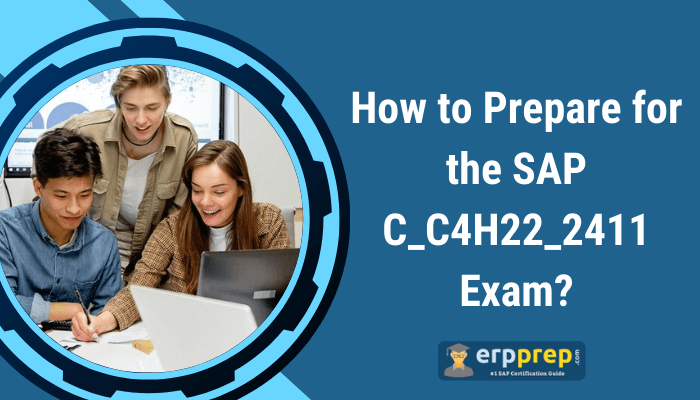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