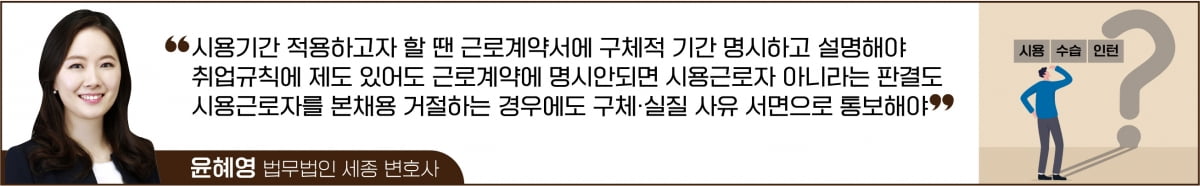
“3개월 시용이니까, 별 말없이 기간 끝나면 내보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신입사원이 입사한 지 두 달이 막 지났을 때, 직속 팀장이 신입사원의 근무태도나 능력이 영 '꽝'이라면서 해고 절차를 물어왔다. 인사담당자인 김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절차를 진행했는데, 돌아온 것은 신입사원의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었다.
이처럼 시용을 간단한 ‘테스트 기간’쯤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정식 채용을 예정하는 확정적인 근로계약이고, 자유롭게 별다른 통보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오해다. 특히 시용기간에 대해 아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기간 만료 시 그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도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시용 종료를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와 그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짚어본다.
# 시용의 개념
‘시용(試用)’이란 근로자를 정식채용하기 전에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등). 시용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기에, 기업에 따라 모습을 달리 하고, 구체적으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경영관행 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해진다. 기업 실무에서는 시용, 수습, 인턴 등의 용어가 혼용된다.
'수습'은 정식채용된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인 반면, '시용'은 정식채용 전에 업무적격성 판단을 위해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비록 ‘수습’이라는 용어를 썼더라도, 업무적격성을 판단한 다음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 시용에 해당한다.
#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가장 먼저 다퉈지는 것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시용이 적용된다는 말이 없으니 정규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시용제도가 있고, 근로계약 체결 시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으니 시용근로자라고 주장한다.
판례는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등).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관해 무효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97조의 해석상,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허용되므로, 시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하급심 판결도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누51776 판결).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시용기간은 근로자의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3개월인 경우가 많다.
# 본채용 거부의 사유 및 절차
판례는 시용계약을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 즉 정식사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할 경우 향후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계약으로 보면서,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그 정당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등). 이는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보다 완화된 기준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즉 해고 시 서면통지의무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시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용기간이 끝난 때 근로자에게 단순히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만 기재한 통지서를 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등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것이 판례다(위 대법원 2015두48136 판결 등).
시용계약 자체를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먼저 실무상 시용의 유형을 구분하면, ①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사 후 일정 기간을 시용기간으로 정하는 경우, ②시용기간을 특정해 별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③(시용임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단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②와 ③의 구분이 명확하진 않으나, 단순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라 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시용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05. 12. 13. 선고 2004누245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누3262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구합85161 판결 등).
②내지 ③의 경우 사용자로서는 시용계약임과 동시에 기간제 근로계약이므로, 그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곤 한다. 그러나 기간제 시용계약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사유를 말로만 이야기하거나 서면에 ‘기간만료’라고만 기재하여 준 경우 서면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당해고로 보는 것이 판례임을 유의해야 한다.
시용을 쉽게 여겼다가 예기치 않게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용 제도를 더욱 세심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겠다.
윤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3 weeks ago
4
3 weeks ago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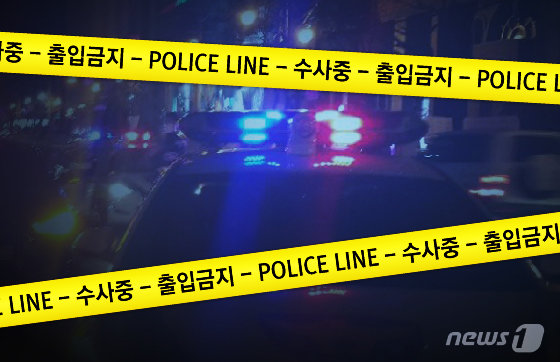







![[속보]李대통령, G7 참석차 내일 출국…“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 조율”](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6/15/131807427.2.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