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5/05/news-p.v1.20250505.522501a413814ee490f8af9308940655_P1.jpg)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 상비약 품목을 둘러싼 논란은 규제에 발목 잡힌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다. 10년 전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직능단체의 반발에 정부는 제도 개선에 손을 놓고 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상비약은 총 11종이다. 타이레놀, 판피린 등 해열진통제 3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약사법을 개정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도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제도 도입 첫해인 2012년 154억원이던 편의점 안전 상비약 공급액은 2023년 538억원으로 3.5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이렇게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제도는 13년째 제자리라는 점이다. 최초로 지정된 품목은 13종이었으나, 이후 해열진통제 2종이 생산 중단되며 현재는 11종으로 줄었다. 그사이 추가된 품목은 단 한 건도 없다. 품목 확대를 심의하는 지정심의위원회는 2018년 이후 7년간 열리지 않았다.
편의점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에서 상비약을 판매하고 그 품목도 수천개까지 가능한 선진국들과 대조적이다. 미국은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상비약을 약국뿐 아니라 슈퍼마켓,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판매한다. 지난해 12월엔 ‘추가 조건부 비처방 사용’ 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조건 아래 기존엔 처방약으로 분류된 제품들도 상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일반 상비약을 1~3종으로 분류하고 2~3종은 약국 외 매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약국 외에서 구매가 가능한 품목은 해외 주요국 모두 수백개에서 수천개를 오갈 정도로 범위가 넓다.
또 다른 문제는 동일 효능군 약물이 중복 포함돼도 개별 품목으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다. 예컨대 해열제 3종이 포함되면 전체 11개 한도 중 3개를 이미 소진한 셈이다. 지사제, 인공눈물, 화상연고 등 실생활에서 수요가 있는 약을 추가하기 어려운 구조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원론적으로 품목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기재부는 2016년부터 확대 필요성을 공식화했고, 복지부 역시 의정 갈등이 정리되면 대체 품목 지정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약사단체의 거센 반발에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은 효능과 효과만큼이나 부작용도 전제돼 있다”며 “단순히 산업적 판로 확장 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이 거론되지만 전문가들은 보완책일 뿐 편의점 상비약의 대체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공공심야약국은 대부분 새벽 1시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이다. 편의점업계 1위 GS25에 따르면 전체 상비약 매출의 11.9%가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다. 새벽 시간 약을 찾는 시민이 10명 중 1명 이상이라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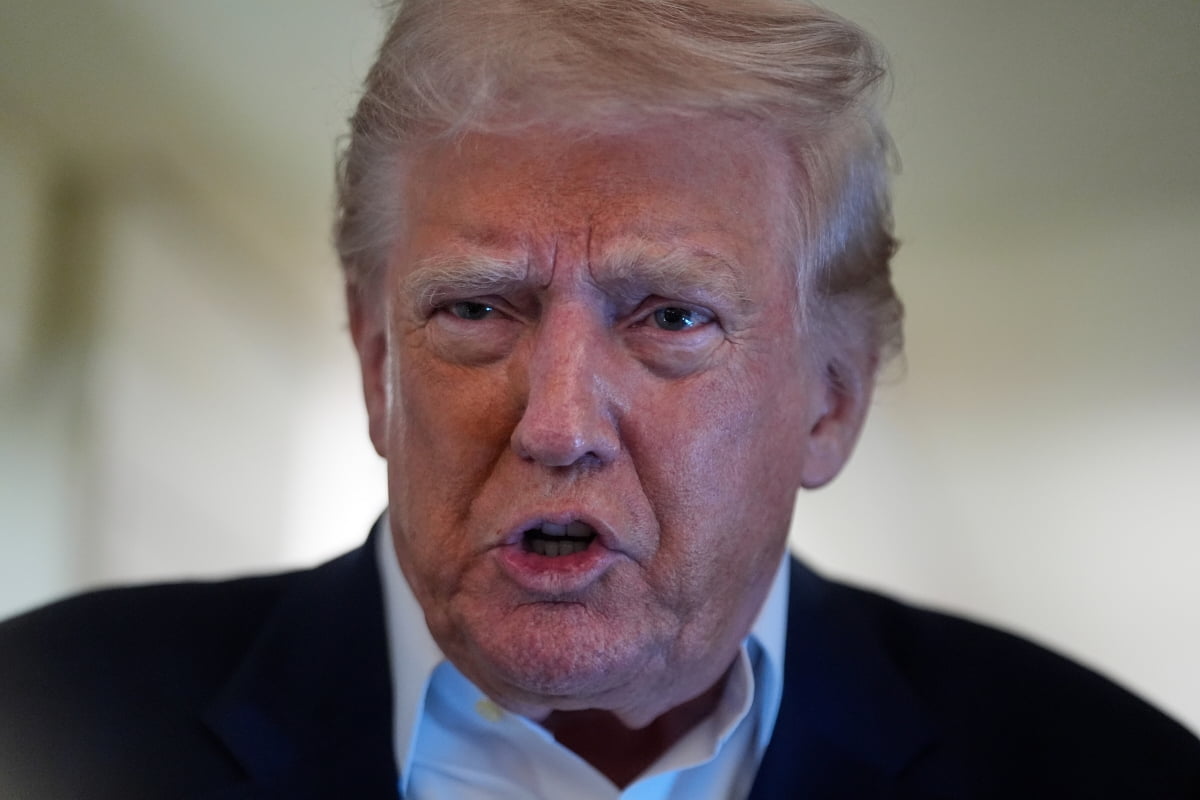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