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국회가 무시하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한 법률에 대한 국회의 조치를 동아일보가 조사한 결과 아직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이 29건에 달했다. 탄핵심판 등 민감한 사건에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마다 각 정당은 서로 ‘헌재 결정 승복’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국회 차원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얘기다.
특히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법률을 국회가 방치하는 게 문제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의 일종이지만, 바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혼란이 우려되는 사안에 한해 헌재가 국회에 법을 고칠 시간을 주고 개정이 되지 않으면 법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국회가 시한 내에 법을 개정하지 않아 효력을 완전히 잃은 법 조항이 7개나 된다.
대표적으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정한 개정 시한을 넘긴 지 15년이 지났다. 이에 따라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집회·시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선 안 된다는 게 헌재의 결정 취지이므로 법으로 일정 시간대를 금지하는 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도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하면서 법을 고칠 시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국회가 각계의 눈치를 살피느라 개정하지 않아 무효가 됐다. 국민투표법 개정도 시급한 사안이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일부 제한하는 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잃으면서 아예 국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설령 정치권에서 개헌에 합의한다 해도 국민투표법을 먼저 고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뜻이다.국회의 헌재 무시에 따른 피해는 일반 시민에게 돌아간다. 시간대의 제한이 사라진 집시법 때문에 심야나 새벽에도 집회·시위가 열려 시민들이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고, 낙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에선 몇 주 차까지 가능한지 등을 놓고 혼선이 이어지는 식이다. 제 할 일을 하지 않은 국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3 days ago
7
3 days ago
7

![[투데이 窓]경제 혁신의 길 '창업허브 국가로 대전환'](http://thumb.mt.co.kr/21/2025/04/2025041315290677457_1.jpg)
![[MT시평]중국 해양 간첩 사건](http://thumb.mt.co.kr/21/2025/04/2025041314494862910_1.jpg)
![[사설]“메시지 계엄” “담 넘은 건 쇼”… 첫 공판부터 ‘억지’ 일관한 尹](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14/131415051.1.jpg)
![[횡설수설/윤완준]1명만 더 사퇴하면 위헌… 위태로운 국무회의](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14/131414786.2.jpg)
![[오늘과 내일/이정은]‘적보다 나쁜 친구’와의 관세 협상 방정식](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14/131415017.1.png)
![[한규섭 칼럼]‘비상식 대 비상식’이 부른 20대 민심의 두 차례 변곡점](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14/131415005.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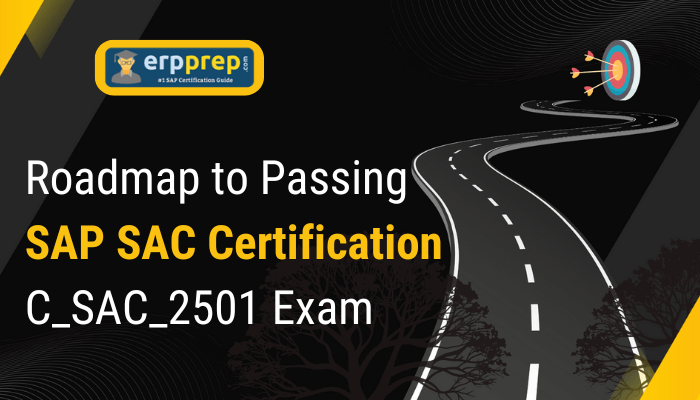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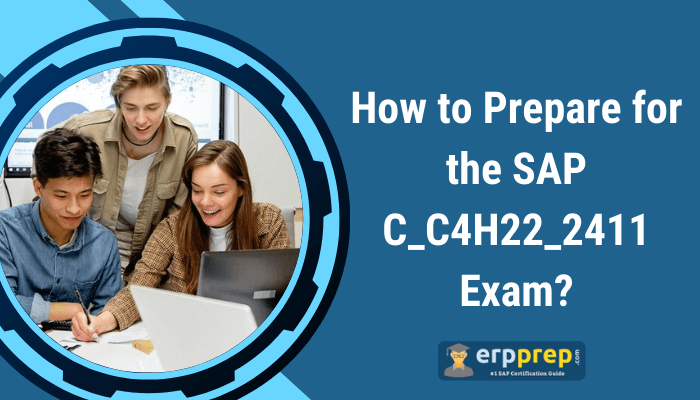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