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총부채 비율이 7년 만에 하락했다고 한다. 가계·기업·정부의 부채를 더한 국가총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17년 206.7%에서 2023년 250%로 매년 상승하다가 지난해는 244.5%로 낮아졌다.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와 건전 재정을 위한 노력이 부채비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일단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통상 경제는 성장하고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명목 GDP와 부채 잔액은 불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지난해 가계·기업·정부의 부채 잔액이 모두 증가하긴 했지만 명목 GDP 증가분에는 못 미쳤다. 2000년 이후 집권 기간 국가총부채 비율이 하락한 건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특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1%로 3년 연속 하락하며 가장 높았던 2021년(98.7%) 대비 8.6%포인트 낮아졌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수요 감소, 부동산시장 안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가계 재무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110.5%)은 전년 대비 2.5%포인트, 정부부채 비율(43.8%)도 0.2%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기업부채 비율이 하락한 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며 차입을 줄일 이유도 있어 마냥 반길 일만은 아니다. 정부부채 비율도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강조하면서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그 수준은 아직 미약하다. 국가결산보고서를 봐도 지난해 재정적자가 또다시 100조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4.1%)도 정부 목표인 3%를 5년째 웃돌았다. 경기 부진으로 법인세 등 세수가 예상에 못 미친 탓이다.
한국은행은 1분기에도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국가총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낮아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0%대 저성장이 예상되는 데다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 간 포퓰리즘 공약 경쟁이 가열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총부채 비율이 하락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가계·기업·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3 days ago
6
3 days ago
6
![[투데이 窓]경제 혁신의 길 '창업허브 국가로 대전환'](http://thumb.mt.co.kr/21/2025/04/2025041315290677457_1.jpg)
![[MT시평]중국 해양 간첩 사건](http://thumb.mt.co.kr/21/2025/04/2025041314494862910_1.jpg)
![[사설]“메시지 계엄” “담 넘은 건 쇼”… 첫 공판부터 ‘억지’ 일관한 尹](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14/131415051.1.jpg)
![[횡설수설/윤완준]1명만 더 사퇴하면 위헌… 위태로운 국무회의](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14/131414786.2.jpg)
![[오늘과 내일/이정은]‘적보다 나쁜 친구’와의 관세 협상 방정식](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14/131415017.1.png)
![[한규섭 칼럼]‘비상식 대 비상식’이 부른 20대 민심의 두 차례 변곡점](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14/131415005.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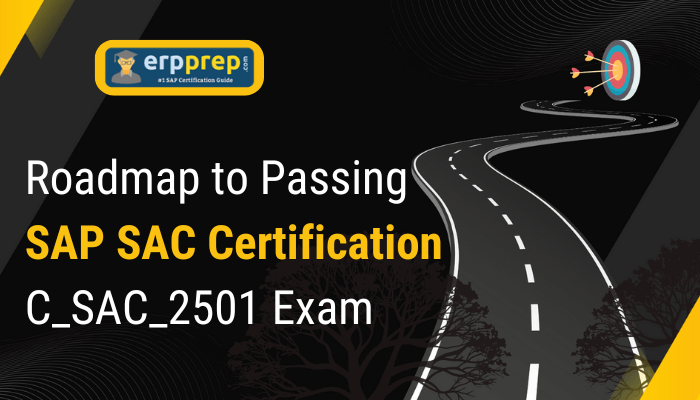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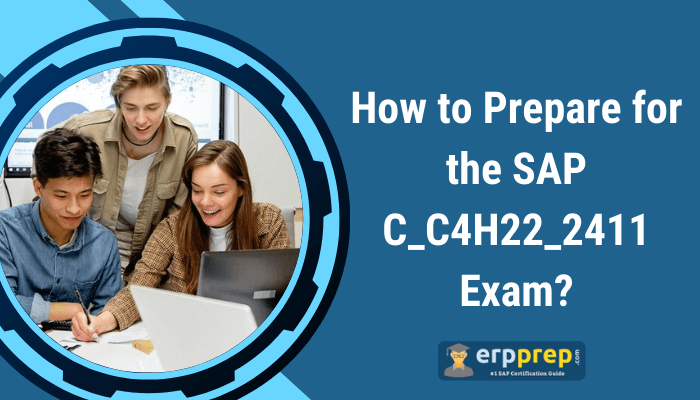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