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부동산 경기가 근 4년간 침체에 빠지면서 건설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올 들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가 열 곳에 달하고, 지난 분기 은행 연체율도 7년 만에 최악(0.73%)으로 치솟았다. 미수금이 늘어나면서 다수 건설사가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다는 업계의 어려움 호소가 커지고 있다.
공사비는 치솟고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은 위축돼 중견 건설사들의 자금 압박이 심해지는 딱한 현실은 충분히 짐작된다. 자금을 빌려서 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돈줄이 막힌 지 오래다. 고공 행진하는 원자재와 인건비는 옆에서 봐도 아찔할 정도다. 수도권 외곽과 각 지방, 비(非)아파트 시장에서의 부동산 침체로 인해 공사대금이 회수되지 않는 게 특히 큰 어려움으로 꼽힌다. 과잉 공급 지적이 나온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시장이 부진해지면서 부채비율이 200%를 웃도는 기업이 허다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법적 다툼에 휘말린 곳도 적지 않다.
지난 1분기 -0.2%의 역성장으로 가뜩이나 불황의 골이 깊어진 터에 건설업까지 무너지게 내버려 둬선 안 된다. 내실 있는 기업들까지 자금줄이 연쇄적으로 끊기는 줄도산 사태는 막아야 한다. 해당 기업과 업계 스스로 자구노력과 최선의 구조조정 매진이 기본 전제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업계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무엇보다 은행들이 자금 문제에 관한 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중 은행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 1분기 4대 시중 은행의 이자장사 이익은 10조 6000억원에 달했다.
건설업은 전후방 생산유발효과가 크다. 일자리 연계성도 높다. 살릴 수 있는 기업까지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게 하면 더 큰 손해가 온다. 금융 당국도 은행의 선의에만 맡겨 둘 게 아니라 자금 지원 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2009~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활용해 뇌관이 더 커지기 전에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추진해야 한다.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됐다. 업계 스스로도 위기의식을 갖고 고강도 군살빼기에 나서야 한다.

 4 hours ago
3
4 hours ago
3

![MS·메타 호실적에 美증시 강세…'사상 초유' 사회부총리 이주호 대행 체제 [모닝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ZA.40275725.1.jpg)

![“다들 고통받는 동안 은행 배만 불려”...정부 덕에 이자 장사로 호황 누리는 금융권 [뉴스 쉽게보기]](https://pimg.mk.co.kr/news/cms/202504/30/news-p.v1.20250430.62e4aabb59444bd0b65296a5d2799872_R.png)

![[사설]마침내 체코 원전 수출 본계약, K원전 도약 기회 잡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content/defaultimg.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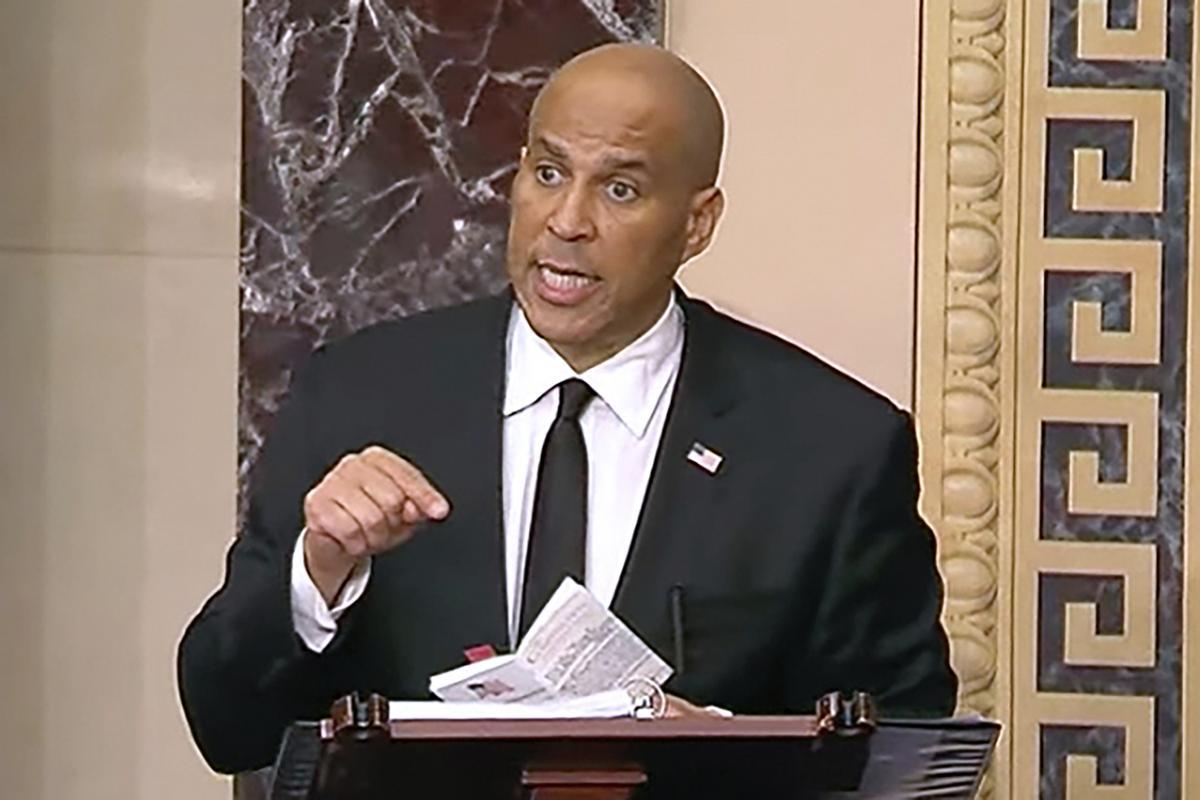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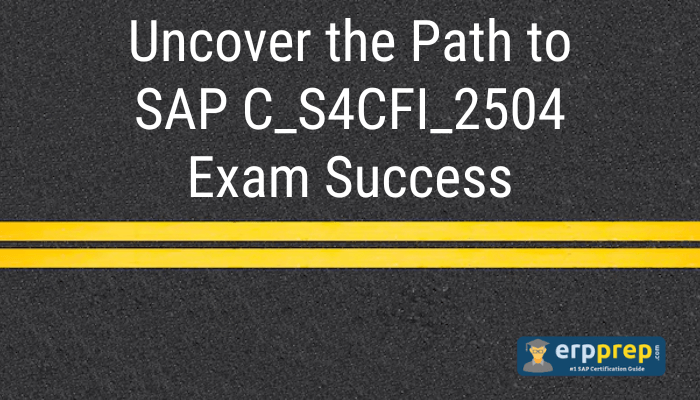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