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은 여전히 쿨한가?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위계와 격식에 얽매이기보다 개인 대 개인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경화되어 가는 유럽 및 독일의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베를린은 여전히 쿨하다. 그러나 이 도시의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고 젠트리피케이션은 심화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던 테크노 클럽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문화예술계를 향한 정부 지원금은 삭감되고 있다. 베를린에 오래 머문 이들에게 이곳의 쿨함은 점차 기록된 이미지나 이미 제도화된 과거의 향수로 기억되고 있다. 그래서 미술계의 많은 이들은 예술가의 낙원으로 여겨지던 베를린 이후의 장소는 어디인지, 베를린의 미래는 어떠할지 질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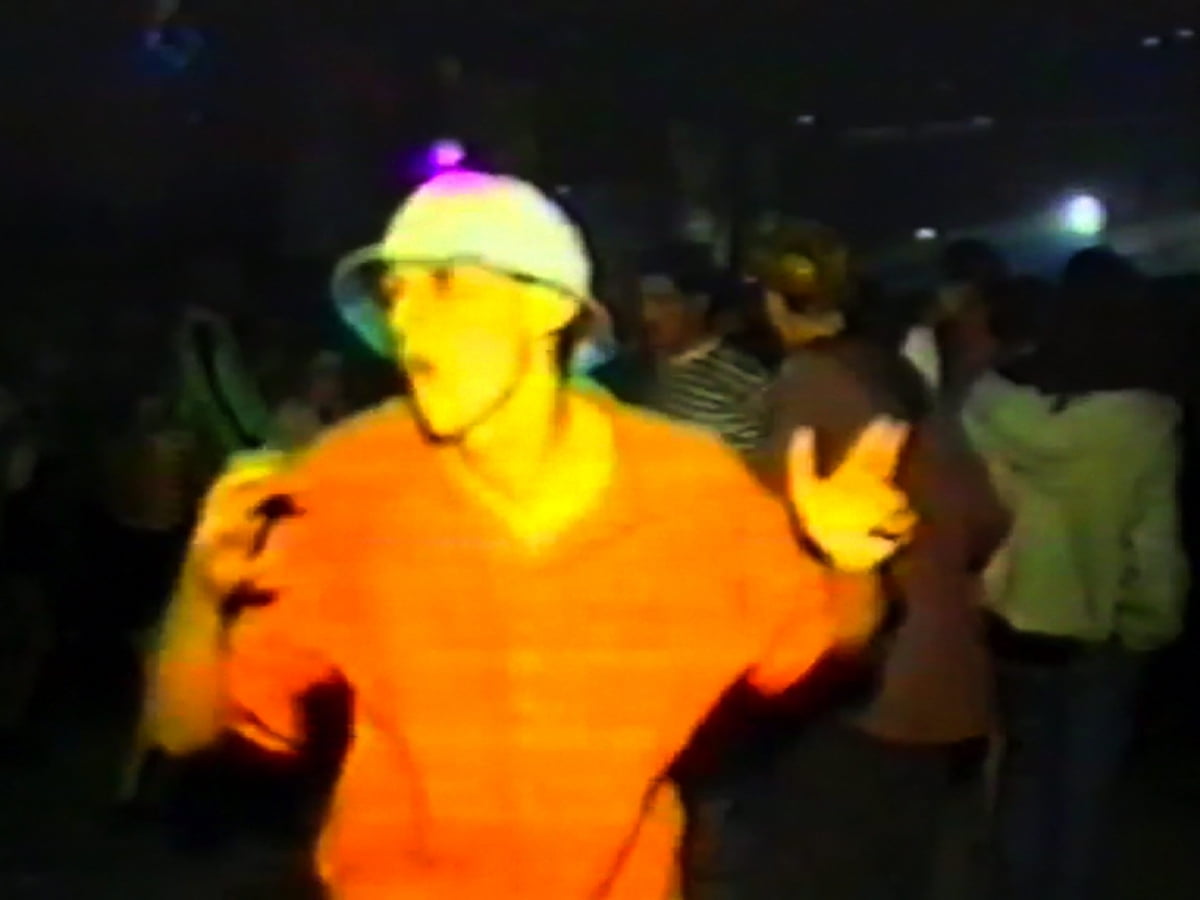
2025년 9월 11일부터 베를린의 율리아 슈토셰크 재단(Julia Stoschek Foundation)에서 열리는 마크 레키(Mark Leckey)의 개인전 《중세의 상처를 지나 (Enter Thru Medieval Wounds)》와 이어 9월 14일 같은 장소에서 스파이크 매거진(Spike Magazine)과 재단이 개최한 라운드테이블 〈포스트쿨 베를린 (Post-Cool Berlin?)>은 바로 이 지점을 짚는다. 쿨한 문화가 향수가 되었을 때, 그것을 회상하고 환기하는 것은 어떻게 미래에 대한 모색과 맞닿을 수 있을까.
마크 레키의 개인전은 1999년작부터 최근작까지 50여 점을 아우르며 그의 예술적 실천을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1964년 영국 북부 항구도시 버컨헤드(Birkenhead)에서 태어난 작가는 뉴캐슬 폴리테크닉에서 미술을 전공했고, 한때 뮤직비디오 제작을 꿈꾸었으나 음악 분야로의 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졸업 후 한동안 미술계를 떠났다가 1999년 비디오 작업으로 다시 돌아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레키는 비디오와 설치, 퍼포먼스, 사운드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영국 청년 문화와 서브컬처를 주요 주제로 삼아 기술이 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사회적 계급과 욕망, 정체성의 문제에 질문을 던지는 작업을 해왔다.

레키의 작업에는 그의 고향 풍경이 모티프로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시대 쇠퇴한 항구 도시에서 갈 곳 없던 젊은이들이 머물던 장소들 – 버스 정류장, 가로등 아래, 방파제 등 – 을 소환하며 억압과 제약 속에서도 발산하는 청년 에너지와 인간의 갈망을 표출한다.

대표적 작품으로 꼽히는 <피오루치는 나를 하드코어로 만들었다 (Fiorucci Made Me Hardcore)>(1999)는 1970~90년대까지 영국 레이브 문화를 담은 푸티지 영상으로 집단적 환희 속에서 몸을 흔드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 다른 주요 작업이자 작가에게 2008년 터너상을 안겨준 <순환하는 시네마 (Cinema-in-the-Round)>(2006.08)는 영상과 그 영상을 보는 이들의 영상을 교차시키며 작품 속 서사가 어떻게 생성되고 소비되는지를 탐구한다.

더불어 전시는 《중세의 상처를 지나》라는 전시 제목이 드러내듯 작가의 중세 도상학에 대한 관심과 해석을 보여준다. 그가 쇠퇴한 도시의 익숙한 풍경을 자신의 경험에서 끌어오듯, (도상적) 이미지가 재현을 넘어 수행하는 기능에 주목하며 이미지가 어떻게 순환하고 분열되며 변형되는지 탐색한다. 예를 들어 2023년작 <찬란한 어둠 (Dazzledark)>에서는 반짝이는 놀이기구, 네온사인, 인형 뽑기 경품 같은 여러 이미지가 배치된 영상을 통해 강렬한 황홀감을 자아낸다. 평범하고 때로는 초라한 소재들이 레키의 시선을 거쳐 거의 신비적 체험을 이끄는 이미지로 탈바꿈하며 이미지의 도상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마크 레키의 전시는 기억과 상상을 교차시키고 물리적 세계와 결합하며 이미지의 수행적 기능을 탐구한다. 그는 기억과 기록을 다루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전시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Y2K’의 청년 문화가 남긴 흔적과 그 이미지가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Y2K+25’에 다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물으며 현재와 연결시킨다는 데 있다. 지나간 시간은 현재를 비추며 과거의 쿨함은 어떻게 재현되고 기억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묻는다.
하지만 이러한 회상이 기득권 세대의 향수로만 소비된다면 쿨함은 더 이상 살아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다. 과거를 되새기는 일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이 현재의 청년들에게 또 다른 가능성과 상상력을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시 개막 후 열린 라운드테이블 〈포스트쿨 베를린〉은 그 질문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왼쪽부터] <포스트쿨 베를린 라운드테이블> 마티아스 리리엔탈, 헨리케 나우만, 파블로 라리오스, 악셀 비더. / 사진. ⓒ Hyunjoo Byeon](https://img.hankyung.com/photo/202509/01.41733248.1.jpg)
문화 수도로서 베를린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을 점검하고, 도시의 향방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그러나 무대에 앉은 이들은 폴크스뷔네(Volksbühne) 차기 예술감독 마티아스 리리엔탈(Matthias Lilienthal), 2026년 베니스 비엔날레 독일관 작가 헨리케 나우만(Henrike Naumann), 베를린 비엔날레 디렉터 악셀 비더(Axel Wieder), 아트포럼 에디터 파블로 라리오스(Pablo Larios)으로 이미 미술 제도권의 주류 인사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쿨 이후의 베를린’을 논하는 장면 자체가 아이러니했다. 패널의 시각은 관료적 행정 체제의 유연한 협업과 개방성을 강조했으나 정작 다른 세대나 주변부의 관점은 배제되어 토론은 역동성 없이 흘러갔다. 이는 베를린의 ‘쿨’을 담론화하려는 순간, 더 이상 쿨하지 않음을 증명하였다.
여기에 또 다른 아이러니가 겹쳐진다. 한때 청년 문화를 대변하던 세대 – 흔히 X세대라 불리는 45~60세의 세대 – 가 이제는 기득권으로 자리 잡아 여전히 쿨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회상은 ‘젊은 예술가가 집세를 내는 것도 힘들어진 베를린’의 현재와 단절되어 있으며, ‘포스트쿨 베를린’을 정의하고 서술하는 주체가 과거의 청년 세대, 현재의 기득권에 고착된 한계를 드러냈다.
전시와 라운드테이블을 보며, 이제는 주류가 된 세대가 쿨함과 발산하는 젊은 세대의 에너지를 다룰 때 ‘지금 여기’는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모래처럼 사라진다는 생각을 했다. 동시대의 젊은 세대와 미래를 모색하려는 질문은 던져지지만, 그 자리에 정착 청년의 목소리는 비어 있다. 이러한 모순은 오늘의 베를린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도시의 창의적 에너지와 청년 문화는 여전히 전 세계를 끌어들이는 원동력이지만, 동시에 제도화·브랜딩·관광 산업 속에서 소비된다. 그리고 상승하는 부동산, 삭감된 문화예술 지원금은 이들을 도시 밖으로 내몰고 있다. 레키의 전시와 라운드테이블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과정을 증언한다.
‘베를린은 여전히 쿨한가’라는 물음은 단순히 도시의 현재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쿨함을 말할 권리를 갖느냐는 문제로 확장된다. 기록된 청년 세대의 저항과 ‘포스트쿨’ 담론은 현재가 아니라 사라진 뒤 회상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을 강화할 뿐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베를린에서 진정한 쿨함과 힙함은 동시대 미술 전시장이 아니라, 아직 기록되지 않은 장면 속에서, 아직 무대에 오르지 못한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 속에서 발견될 것이다. 물론 쿨함이나 힙함이 반드시 좋은 퀄리티 및 의미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포착되지 않은 것, 제도 밖에 머무는 것이 지닌 힘과의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은 이처럼 계속되어야 한다.
베를린=변현주 큐레이터

 3 days ago
7
3 days ago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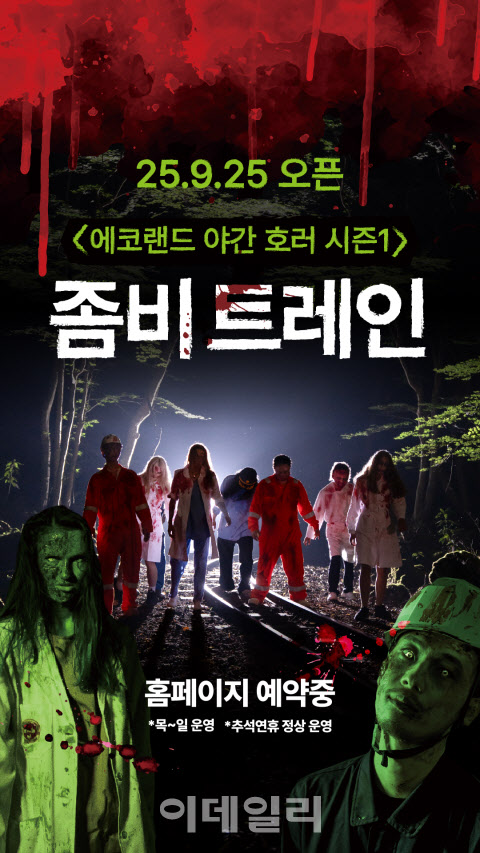


![[속보] 특검 “윤, 계엄논의 작년 3월부터 시작…원내대표도 인지 가능성”](https://pimg.mk.co.kr/news/cms/202509/03/news-p.v1.20250903.0f7ed213f6e645018311c6ea68869499_R.jpeg)

![생성형AI 끼고 상담하는 설계사…보험도 인공지능 혁신 진행 중[금융가 톺아보기]](https://pimg.mk.co.kr/news/cms/202509/04/news-p.v1.20250904.4e6ff2e473814eba97c10d2b6c1ee0e0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