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이라면 책임을 갖고 원하는 영화를 만들 의무가 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영화가 있어요. 관객을 좇는 영화, 관객을 따라오게 하는 영화입니다. 두 유형의 영화가 함께 존재해야 한다고 믿어요.”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맞아 부산을 찾은 자파르 파나히 감독이 지난 17일 던진 영화론은 서른 번째 BIFF를 뜨겁게 달구는 두 편의 작품을 설명하는 데 적확하다. 세계적인 화제작을 엄선한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에 초청된 파나히의 ‘그저 사고였을 뿐’과 기예르모 델 토로의 신작 ‘프랑켄슈타인’이 그것. 앞선 작품이 영화를 도구 삼아 억압적인 현실에 맞선 정치적 메시지로 관객의 가슴에 불을 지른다면, 뒤따르는 작품은 오직 영화라는 예술장르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미장센과 상상력을 갖춘 연출로 씨네필이 원했던 카타르시스를 안긴다.

극장 개봉을 앞둔 ‘그저 사고였을 뿐’은 지난 5월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영예인 황금종려상을 받았고,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인과 만날 ‘프랑켄슈타인’은 지난달 이탈리아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경쟁 부문에 올라 13분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영화의 지향점, 스타일은 달라도 우열은 가릴 순 없다는 뜻. 두 작품은 ‘영화의 바다’라는 별명을 가진 BIFF가 추구하는 영화제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부산에서 두 거장이 일으킨 커다란 파도를 맞닥뜨린 관객은 즐거울 따름이다.
파나히 “누구도 날 막을 순 없어”
‘그저 사고였을 뿐’은 불확실한 진실과 도덕적 혼란 속에서 인간성을 시험하는 영화다. 잊히지 않는 어제의 망령이 오늘을 발목 잡고, 내일까지 망가뜨리는 악몽 같은 현실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묻는다. 이란 권위주의 정권에서 억울하게 고문당한 피해자인 바히드는 우연히 만난 의족의 남성을 자신을 고문했던 정보관 에크발(페르시아어로 의족을 뜻함)로 확신하고 납치한다. 이 남성이 에크발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고문 피해자들을 찾아간다. 사진사 시바와 그의 전 연인 하미드, 결혼을 앞둔 골리 등 어두운 과거를 애써 외면한 채 살아가던 이들은 에크발로 추정되는 남성의 등장에 혼란스럽기만 하다. 죽여야 할지, 살려서 돌려보내야 할지 딜레마에 빠진 이들이 갈등하고 반목하는 과정에서 정의와 복수,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는 흐려진다.

로드무비의 틀을 갖춘 영화는 이란의 정치적 현실을 실감나게 그렸다. 그저 시작은 교통사고라는 일상적 사건에 불과하지만, 개인의 삶이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의 벽에 어떻게 짓눌리는지를 보여준다. 병원 직원부터 사설 경비원까지 휴대용 단말기를 들고 다니며 약자에게 뇌물을 받아 챙기는 모습,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되고 있다는 두려움에 서로를 의심하는 시민들의 모습 등 화려한 영상미는 없지만, 현실을 고발하기 위한 다큐멘터리적 리얼리즘이 돋보인다. 오랜 검열과 영화제작 금지, 가택연금, 출국금지 처분 등 정부의 억압에 맞서 영화를 통해 자유의 존재 의미를 조명해온 파나히다운 영화인 셈. 영화제에서 만난 파나히는 “누구도 내 영화제작을 막을 순 없다”며 “이 영화를 보는 건 분명 시간 낭비가 아닐 것이란 말을 관객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델 토로 “나를 녹여낸 이야기”
영화 ‘프랑켄슈타인’은 고전 반열에 오른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150분에 달하는 영화로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광기에 물든 인간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흉측한 괴물을 탄생시키며 벌어지는 비극과 파멸이라는 누구나 다 아는 줄거리다. 하지만 뻔하지는 않다. 괴물과 인간의 경계에 선 존재의 정체성을 묻는 서사의 질감, 아버지와 아들인 동시에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인 빅터와 괴물이 쓰는 관계의 드라마가 몰입도를 높인다. BIFF에 맞춰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델 토로는 지난 19일 “메리 셸리의 원작에 저의 자전적 이야기가 녹아든 작품”이라고 연출 포인트를 짚었다. 그는 “전쟁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부자간의 스토리, 성경에서 따온 카톨릭적 상징 등 자전적 요소가 영화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헬보이’(2004), ‘판의 미로’(2006) 등 섬뜩한 크리쳐(괴물)를 앞세운 호러 판타지 연출에 도가 튼 델 토로다운 상상력이 재밌다. 지금껏 스크린에서 묘사된 우락부락하고 흉측하기만 한 전형적인 괴물이 아닌 아름답고 이상적인 육체에 신생아 같은 순수함이 깃든 괴물로 변모시킨 게 대표적이다. 그는 “골상학을 참고해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9개월간 의상과 세트 등 소품을 준비했다”고 말한 의상과 배경, 필름의 질감을 품은 듯한 빛과 그림자 등 유려한 연출은 1억2000만 달러(약 1600억 원)에 달하는 제작비를 투자한 넷플릭스의 자본력과 만나 영화적 쾌감을 배가시킨다.
서로 다른 영화를 만들었지만, 파나히와 델 토로가 영화를 대하는 태도만큼은 묘하게 겹친다. “영화를 만드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영화를 만들 때 가장 좋다”는 파나히처럼, 델 토로 역시 “나의 삶을 영화로 맞바꾸는 만큼 의미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작품이 ‘좋은 영화’라는 평가를 받으며 화제를 낳는 이유다. BIFF에서 놓쳤더라도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그저 사고였을 뿐’은 다음 달 1일 국내 극장에서 전 세계 최초 개봉하고, ‘프랑켄슈타인’은 오는 11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부산=유승목 기자

 12 hours ago
4
12 hours ago
4



![[이 아침의 작가] 19세기 서구 열강의 탐욕을 고발하다](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속보] 특검 “윤, 계엄논의 작년 3월부터 시작…원내대표도 인지 가능성”](https://pimg.mk.co.kr/news/cms/202509/03/news-p.v1.20250903.0f7ed213f6e645018311c6ea68869499_R.jpeg)

![생성형AI 끼고 상담하는 설계사…보험도 인공지능 혁신 진행 중[금융가 톺아보기]](https://pimg.mk.co.kr/news/cms/202509/04/news-p.v1.20250904.4e6ff2e473814eba97c10d2b6c1ee0e0_R.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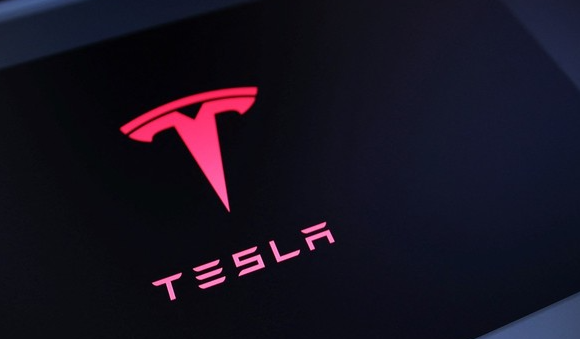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