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에 대한 정치권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인구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고령층 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다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져 60세 정년퇴직 후 5년간의 ‘소득 크레바스’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다만 호봉제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법정 정년을 상향하면 기업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청년 고용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달 초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 내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11월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한 관련 법안이 8건 올라와 있다. 대부분 임금 손실 없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로 노동계 입장과 일치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한동훈 전 대표가 정년 연장 논의를 띄운 이후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지난달 김위상 의원이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들이 ‘정년 연장’과 ‘퇴직 후 근로자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론은 아니다.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대선 주자들이 관련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8일 내놨다. 2016년 법정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자 청년 고용이 급감했다는 분석이 담겼다. 정년이 연장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만 55~59세 임금 근로자가 약 8만 명 증가하는 동안 만 23~27세 청년 근로자는 11만 명 줄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해 기업들이 퇴직 후 재고용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영계도 호봉제를 유지한 채 정년만 늘어나면 청년 일자리 감소와 생산성 악화로 이어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 관계자는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되 노사 협상을 통한 ‘선별적 재고용’을 허용해주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3 weeks ago
5
3 weeks ago
5


!["母가 꽁꽁 숨긴 돈뭉치 날릴 뻔"…154조 쌓여있는 '치매머니' [임현우의 경제VOCA]](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35391140.1.jpg)



![로봇의 한계는 어디까지…광고 촬영에 나타난 아틀라스 [신정은의 모빌리티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428505.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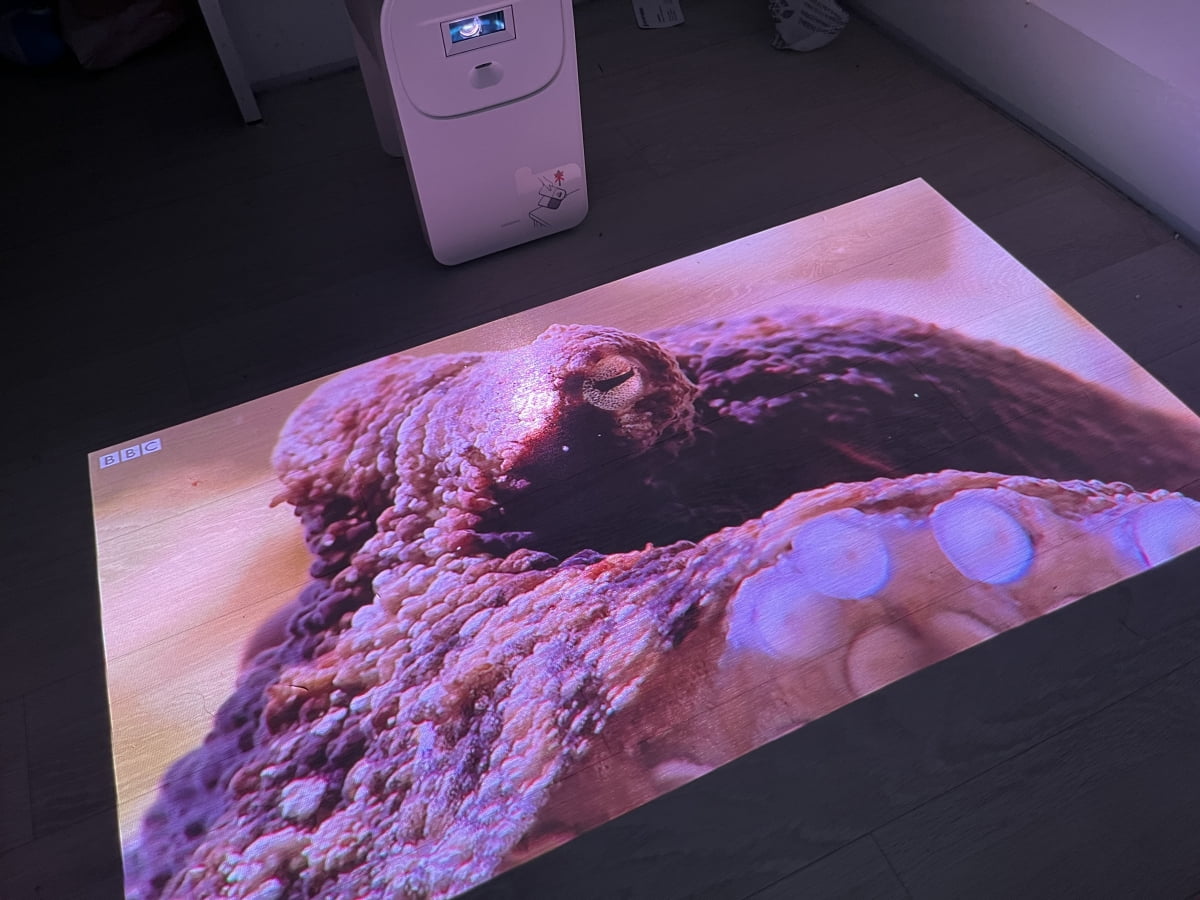



![“뭉클했다” 친정팀 환영 영상 지켜 본 김하성의 소감 [MK현장]](https://pimg.mk.co.kr/news/cms/202504/26/news-p.v1.20250426.d92247f59a8b45a6b118c0f6ea5157ef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