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웨스팅하우스 협약, 위기인가 기회인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509/07.37420649.1.jpg)
올해 1월 체결된 한국수력원자력-웨스팅하우스 합의는 분명히 제약이 크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한국이 단독으로 원전을 수주할 수 없고 반드시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만 진출해야 한다. 한국형 원전(APR1400)의 독자적 수출 길이 좁아진 셈이다. 그 결과 수익 배분 구조에서도 제약이 발생하고 향후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까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포함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 때문에 “과도한 양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분쟁의 불확실성을 제거했고, 웨스팅하우스 배분 비중이 기존 대비 낮아진 것이며, 미국·유럽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길은 좁아졌지만 길이 많아졌다는 측면에서 기회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제 이 합의 이후 한국이 어떤 전략으로 협상력을 높이고 자국 원전 산업의 미래를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원전 설계·조달·시공(EPC) 역량을 보유한 나라다. 두산에너빌리티의 대형 주기기 제작, 현대건설·삼성물산의 시공 능력, 한수원의 운영 경험은 웨스팅하우스가 미국과 유럽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필수적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해 건설 인프라가 약해졌고, 유럽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전을 다시 늘리려 하지만 실제 시공 경험이 부족하다. 프랑스는 최근 해외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결국 한국은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다. 협약이 아무리 불리하게 보이더라도 한국이 보유한 EPC·제작 역량 없이는 웨스팅하우스가 대규모 사업을 완수하기 어렵다. 이 점이 우리 협상력의 근간이다. ‘너는 나랑 꼭 같이 가야 해’라는 것은 ‘나는 너 없이는 못 간다’는 말과 같다.
다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 수주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원전 산업은 내수 기반이 튼튼해야 해외 시장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원전 비중을 줄여왔으나 앞으로는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수소 환원제철·석유화학·반도체 등 산업용 전력 수요도 폭증할 전망이다. 이 수요를 탄소중립 목표와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은 원전뿐이다. 국내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활성화되면 기술과 인력 단절을 막을 수 있고 ‘나는 너 없어도 된다’는 핵심 메시지를 만들 수 있다.
만약 원전 비중을 현 수준에 머물게 두면 기회는 다른 나라에 넘어간다. 국내 산업은 해외 사업에만 의존하게 되고 이는 곧 협상력 약화를 의미한다. 국내 수요가 살아 있어야 해외 기업과의 협상에서 “우리는 이미 자국에서 충분한 물량을 소화하고 있으며 해외는 선택”이라는 당당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앞으로 전략은 명확하다. 첫째, 국내에서 원전 건설을 재개해 산업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한다. 이는 해외 협상에서 가장 큰 지렛대가 된다. 둘째, 미국·유럽 공동 진출에서는 합작법인(JV) 형태로 역할과 수익을 명확히 나누고, EPC 및 제작 부문에서 한국 비중을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독자적 진출이 가능한 시장에서는 성과를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SMR 및 혁신형 원자로를 독자 개발해 기술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협약은 표면적으로 굴욕적 조건과 제한이 있다, 동시에 한국 원전 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의 EPC 능력과 운영 경험은 미국과 유럽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자산이다. 여기에 국내 원전 비중 확대를 통한 산업 기반 강화가 더해진다면 협약의 족쇄를 협상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한국 원전 산업이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를 파트너로 잡아두려는 웨스팅하우스는 우리가 사업 파트너로서 꼭 필요하다.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의 경쟁자 위치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미국 및 글로벌 사업 개발과 수행에 웨스팅하우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현재 계약을 최대한 활용하고 가까운 시기에 종목을 바꾸거나 자유계약 선수가 되어 날아갈 준비도 해야 한다.

 2 weeks ago
10
2 weeks ago
10
![[시론] 피지컬 AI를 주도하려면](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천자칼럼] 미·중 정상회담](https://img.hankyung.com/photo/202509/AA.41798471.1.jpg)



![[속보] 특검 “윤, 계엄논의 작년 3월부터 시작…원내대표도 인지 가능성”](https://pimg.mk.co.kr/news/cms/202509/03/news-p.v1.20250903.0f7ed213f6e645018311c6ea68869499_R.jpeg)

![생성형AI 끼고 상담하는 설계사…보험도 인공지능 혁신 진행 중[금융가 톺아보기]](https://pimg.mk.co.kr/news/cms/202509/04/news-p.v1.20250904.4e6ff2e473814eba97c10d2b6c1ee0e0_R.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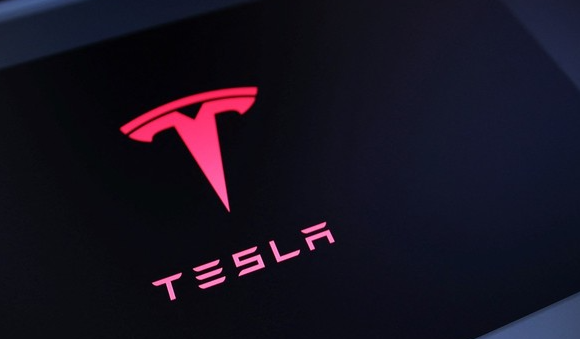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