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8년 동안 가게 창업부터 일을 도와준 여자친구여도, 근태 관리를 거의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한 데다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간 정황이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아닌 친소관계에서 일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A씨가 내연남 B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는 오랜 기간 내연관계인 B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중고주방물류 청소 및 관리 등 업무를 해왔다. A는 2005년 B의 부인과 자녀들이 사는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할 정도로 B와 가깝게 지냈다. B는 부인과 2012년 이혼했고 이후 2015년부터 A와 함께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둘의 관계가 틀어지고 B가 2023년 3월 어느날 A에게 "일을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파국으로 치달았다. A는 그간 자신이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라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주장하며 같은해 4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기도 했다.
결국 A는 B를 상대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3년치 임금 9308만원과 해고예고수당 300만원, 8년 근로에 대한 퇴직금 2460만원 등 총 1억2144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3년치 임금을 청구한 것은 임금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쟁점은 A가 B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였다.
A는 과거 시청에 제출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에 취업상태를 '임시·일용직'으로 기재한 서류와 B가 업체 블로그에 '저와 한 명의 직원이 시작해 미약하지만 고객님들을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라고 게시하는 등 A를 직원처럼 알린 점 등을 근거 삼았다. 이에 B는 "A와는 25년 전 만나 최근까지 사실상 부부처럼 지내온 사이"라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줬을 뿐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임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가 A에 대해 별다른 근태 관리나 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특히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지휘·감독'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재판부는 "A는 근로기간 중인 2015년, 2016년경 다른 사업장에서 알바를 했고 2020년 6월에서 8월엔 출근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 외에도 출근하지 않은 날이 다수 였다"고 꼬집었다. 특히 A가 자주 '오늘 못나갈 것 같아''오늘도 힘이 없어"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B가 '알았어'라는 간단한 답신만 보낸 점도 근태 관리를 하지 않은 근거가 됐다.
특히 B가 A에게 종종 생활비를 준 것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A가 B에게 '월급'을 달라며 독촉하는 메시지도 있었지만 소수였고, 대체로 병원비, 도시가스비, 축의금, 카드값 등 생활비를 달라는 내용이 더 많았다. 이에 B는 불규칙적으로 A에게 10만원~200만원 사이의 돈을 송금했다.
특히 A가 B에게 보고 없이 주방용품을 판매하고 받은 돈을 여러 번 사용해도 B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사실도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A는 특별한 친소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장 일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돕고, B가 생활비를 지급한 것"이라며 A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B의 손을 들어줬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근로 형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친분이 있는 사람끼리 동업을 하다가 틀어지는 경우 뒤늦게 임금·퇴직금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계약서나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해놓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3 hours ago
2
3 hours ago
2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헌재 "전원일치 인용" [사진issue]](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1.4005664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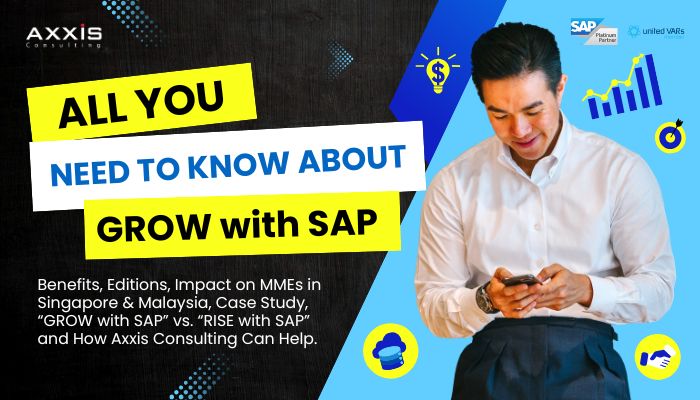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