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 월가(Wall Street)를 감독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한 해 동안 주가조작 등 증권·금융범죄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들에게 6억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7914억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한 명의 내부고발자에게만 2억7900만달러(약 3700억원)를 지급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때였던 2023년 당시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제보자들에게 지급한 포상금 총액은 고작 1억원(2023년 기준)에 불과했습니다. 인구나 경제 규모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양국 간 포상 제도 격차는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같은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워싱턴 D.C.에 위치한 SEC 본부를 두 차례 찾아 그 차이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3700억 포상금 크다? 신고로 5조 투자자 피해 막아
우선,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SEC는 거액의 포상금에 대한 외부의 놀라움과 달리, ‘지출한 금액’보다 ‘막은 피해’에 주목했습니다. SEC에 따르면 2억7900만달러(3700억원)를 지급한 제보는 무려 40억달러(약 5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SEC가 포상금 제도를 본격 도입한 2010년 당시 제보 건수는 연 334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1만8354건으로 5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때문에 SEC의 고위급 위원(commissioner) 중 한 명인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 위원은 2023년 11월에 SEC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제보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제도에 대해 “굉장히 성공적인 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포상금을 단순히 보상 차원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유인책으로 보는 ‘관점의 차이’가 제도 설계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같은 인터뷰 이후 올해 5월에 SEC에서 퍼스 위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올해 1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이같은 포상금 제도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입니다. 1기 트럼프 정부 때였던 2018년 1월 임명된 퍼스 위원은 7년 넘게 위원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임기(5년)는 만료됐으나 2기 트펌프 정부 출범 이후 후임자 선정 없이 계속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는 셈이죠.
 |
| 2023년 기준 주가조작 등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미 비교.(그래픽=김정훈 기자) |
 |
| SEC의 고위급 위원(commissioner) 중 한 명인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 위원이 지난 5월 미 워싱턴 D.C.에 있는 SEC 본부에서 이데일리와 만났다. 퍼스 위원은 ‘대한민국 새정부의 증권시장 정책에 대해 조언하고 싶은 점’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하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통역=제레미 서·Jeremy Suh) |
퍼스 위원을 올해 다시 만나 제도를 시행하는 ‘집행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지난 5월 만난 퍼스 위원은 “내부고발자 포상금 등 SEC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강력한 법 집행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가조작이나 금융 사기극을 벌이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종신형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앞서 버나드 메이도프는 136개국 3만7000여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폰지 사기’를 벌였습니다. 투자자 피해액만 650억달러(72조5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같은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는 교도소 복역 중인 2021년에 감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FBI “사기왕” 수사·공개…솜방망이 처벌 없어
 |
| 미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수사국(FBI) 본부를 가보면 버나드 메이도프 사건 사진을 볼 수 있다. 방문객들은 범죄 내용, 피해 규모, 사기 방식 등의 내용과 함께 메이도프의 사진 위에 선명하게 적힌 ‘사기의 왕’(The king of fraud)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미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수사국(FBI) 본부에 가면 버나드 메이도프 사건이 ‘FBI의 역대 주요 사건’ 중 하나로 일반에 공개돼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 사퇴의 원인이 된 ‘워터게이트’ 사건과 나란히 전시돼 있지요. 미국이 얼마나 자본주의 신뢰를 깨는 경제 범죄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강력한 법 집행은 제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포착·조사·처벌하는 조직이 탄탄해야 하고 인력·예산 지원도 충분해야 합니다. 미 SEC는 증권범죄 관련해 강제조사권, 통신조회, 계좌추적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범죄 특성을 고려해 범죄자를 신속 처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같은 권한이 사실상 없는 우리나라 금융위, 금감원과 다른 현실입니다.
인력·예산 지원 격차도 큽니다. 퍼스 위원에게 증권·금융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 규모를 묻자 약 1400명(2023년 기준)이라고 답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이 70명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이 20배나 많은 셈입니다. 그 뒤로 일부 증원이 됐지만 한미 간 인구, 경제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한미 간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주가조작 감시 인력, 한미 20배 격차
 |
|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한국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비교한 내용이다. 2023년 당시 70명이었던 인원이 일부 증원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임금, 조직, 권한은 큰 차이 없이 제자리 걸음이다. (자료=각 기관 종합) |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투명성’입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최대한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퍼스 위원은 지난 5월 이데일리 만나 “강력한 법 집행의 핵심은 국민이 그 기준과 과정을 명확히 아는 것”이라며 SEC는 법령 해석, 제재 사유, 혐의 내용, 신상 정보를 투명하게 모두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EC는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비공개를 유지하지만, 벌금·고발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SEC 웹사이트에 범죄자 실명, 혐의, 조치 내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통해 검찰 송치, 과징금·과태료를 결정하더라도 범죄자 신상조차 비공개입니다.
이때문에 우리나라에선 투자 사기로 투자자들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고 수익금을 은닉한 뒤, 몇년만 감옥에 있다가 간판만 바꿔서 다시 사기를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던 직후인 2023년 9월 금융위원회, 법무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증권범죄자 신상 공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상 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2023년 9월21일자 <“증권범죄 엄벌”…계좌동결·통신조회·신상공개 추진>)
주가조작하면 SEC 웹사이트에 실명까지 낱낱이 공개
 |
| SEC는 지난해 12월17일 SEC 웹사이트에 ‘Major Fraud(중대한 사기 사건)’ 이름으로 지난해 증권시장 등과 관련해 처분한 사건의 범죄자 실명을 포함한 신상, 범죄 내용 등을 공개했다. 밑줄 그어진 곳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증권범죄 내용을 볼 수 있다. (사진=SEC) |
그리고 제도 투명성도 필요합니다.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같은 파격적인 제도일수록 ‘견제 장치’로서의 제도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퍼스 위원은 작년 9월19일 마크 우예다 SEC 위원과 함께 발표한 내부고발자 포상금 제도 관련 성명서(Nothing to See; Nothing to Say: Statement on Recent Whistleblower Awards)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부고발자는 최대한 많은 포상을 원한다. SEC 집행국은 내부고발자들을 유도하기 위해 포상을 크게 주려는 경향이 있다. SEC 자체도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보상의 규모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 이렇게 일련의 유인이 있을 때 초래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견제’하려면 결정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최대한 공개하고 법령·규정을 어떻게 해석·적용했는지 법적 논리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이처럼 보면 볼수록 우리나라와 미국은 다릅니다. 한미 간 제도 관련 ‘관점의 차이’, ‘집행의 차이’, ‘투명성의 차이’는 서로 다른 문화적 역사적 배경도 있습니다. 셀레스트 애링턴(Celeste Arrington) 조지워싱턴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 만나 “미국 정책과 제도를 잘 살펴보면 조지워싱턴 초대 대통령 때 세계 최초로 시작된 민주주의의 원리가 녹아져 있다”며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정책 효율성 측면에선 불리한 측면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미 SEC의 사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자 보호가 어떻게 실현돼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참조할 만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파격적인 주가조작 포상금 제도처럼 자본주의 생리를 반영한 제도를 설계·도입한 점 △강력한 법 집행과 이를 뒷받침하는 탄탄한 제도·조직·인력·예산 △부작용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의 투명한 집행·공개 등은 투자자 보호를 우선하는 정부라면 고려해 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단순히 포상금 액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금융위·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투명성·공공성 강화”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피눈물 흘리는 투자자들이 없도록 지난 7월 발표한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부터 모두 실천되길 기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정책적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1 day ago
3
1 day ago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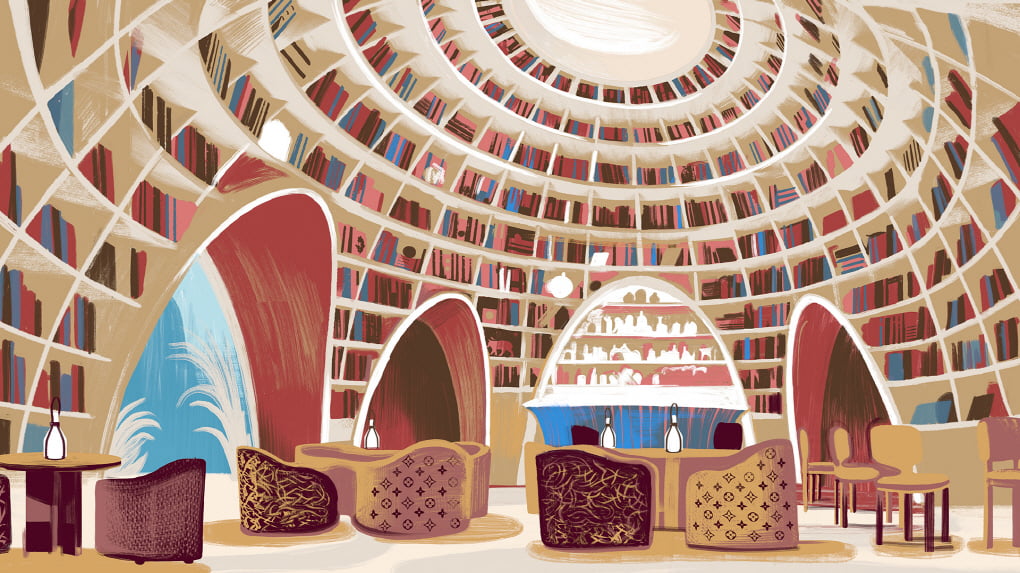


![중국서 불티나게 팔린다더니…'제네시스'도 뛰어들었다 [모빌리티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510/01.40654944.1.jpg)




![[단독] 만취해 운전대 잡은 30대 여성…중앙선 침범해 택시와 충돌](https://amuse.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JYP 박진영, 이재명 대통령 손 잡는다…“K팝 기회 살리려 결심” [이번주인공]](https://pimg.mk.co.kr/news/cms/202509/14/news-p.v1.20250910.34b4477db9874ff8a7eb9cb0d1087d7d_R.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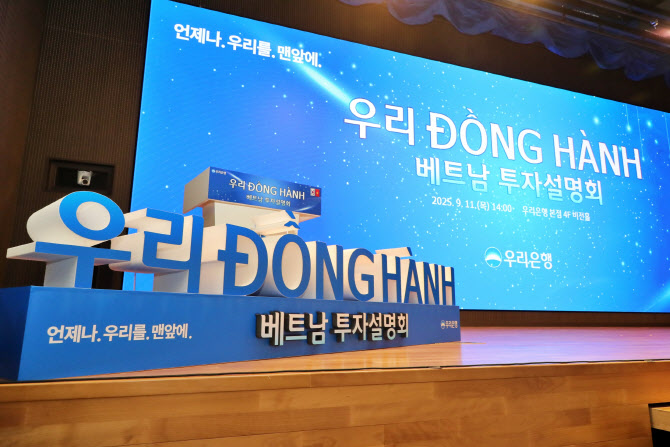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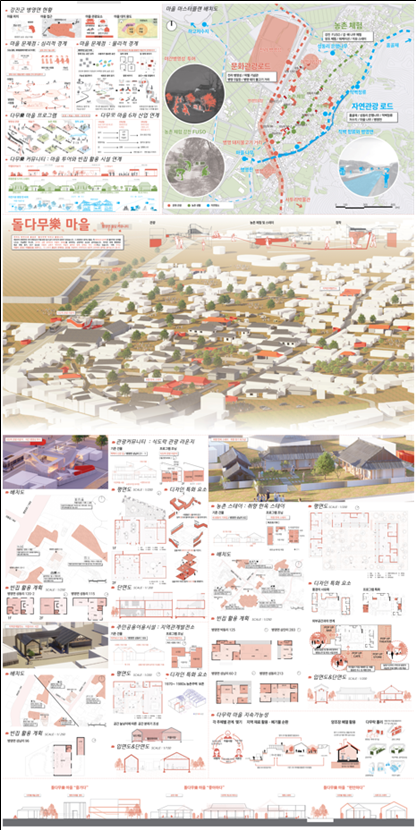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