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이 성장 궤도로 복귀하는 데에는 서비스산업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컴퓨터, 인공지능(AI), 데이터처리, 과학 기술개발(R&D) 등 고기술 서비스업의 혁신이 성장을 이끌었다.
반면 한국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저부가가치 산업인 음식점업 등이 중심인 한국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팬데믹 이후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저성장 늪에서 좀처럼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3일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평가 및 정책적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양적으로는 성장했다. 국내총생산(GDP)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취업자 중 65%가 서비스업에서 일한다.
하지만 서비스산업의 질적 수준은 높아지지 못했다.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20년째 제자리다. 생산성이 2005년께 제조업의 40%대로 내려왔고 지난해 39.4%를 기록하는 등 정체 상태가 뚜렷하다. 저부가가치 산업인 음식점업 등의 비중이 높은 영향이다.
팬데믹 이후에도 생산성 회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민간서비스업 생산성은 2020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소했다가 지난 2022년께 큰 폭으로 반등했지만 이후 소폭 하락한 상태다. 장기 증가추세에 비하면 10%가량 낮다.
이는 최근에 저성장 기조로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성장기여도는 2014~2019년 0.8%포인트에서 2020~2024년 0.7%포인트로 소폭 감소했지만 서비스산업 기여도는 1.7%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급감했다.
서비스산업 중심 국가인 미국 대비 한국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5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9.9%)은 물론 한국과 유사한 제조업 중심 국가인 독일(59.2%)과 일본(56.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이런 한국 상황과 달리 서비스산업 혁신이 성장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미국의 비즈니스 부문(농업, 정부 부문 제외)의 노동생산성은 팬데믹 이후 연평균 2.0% 증가했는데, 미국 중앙은행(Fed)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진 영향이었다.
구체적으로 Fed는 컴퓨터시스템 설계, 소프트웨어 퍼블리싱, 데이터 처리 및 호스팅, 과학 연구 및 개발 등 고기술(high-tech) 서비스업에서 신규기업의 진입이 뚜렷한 점을 생산성 향상의 비결로 꼽았다.
한국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이 높아지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한은은 "제조업의 보완적 역할만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산업을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보지 않아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서비스업 투자율은 2000년 26%에서 2022년 18%로 감소했다.

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도 문제다.한은은 한국 서비스산업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도 기업 총매출의 약 98%(2021년 기준)가 정부·공공, 국내 기업·소비자와의 거래 등 내수에 집중돼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등 해외 빅테크들은 적극적으로 서비스 수출에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는 평가다.
한은은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1년 처음으로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변화된 상황을 감안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을 연계하는 산업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안의 내용이 바뀔 필요는 있다고 봤다.
서비스업 부문별 대응이 달라져야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흔히 서비스업이라고 보는 음식점업 등 저부가가치 부문은 자영업자 난립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봤다. 적당한 수준의 임금일자리를 늘려 자영업자가 창업 대신 임금근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한다는 것이다.
게임산업, 헬스케어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은 해외진출에 집중해야한다고 봤다. 한국이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만큼 이와 연계된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것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8 hours ago
1
8 hours ago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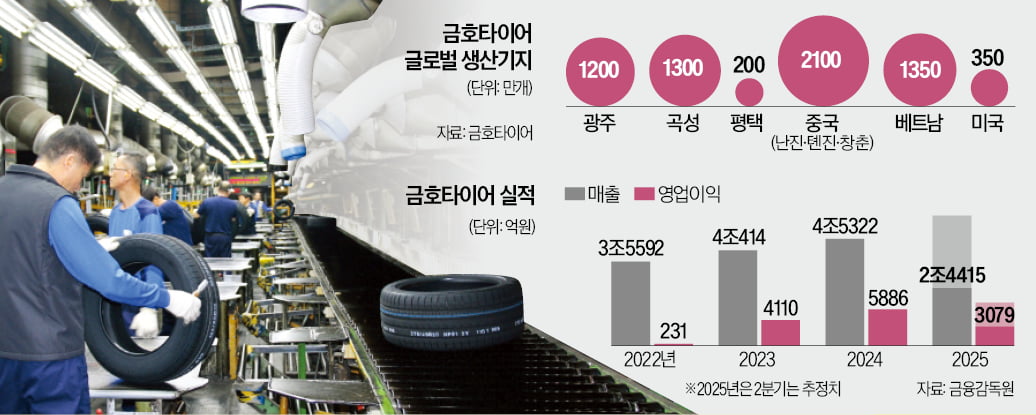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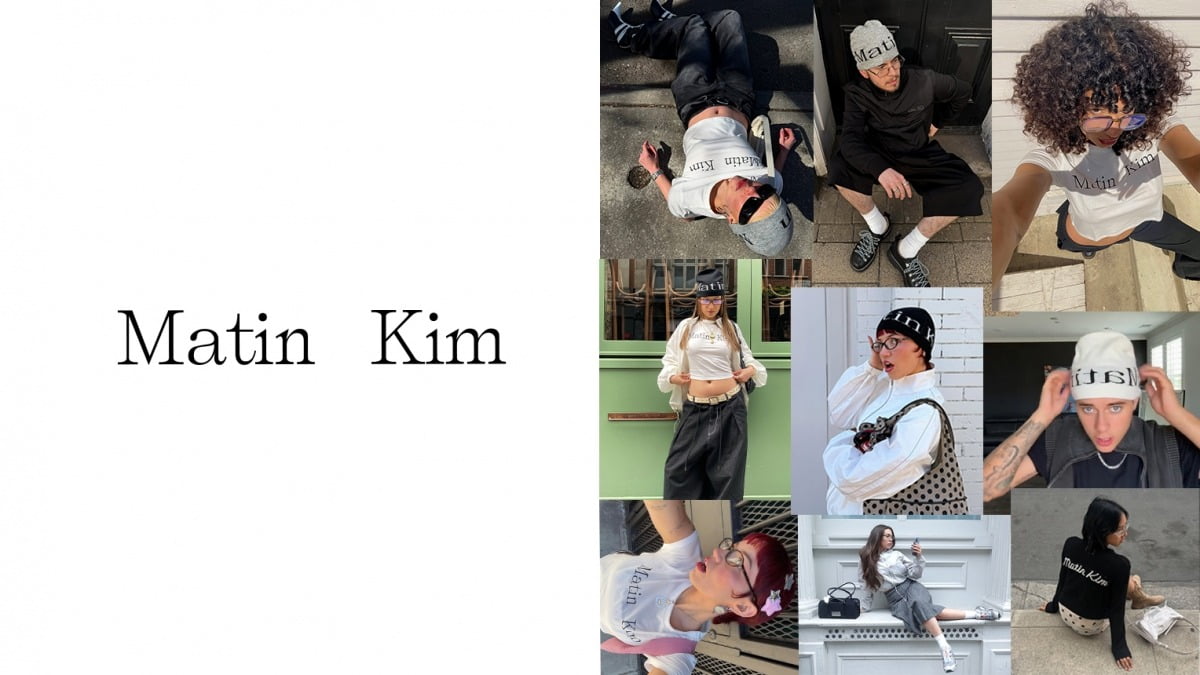


![[단독] 문재인 정부 시절 제도 사실상 부활…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안 팔면 대출 불가](https://pimg.mk.co.kr/news/cms/202507/03/news-p.v1.20250703.d72c6ece8ddc436cb58420ee94eae931_R.png)






![[속보]李대통령, G7 참석차 내일 출국…“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 조율”](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6/15/131807427.2.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