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영미시 번역 정은귀 교수
산문집 '번역가의 단어' 펴내
AI가 문학 이해 장벽 낮춰도
고민하는 번역가 역할 중요
'번역 후기'는 인간의 전유물
"괴롭긴해도 신비로운 작업"

문학 번역은 계속 좁아져가는 세계다. 원어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에서 부유하다, 물줄기를 틀어 하나의 다른 언어로 잡아채는 일. 적절한 말이 없다면 원어를 옮기지 않은 채 증발시키고 마는 일. 업의 본질도 그렇지만, 업의 영역 또한 서서히 좁아지고 있다. 인공지능(AI)의 출현으로 업계가 위태롭다는 진단은 이제 낯설지 않다.
생성형 AI가 만조(滿潮)처럼 번역계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때. 최근 매일경제와 만난 영문학자이자 번역가인 정은귀 한국외대 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는 AI의 위협에도 번역의 미래를 긍정했다. "AI의 도움으로 외국 문학과 문화를 이해하는 벽은 더 낮아졌죠. 하지만 해석 가능성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번역가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어요."
지난 20년간 영미 시와 한국 시를 양방향으로 옮기며 영미 시 번역의 대가로 알려진 정 교수는 최근 세 번째 산문집 '번역가의 단어'를 펴냈다. 이번 산문집은 시의 행과 연에 숨은 의미와 시어를 해석해 옮기는 일의 희노애락을 탐구했다. 특히 책에는 AI를 경계하면서도 "AI는 느린 참을성과 예리한 결단이 없다"는 결론이 곳곳에 스며 있다.
"시의 매력은 딱 한 편으로도 그 나라 역사와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을 확 보여주는 데 있죠. 애증 같이 복잡한 감정을 담아내기도 하고. 이걸 해석해 번역하려면 복잡하고 오랜 고민을 거쳐 결정해야 해요. 그런데 AI는 너무 빠르게 평면적인 결론을 내죠."
'AI와 번역'이 요즘의 최대 화두라고 언급한 정 교수는 챗GPT 등 생성형 AI에 자주 시 번역을 맡겨본다. 그가 소개한 AI 오역 사례는 숱하게 많았다. 미국 원주민 시인인 셔먼 알렉시가 인디언 절멸의 역사를 녹여 써낸 시 '전당포(Pawn Shop)'의 한 구절을 오역한 결과물을 언급할 땐 실소를 짓기도 했다. "'그 많은 인디언들은 어디로 사라졌는지(Where the skins disappeared to)'란 구절이 나와요. 레드 스킨(Red skin)이 인디언을 지칭하는 속어라 해석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AI는 그냥 '피부'로 번역하더라고요. 바보 같이(웃음)."
무엇이 AI와 차이를 만드는 걸까. 정 교수는 시 번역을 "신비롭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열혈 독자의 마음이 비평가의 탐구심으로 변모한 다음, 단 하나의 결론을 내야 하는 번역가의 냉정함에 이르는 일. 원고에 마침표를 찍고 나서도 더 나은 가능성을 찾지 못한 것 같아 후회가 남는 일. 오역도 피할 수 없는 일. 정 교수는 이 모든 과정을 '번역 후기'에 담는다. 속도가 생명인 AI가 수행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가 저서에 "후기야말로 AI는 당도하지 못하는 지점"이라고 적은 이유다.
"너무 괴로워서 번역을 마쳤는데 후기를 쓰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냥 기다려요. 번역 후기가 제대로 써져야 이제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괴롭고 후회가 남는 작업. 그럼에도 2020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인 루이즈 글릭의 전집과 앤 섹스턴,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스 등 20여 권의 영미 시집을 국내에 꾸준히 전해온 그에게 번역을 이어온 원동력을 물었다. "시를 너무 사랑해서"란 대답이 돌아왔다. 이 역시 AI엔 없는 감정이다. "하루 종일 시를 생각해요. 좋은 시를 읽으면 저절로 번역에 적절한 말이 저절로 떠올라요. 설렜다가 곤혹스러웠다가, 어쩔 줄 모르다가, 체념도 하게 되죠. 후기를 쓰며 (원고를) 떠나보내기도 하고. 시를 (독자들에게) 나눠 드리고 싶은 마음도 커요. 결국 사랑 아닐까요(웃음)."
[최현재 기자]

![[포토]'야구대표팀 코치진, 반가운 손인사'](https://thumb.mtstarnews.com/21/2025/11/2025110814113781984_1.jpg)
![BAE173 日 매니지먼트, 도하 계약 불이행에 피해입었다 "상황 심각하게 인식" [공식] [전문]](https://thumb.mtstarnews.com/21/2025/11/2025110813573594945_1.jpg)


![가을 설악, 선계(仙界)에 드니 찾아오는 경외감 [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11/07/132716428.1.jpg)

!['명문구단의 역사, 그렇지 못한 성적' 김상우 감독 "더 좋은 경기력 보여야"... '창단 30주년 홈경기' 필승 다짐 [대전 현장]](https://thumb.mtstarnews.com/21/2025/11/2025110812580939883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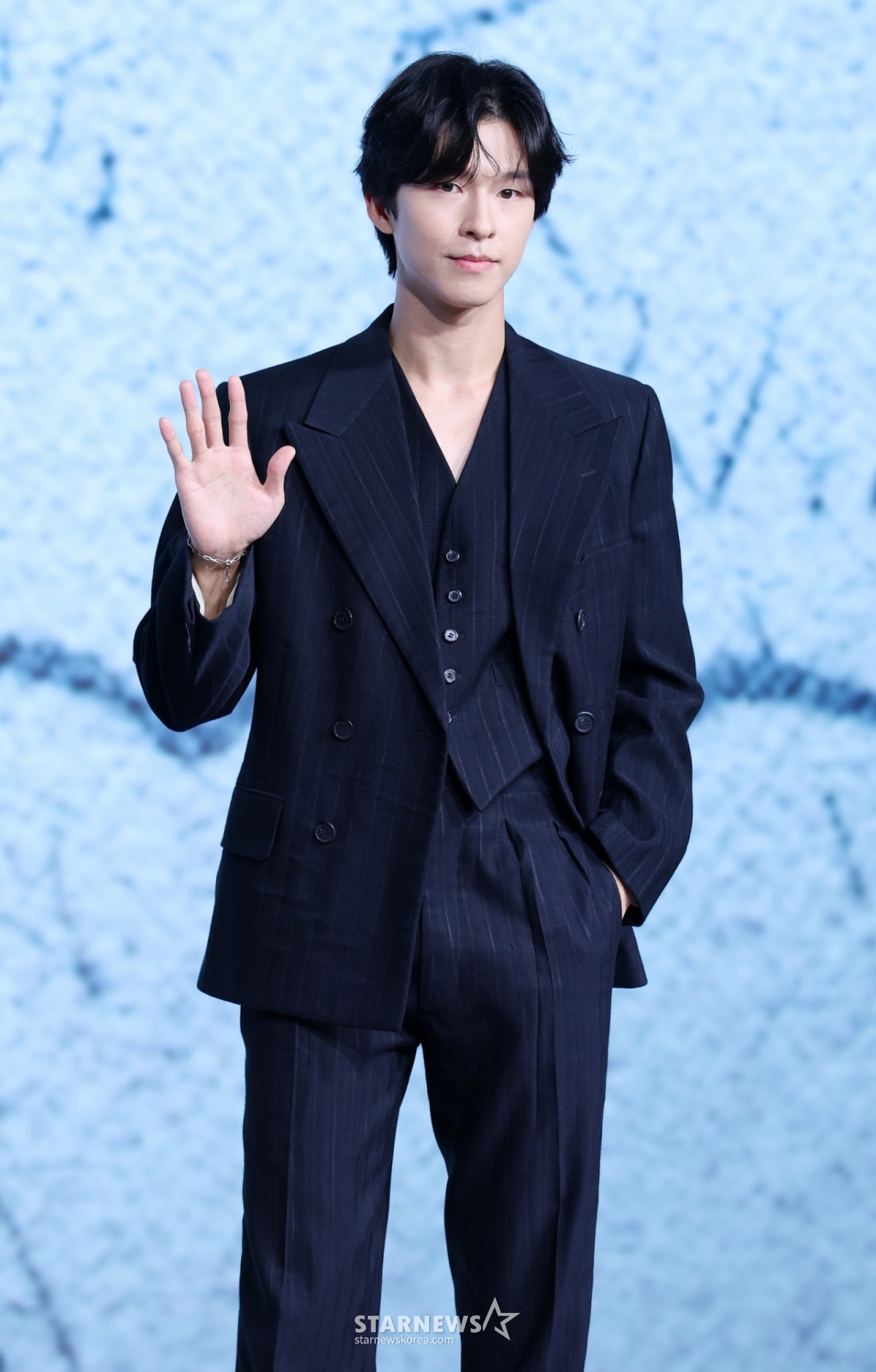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