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건설로 경기부양하려다 부진 장기화
중국, 투자 효율성저하로 부동산부양에 신중
“AI, 기후변화 대응하는 건설투자 확대해야”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10/26/news-p.v1.20251026.bd9fdd5c0d904b16aa462ee07931320e_P1.jpg)
경기부양을 위해 지나치게 건설투자에 의존할 경우 정부·가계부채가 쌓이면서 오히려 경기회복력이 저하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6일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최근 4년간 역성장에 빠진 국내 건설투자 부진을 놓고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비추어 봤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 버블이 붕괴된 이후 정부가 공공투자 확대로 건설경기를 살리려 노력했지만 장기침체를 피할 수 없었다. 이미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건설투자를 확대하자 재정이 악화하면서 정책 여력이 제한됐다. 가계는 주택 경기 활성화 정책 영향에 따라 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를 늘렸지만,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부채 상환이 이뤄지면서 장기간 소비가 위축됐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과잉투자를 지속한 결과 2021년부터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수요·공급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부진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투자 효율성 저하, 재정 부담 등으로 과거와 같은 전면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내 사회갈등 우려와 과거 일본의 경험도 영향을 줬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은 두 나라 사례를 통해 건설 중심의 경기부양은 단기적 효과를 갖지만, 가계와 정부 부채를 누적시켜 장기적으로 성장 회복을 저해한다고 봤다. 특히 건설 자산의 경우 효용이 지속되는 기간인 내용연수가 길기 때문에 한번 투자되면 그 조정과정도 길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추이는 최고점에 도달한 후 저점을 찍을 때까지 평균 27.2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점에서 건설투자 비중이 높았던 나라일수록 조정기간이 길고, 조정 시 하락폭은 더 커져서 저점이 낮았다.
한은은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인구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때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토대가 될 수 있는, AI 확산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인프라 고도화 등의 건설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경기부양 목적의 건설투자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현금 많은 분당, 집값 싼 은평·강서 날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content/defaultimg.jpg)





!["17년 장사했는데 이럴 줄은" 비명…신촌에 무슨 일이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510/01.42192014.1.jpg)


![엄지성 이어 조규성·이한범도 포스텍 울렸다! 미트윌란, 노팅엄 원정서 3-2 승리…포스텍의 노팅엄, ‘패패무무패패’ 멸망 [유로파리그]](https://pimg.mk.co.kr/news/cms/202510/03/news-p.v1.20251003.f2964094c0e0447f84af28c5f48d0e9a_R.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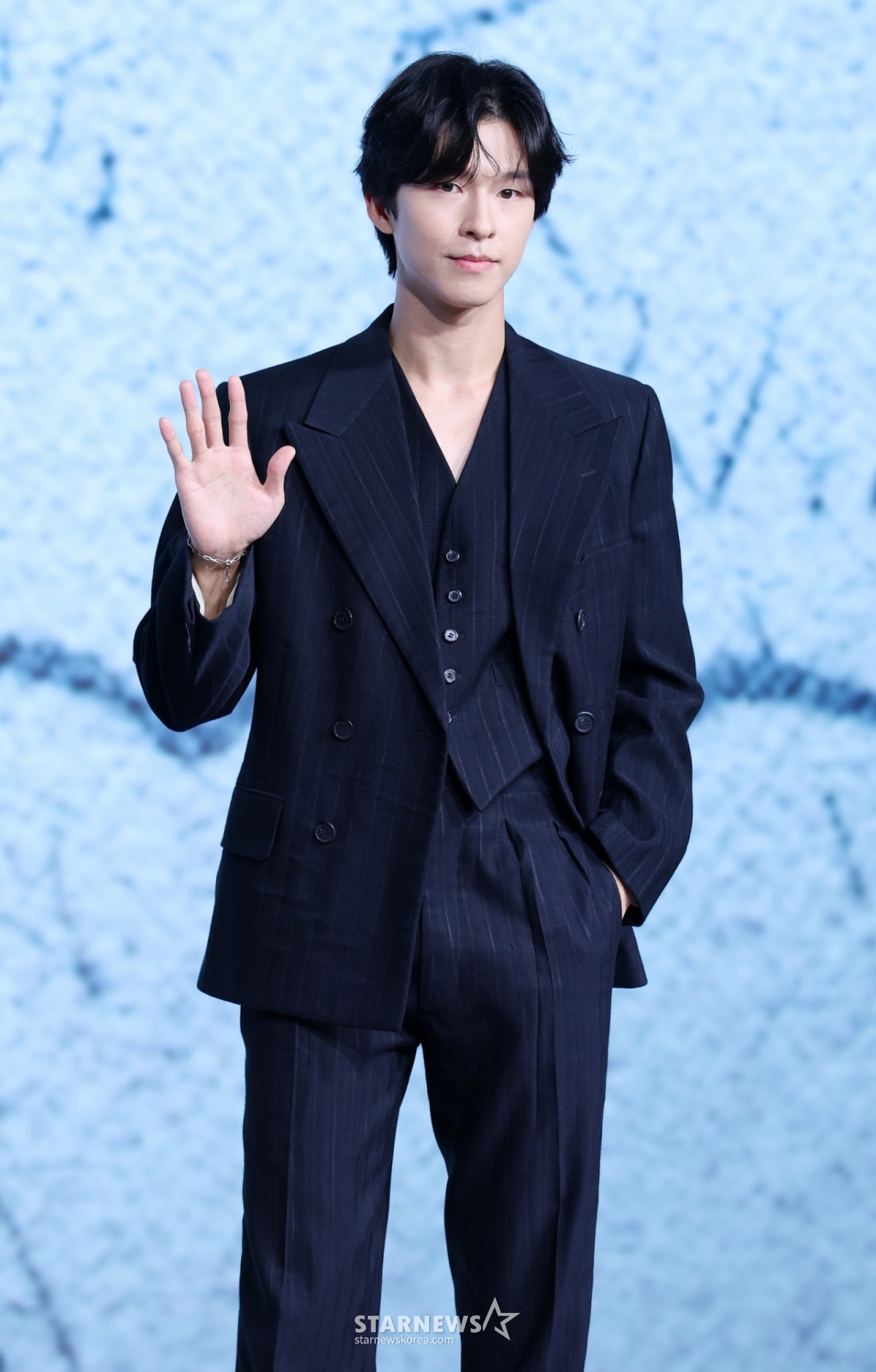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