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시대 첼리스트 중 최고는 누구일까. 이 질문이 나오면 꼭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바로 영국 첼리스트 스티븐 이설리스(사진)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요요마와 함께 그를 최고로 꼽는 음악가가 많다. 그라모폰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생존 첼리스트는 단 두 명인데, 요요마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설리스는 뛰어난 솔리스트이자 실내악 연주자다. 글쓰기에 재능이 있어 작가로 성공했고, BBC 라디오 진행자로도 유명하다. 미래 음악가를 길러내는 교육자로서의 열정은 말할 것도 없다. 팔방미인 첼리스트인 그의 매력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국내에선 그를 볼 기회가 뜸했다. 그런 그가 올여름 2025년 예술의전당 국제음악제 무대를 위해 내한했다.
◇100분간의 첼로 소나타 향연
이설리스는 지난 8일 서울 예술의전당 무대에 올라 100분간 첼로 소나타 향연을 펼쳤다. 그의 30년 음악 듀오인 피아니스트 코니 시와 함께였다.
공연 프로그램은 쇼스타코비치부터 카발렙스키, 라흐마니노프까지 모두 러시아 작곡가의 작품으로 채웠다. 그 중심에는 올해 서거 50주기를 맞은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소나타가 있다. 가장 대중적이며 첼로 소나타의 상징적인 곡이다. 이설리스는 쇼스타코비치의 기발한 리듬감과 유연함, 재치를 춤추듯 노래하듯 여유롭게 풀어냈다. 첼로 장인의 화려한 보잉(활 긋기)은 또 다른 볼거리였다.
카발렙스키의 첼로 소나타 역시 그의 팔색조 매력을 보여주기 딱인 곡이었다. 리듬과 기교, 서정성이 뒤섞여 혼란스러울 법하지만 그의 해석은 지루할 틈 없이 입체적이었다. 그는 이 곡을 “숨은 걸작이라고 불리는 곡이다. 쇼스타코비치에 견줄 만큼 훌륭한 곡”이라고 소개했다.
2부 첫 곡으론 줄리어스 이설리스의 발라드를 택했다. 이 곡엔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다. 그의 할아버지가 쓴 곡이다. “처음 그 곡을 누나와 연주하던 날이 기억나요.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말씀하셨어요. ‘네 할아버지가 지금 이 장면을 본다면 하늘을 나는 기분일 거다.’ 그 말은 아직도 제 마음속 깊이 남아 있어요.”
◇악기는 수단, 음악은 영혼
공연에 앞서 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난 이설리스는 스스로를 동료들과 함께 만드는 과정을 매우 중시하는 음악가라고 소개했다. 그는 좋아하는 음악가를 모아 앙상블을 이룬다. 피아니스트 코니 시와는 30년 된 음악 파트너다.
“코니가 17세일 때 캐나다 밴쿠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 뒤 제가 영국 콘월에서 진행한 마스터클래스에서 7년 넘게 반주자로 함께했고, 지금까지 저와 30년 가까이 같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은 그에게 “가장 오래된 음악적 형제”라고 했다. “그가 열아홉 살 되던 해 처음 연주했고, 지금까지 35년 넘게 함께 무대에 서 왔어요. 진심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새로운 작품에 대한 호기심과 추진력도 대단하죠.”
이설리스에게 첼로는 인간의 목소리에 가장 가까운 악기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첼로는 도구일 뿐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음악이라는 언어죠.”
음악은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중심축이다. “머릿속에는 항상 음악이 흘러요. 연습하지 않을 때도 음악을 듣고 있고, 제 감정의 가장 깊은 부분은 말보다 음악으로 더 잘 표현됩니다.”
그는 “음악가로 산다는 건 신과의 접촉”이라고 표현했다. “베토벤, 슈만, 바흐 같은 이들과 연결돼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삶은 충분히 가치 있어요.”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늘 아이디어가 넘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열정적인 그는 슈만과 포레를 더 알리고 싶다고 했다.
“모차르트나 바흐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슈만과 포레, 그 두 작곡가의 ‘후기 작품’은 정말 숭고한 음악입니다. 그 음악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게 요즘 제가 연주를 계속하는 이유이기도 하죠.(웃음)”
조민선 기자/사진=임형택 기자 sw75jn@hankyung.com

 2 days ago
4
2 days ago
4

![[포토] 기린빌라리조트, '스테이 앤 캠프 패키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8/PS25081201612.jpg)
![[포토] 행복공감봉사단, 발달장애 청소년 체육 활동 지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8/PS25081201606.jpg)
![[포토] 호텔 나루 서울 - 엠갤러리, 론진과 협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8/PS25081201604.jpg)




!["韓 떠나는 K애니 인재들… 정부·기업 과감한 지원 나서야"[만났습니다]②](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7/PS2507180001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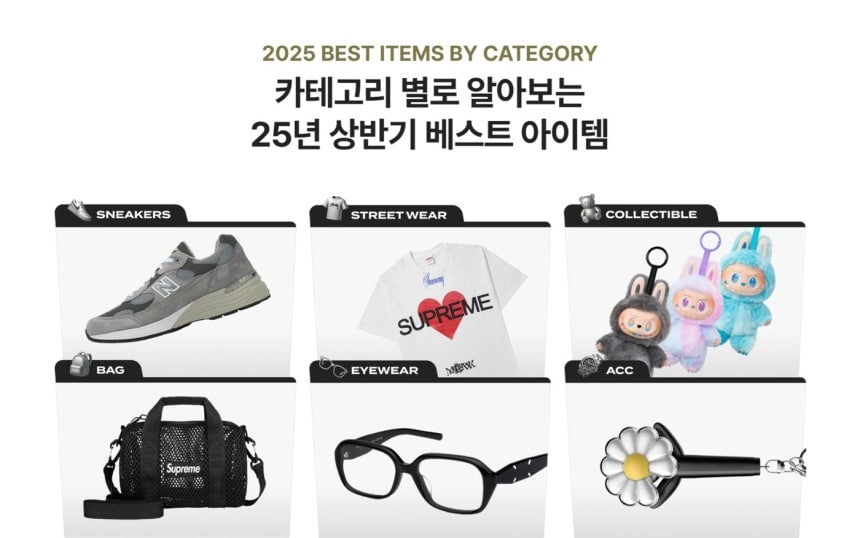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