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령층 계속근로’ 보고서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제 활용을
연차 쌓일 수록 높아지는 임금에
청년고용 악화∙임금 하락 부작용
고령층 근로자가 1명 늘면
청년층 근로자 1.5명 감소
재고용 때 GDP 하락폭 줄어
![서울 시내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취업게시판에 일자리 정보 없이 텅 비어 있다. [한주형 기자]](https://pimg.mk.co.kr/news/cms/202504/08/news-p.v1.20241209.0494956845e049fb8821f3d9e9fd83c6_P1.jpg)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위축시키고 임금 하락을 유도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과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이를 근거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기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연구는 정년 연장 정책이 시행된 2016년을 전후로 국내 고용 시장의 연령별 고용률과 임금 수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임금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을 연장한 결과 청년 고용 악화와 임금 수준 하락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2016~2024년 만 55~59세 임금근로자가 약 8만명 증가하는 동안 23~27세 청년 근로자는 11만명 줄었다. 고령층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최대 1.5명 감소한 것이다. 또 기업들이 고임금의 고령층 고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정년 연장 효과도 시간이 지나며 감소했다.
임금도 줄었다. 2013~2019년 중 임금 변화를 보면 고령층과 대체 관계가 높은 중장년층(36~54세)의 임금 감소폭이 컸고, 청년층 역시 유의미하게 줄었다.
오삼일 고용연구팀장은 “2016년 정년 연장 이후 청년 고용 위축, 조기퇴직 증가 등 부작용이 초래돼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화됐다”며 “성장 잠재력 저하, 고령층의 근로 의지, 은퇴 후 소득 공백 등을 고려할 때 고령층이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한은이 제안한 계속고용 방안은 일본식 퇴직 후 재고용이다. 정년이 된 근로자와 새 근로 계약을 체결해 임금·근로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고령층의 계속근로를 장려한다는 것이다. 오 팀장은 “작년 기준 약 38% 기업이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임금 연공성이 낮고 직무급 직능급을 운영하는 사업체일수록 재고용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은은 퇴직 후 재고용으로 고령자 고용이 늘어나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봤다. 기준 시나리오상 2034년 국내총생산(GDP)은 작년보다 3.3%포인트 하락하지만, 은퇴 연령대 근로자의 70%를 재고용할 경우 하락폭은 1.9%에 그친다는 것이다. 또 근로자 개인 역시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형 노인 일자리에 종사할 때보다 월 179만원 임금이 많아지고,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1990년대부터 계속근로 로드맵을 점진적으로 도입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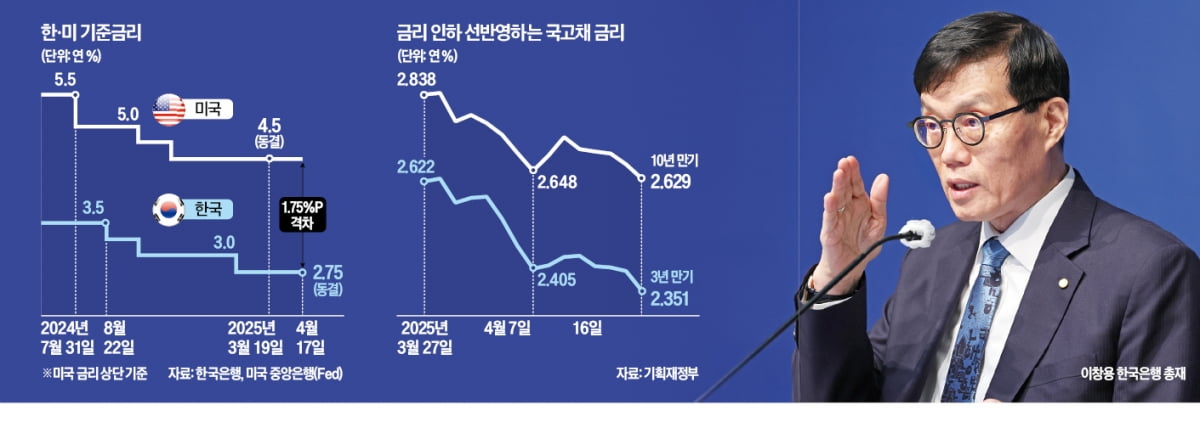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