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 연극, 시 등을 감상하다 눈물을 흘리거나 감명받아 깊은 숨을 내쉰 일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경험이다. <뇌가 힘들 땐 미술관에 가는 게 좋다>는 이런 예술적 경험을 뇌과학의 관점에서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을 쓴 수전 매그새먼은 존스홉킨스 의대 산하 국제예술마인드연구소 창립자다. 공동 저자 아이비 로스는 구글 하드웨어 제품 개발부의 디자인 부총괄이다.
![[책마을] 뇌를 위해 미술과 음악을 처방하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AA.39971076.1.jpg)
책은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우리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뉴런으로 이뤄진 상호 연결망이 있다. 뉴런은 서로 연결돼 정보를 주고받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바탕이 된다. 기억을 만들거나 무언가를 배울 때 어떤 연결은 자주 쓰여 강해지고, 어떤 연결은 쓰이지 않아 약해지면서 회로가 만들어진다. 이 현상이 신경 가소성이다. 같은 음악을 듣거나 같은 미술 작품을 보고도 누구는 눈물을 흘릴 때 다른 사람은 심드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가소성은 우리의 신체가 어떤 외부 자극에 노출되는지 중요한 이유기도 하다.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감각이 머릿속 감정과 생각의 흐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 원리는 예술적 경험을 통한 트라우마 치료에 적용된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감상하면 뇌를 명상과 비슷한 저자극 상태로 유도해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준다. 저자는 글을 쓰는 행위도 “감정과 느낌에 언어를 부여하는 행위가 살면서 겪는 힘겨운 사건들에 맥락을 입히고 그것을 더 잘 이해하도록 신경생물학적 수준에서 돕는다”고 설명한다. 예술은 간섭, 억압 등과 관련된 영역인 인지조절망의 활동을 증대하기도 한다. 트라우마 회복을 방해하는 자기비판과 자기판단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
예술 치료는 다양한 신경 문제에 대응하는 데도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통증을 낮추고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쓰인다. 춤으로 파킨슨병의 증상을 완화하고, 음악 치료로 신경을 자극해 치매 환자의 인지 감소를 늦추는 치료법도 있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사망 후 남겨진 가족들에게 치유할 통로를 제공하는 데도 예술 치료가 활용된다.
교육 면에서도 예술의 역할은 중요하다. 책은 음악 교육이 의사 결정을 관장하는 신경망 활동을 촉진한다고 설명한다. 성장기에 예술 교육을 받은 학생은 사회 정서적 기술이 발달하고 자기 생각, 행동, 감정을 조절하는 집행 기능이 향상됐다는 보고가 있다. 음악과 게임은 주의력과 학습능력 발달에도 영향을 끼쳐 자폐 스펙트럼 아이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효과적이다.
책은 예술이 삶의 질을 높인다고 느끼는 데는 신경생물학적 근거가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행복을 유발하는 감정을 여섯 가지 속성으로 구분한다. 호기심, 경이로움, 경외심, 풍부한 환경, 창의성, 의식, 참신함, 놀라움이다. 이런 감각은 호기심을 품고, 그 호기심이 해소될 때 느끼기 쉽다. 미술과 공연 감상은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쉬운 행위다.
예술은 공동체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초기 인류 시절부터 예술적 표현은 유대감을 공유하고 사회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쓰였다.
구교범 기자 gugyobeom@hankyung.com

 3 days ago
6
3 days ago
6


![윤형빈 "15년 만에 '소극장' 폐관…아내 정경미 격려에 울컥" [인터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40000351.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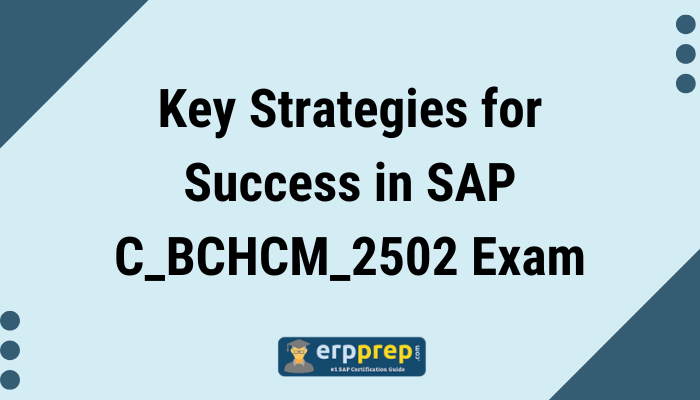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