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관을 쪼개면 금융회사 입장에서 ‘시어머니’만 늘어나는 꼴이다. 산업 경쟁력이 크게 후퇴할 텐데 걱정스럽다.”
3일 한국경제신문이 금융산업 관련 협회장 5명에게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묻자 협회장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업무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금융정책(재경부), 금융감독(금융감독위원회), 건전성 관리(금감원), 소비자 보호(금융소비자보호원) 등 업무별로 4개 감독기관으로 쪼개질 전망이다.
금융권이 감독체계 개편에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각종 사태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의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협회장은 “과거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이 쪼개져 있던 노무현 정부 때 ‘카드 사태’가 벌어지자 부처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문제 해결이 늦어졌다”며 “당시 경험에 대한 반성으로 현 체계가 구축됐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B협회장은 “소상공인, 가계부채 문제 등 시급한 과제가 많은데 감독체계 개편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을까 봐 우려된다”고 했다.
금융정책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C협회장은 “금융회사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마다 감독기관별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데 하세월일 것”이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시행이 어려워진다”고 꼬집었다. 감독기관마다 상충된 지시를 할 경우 금융사의 혼란만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대한 우려도 상당했다. D협회장은 “조직이 새로 생기면 확대하고자 하는 특성상 일거리를 계속 만들어낼 것”이라며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무너지는 사례가 속출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E협회장은 “금융회사는 감독기관이 늘어난 만큼 대응 인력과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금융업권의 목소리가 배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E협회장은 “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인데 아무런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오랜 기간 굳어진 감독체계를 바꿔서 얻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감독기구만 이원화하는 방식으로는 감독 공백과 금융사고를 근절할 수 없고 책임 회피, 중복 규제 등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형교/박재원/나수지 기자 seogyo@hankyung.com

 7 hours ago
1
7 hours ago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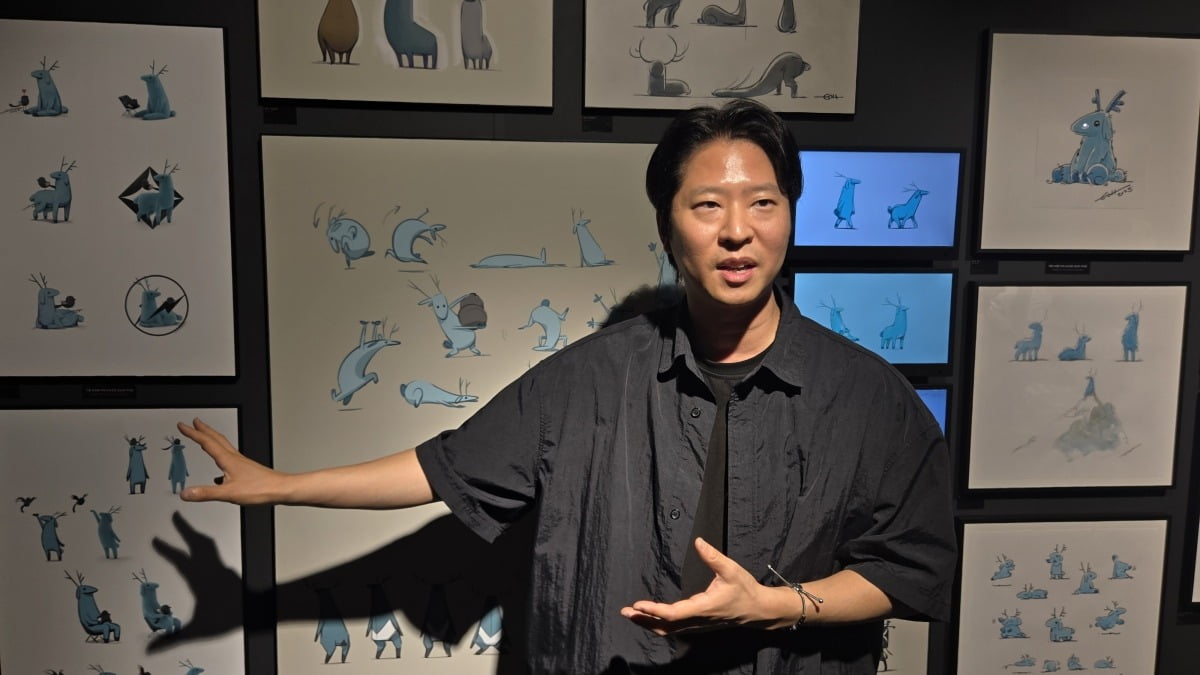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출규제는 맛보기, 추가 대책 더 있다"](https://image.edaily.co.kr/images/content/defaultimg.jpg)





![[속보]李대통령, G7 참석차 내일 출국…“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 조율”](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6/15/131807427.2.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