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 프리셀 트리오(Bill Frisell Trio)의 기타리스트 빌 프리셀은 재즈 기타의 지형을 40년 넘게 개척해온 인물이다. 미국 볼티모어 태생으로, 1980년대 ECM 레코즈를 통해 이름을 알렸고, 포크·아메리카나·클래식·록 등 다양한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기타 사운드의 영역을 확장해왔다. 그의 기타 톤은 따뜻하고 서정적이며 동시에 실험적인 감성이 공존한다. 이번에는 토머스 모건(베이스), 루디 로이스턴(드럼)과 함께 다음달 19일 자라섬재즈페스티벌 무대에서 22년 만의 내한 공연을 갖는다.
“기계가 음악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를 소화하는 연주자의 영혼까지 복제할 순 없어요.” 빌 프리셀은 최근 아르떼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AI는 순간을 흉내 낼 수 있어도 진짜 교감은 못 따라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리셀은 음악을 생성해내는 AI 기술의 발전은 놀랍지만, 그가 지켜온 음악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했다.
“사람 사이의 교감에는 온도, 긴장감, 냄새 같은 수많은 요소가 있어요. AI는 그것을 느낄 수 없죠.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생겨나는 미묘한 감정과 흐름, 그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 도심이 아니라, 섬에서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세트리스트 없이 그날의 흐름대로 연주합니다. 자라섬이라는 무대가 우리의 음악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빌 프리셀에게 기타는 단순한 연주 도구가 아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 채널 NPR이 그를 ‘기타로 이야기하는 시인’이라 부른 이유도 그래서다. 기타로 말하고, 숨 쉬고, 감정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성이 드러난다고 확신한다.
재즈, 포크, 록, 클래식까지. 빌 프리셀의 음악은 장르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확장해왔다. 장르를 구분하는 건 그에게 무의미하다. “사람들은 흔히 ‘이건 재즈다’ ‘이건 록이다’라고 나누려 하지만,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한 덩어리에요. 마치 숲처럼, 모든 것이 함께 존재하는 거죠.”
이 같은 철학은 오케스트라와 협업한 경험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의 트리오와 편곡자 마이클 깁스,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무대는 “하나의 세계 속에서 자유롭게 연주한 경험”으로 남아 있다. “악보가 있는 클래식과 즉흥적인 재즈가 한 무대에 올라갔지만, 어떤 제약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 세계 안에서 마음껏 놀 수 있었죠.”

최근 미국 재즈 씬에 대한 질문에 그는 “요즘 젊은 연주자들이 기술을 넘어 ‘깊이’를 본다”며 깊은 존경심을 드러냈다. 정보 접근성이 높아진 시대에 자라난 젊은 연주자들이 기술적 능력뿐 아니라 음악의 영적인 힘과 본질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
“예전에는 음반 하나를 찾으려 몇 번이나 가게를 들르기도 했어요. 지금은 클릭 몇 번이면 모든 음악에 접근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젊은 연주자들은 그 너머를 봅니다. 음악의 진정한 힘을 알고 있어요.” 그는 또 “재즈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라섬에서 보여줄 이들의 무대는 100% 즉흥연주다. 무엇을 연주할지 미리 알지 못한 채 그 순간의 음악이 만들어진다.
“연주를 시작하면 토머스가 소리를 내고 제가 반응하고… 오늘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즉흥의 섬 자라섬에서 만나요.” 기계가 흉내 낼 수 없는 것. 그날의 온도, 타인의 숨결, 그리고 우연이 만든 공감의 순간이 자라섬에서 펼쳐진다.
조민선 기자 sw75jn@hankyung.com

 4 hours ago
1
4 hours ago
1
![[포토] '2025 한돈런' 이하평과 윤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9/PS25092201063.jpg)
![[포토] '2025 한돈런' 베스트드레서 상](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9/PS25092201062.jpg)
![[포토] '2025 한돈런' 대성황](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9/PS25092201061.jpg)
![[포토] 코카-콜라, ‘원더플 캠페인’ 시즌6 ‘캠퍼스 챌린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9/PS25092201043.jpg)
![[포토] 코카-콜라, GS25 반값택배와 ‘원더플 캠페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9/PS25092201042.jpg)
![[포토] 농협유통-남서울농협, 고품질 축산 협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9/PS25092201037.jpg)




![[속보] 특검 “윤, 계엄논의 작년 3월부터 시작…원내대표도 인지 가능성”](https://pimg.mk.co.kr/news/cms/202509/03/news-p.v1.20250903.0f7ed213f6e645018311c6ea68869499_R.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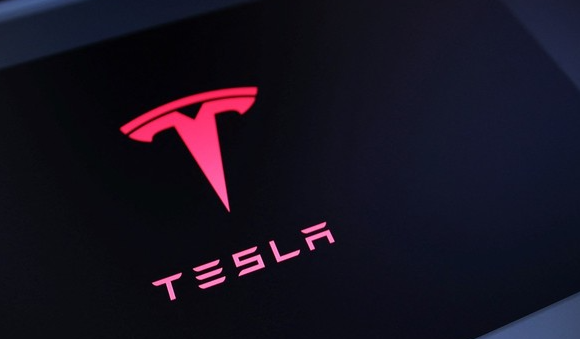
![생성형AI 끼고 상담하는 설계사…보험도 인공지능 혁신 진행 중[금융가 톺아보기]](https://pimg.mk.co.kr/news/cms/202509/04/news-p.v1.20250904.4e6ff2e473814eba97c10d2b6c1ee0e0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