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최근 9년 동안 연평균 10%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 신고자수에 연평균 2.5% 증가한 데 그친 점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만큼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평가가 많지만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도 높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9일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세(결정세액 기준)는 60조원으로 2014년(25조원)에 비해 2.4배가량 불었다. 근로소득세는 이 기간에 연평균 10% 불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근로소득 신고자는 2014년 1669만명에서 2023년 2085명으로 연평균 2.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만큼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진 것이다.
근로소득세가 불어난 것은 연간 총급여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가 증가한 결과다.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근로소득 신고인원 기준)는 2023년 253만명으로 2014년(103만명)에 비해 2배가량 불었다. 명목임금은 큰 폭 올랐지만 2008년 이후 변하지 않는 과표구간이 '소리 없는 증세' 역할을 했다. 근로소득세는 8단계 과표구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8800만원 이하는 6~24%, 8800만원 초과는 35~45%의 세율을 적용한다. 8800만원을 기준으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여기에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도 2009년에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 뒤 16년째 동결된 것도 소득세 부담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명목임금이 뜀박질하면서 세금은 더 내지만 치솟은 물가를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되레 줄어드는 경우도 적잖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물가상승률·실질소득 증가율과 세 부담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과세 구조의 형평성과 부담 수준을 점검하고 세 부담의 형평성·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체계를 개편해 직장인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야당은 소득세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3일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표구간에 물가 증감분을 반영해 과표를 변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한 논의도 민주당 안에서 진행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증가했다"며 "이러니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개편 작업에 따라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소득세를 깎는 것보다 면세자 비율을 우선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23년 기준 근로소득자 중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33%로 일본(2020년 15%)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점도 이 같은 개편 작업에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2 weeks ago
1
2 weeks ago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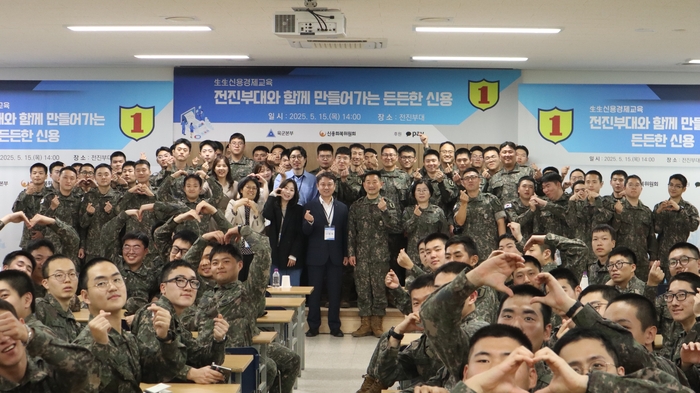
![美·이란 핵합의 기대감에 국제유가 급락 [오늘의 유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507527.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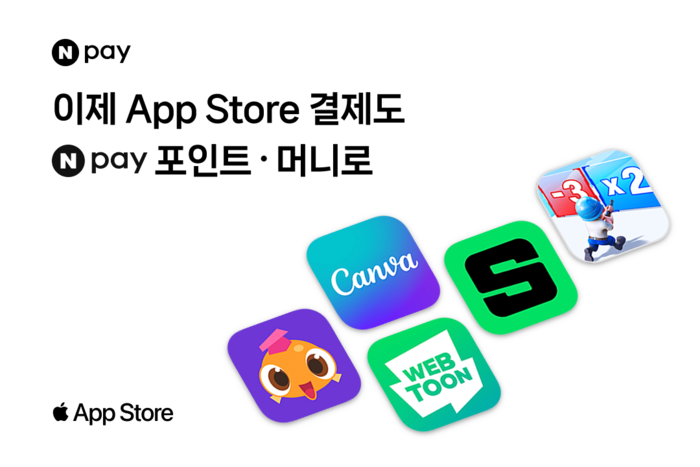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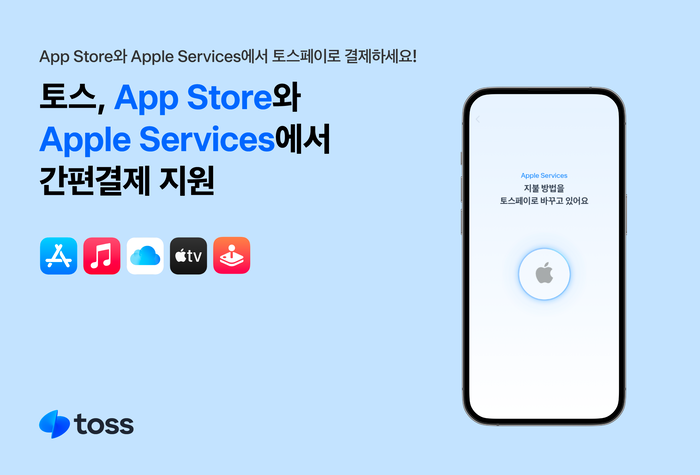








![“뭉클했다” 친정팀 환영 영상 지켜 본 김하성의 소감 [MK현장]](https://pimg.mk.co.kr/news/cms/202504/26/news-p.v1.20250426.d92247f59a8b45a6b118c0f6ea5157ef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