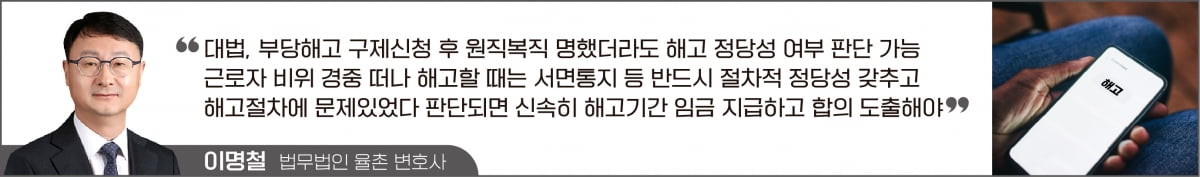
사용자가 어떤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에 이르렀다면 둘 사이의 관계는 이미 파탄상태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부부관계로 따지자면 이혼을 할 정도에 견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혼에서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상태에 이르렀더라도 예컨대 몇 년째 별거를 하더라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배우자, 즉 무책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혼은 성립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무리 깨졌더라도 해고가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해고는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서도 협의이혼 제도가 있어서 유책이냐 무책이냐 따지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처럼 노사 관계에서도 합의만 성립한다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는지, 징계위원회 절차가 정당했는지 등 일체의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 없이 깔끔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기왕 헤어질 바에 쿨한 이혼이 장려되는 것처럼 노사관계에서도 쿨한 이별이 이상적이다.
그런데 현실은 늘 이상과 다르다. 부부관계에서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은 처음에는 이혼에 응하지 않다가 재판 도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이혼에는 동의하되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적다고 치열하게 싸우는 경우가 꽤 있다.
노사관계로 상황을 바꾸어 보자.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고 원직복직을 요구하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회사로 돌아가는 건 싫고 금전으로만 보상받고 싶을 때 근로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
2007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였다(제30조 제3항). 위와 같은 금전보상명령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원직복직을 명하였다. 근로자가 회사로 복귀를 원치 않는 경우 원직복직은 실효적 구제가 아니라는 비판이 있었다. 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직복직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 그에 더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얹어서 지급하도록 명하는 금전보상명령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금전보상명령제도에 관하여 의미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지방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다. 상시근로자 60여 명을 사용하는 병원은 출장검진명령을 수차례 거부하고 병원의 승인없이 조기퇴근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환자들에게 산재보상신청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봉직의사(페이닥터)를 해고하였다. 그런데 문자메시지로만 해고 통지를 하였다. 의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병원은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 해고사유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병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해고하기 위해 의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복직 및 출근명령’을 보냈다. 그 후 의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전보상명령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병원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금전보상신청명령서를 송달받기 전에 복직명령을 하여 해고를 취소하였고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으므로 의사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의사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본 것이다. 금전보상명령과 원직복직명령의 관계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의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일 이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병원이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않은 이상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복직명령과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선후 관계,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 등은 그 구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사용자가 선제적으로 복직명령을 했더라도 노동위원회는 여전히 해고의 정당성을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복직명령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기 전에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보게 되면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함에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절차에서 해고의 부당 여부에 관한 판단도 받지 못한 채 다시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신속·간이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생각이 판결의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에서 사용자는 무엇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가.
첫째, 아무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더라도 해고를 할 때는 해고의 서면통지 등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자메시지나 카톡만으로는 서면통지를 갈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서면통지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서 대체적 통지가 허용될 뿐이다.
둘째, 해고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면 신속하게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근로자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라는 점이다. 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다시 해고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셋째,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 청구를 하였더라도 근로자는 마음이 바뀌어 회사로 복귀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임금 상당액에 더하여 위자료까지 지급하여야 할 수 있음을 대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고절차가 잘못되었을 때 원직복직을 명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유책 배우자가 신속하게 이혼을 하고 싶다면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을 적절히 해주고 협의이혼 도장을 찍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책 배우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명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 weeks ago
2
2 weeks ago
2













![“뭉클했다” 친정팀 환영 영상 지켜 본 김하성의 소감 [MK현장]](https://pimg.mk.co.kr/news/cms/202504/26/news-p.v1.20250426.d92247f59a8b45a6b118c0f6ea5157ef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