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청동의 고즈넉한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기와지붕과 마루, 창호지로 이루어진 한옥 전시관 ‘선혜원’이 모습을 드러낸다. SK창업주 최종건 회장의 옛집을 전시장으로 재탄생시킨 이곳은, 전통 건축 양식에 현대 예술의 울림을 담아낸 공간이다.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 김수자는 지난 5월 개장한 이 공간의 1호 작가로 <호흡-선혜원> 전시를 열었다. 그는 한옥과 현대 예술이 서로를 비추고 겹쳐지는 순간을 빚어냈다.

전각 ‘경흥각’의 마루와 바닥은 이번 전시의 중심이 되는 거울로 채워져 있다. 발을 디디는 순간, 관람객은 현실과 허상이 겹쳐진 또 다른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 관객은 발걸음을 뗄 때마다 물체에 꽂힌 하나의 바늘처럼 실재와 반사된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걷고, 호흡하고, 바라보는 모든 행위가 작품 속으로 스며드는 경험이다. 오랜 시간 접힘과 매듭을 통해 예술관을 보여준 김수자 작가의 보자기 작업처럼, 경흥각은 관람객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다. 이 ‘보자기적 사고’는 거울 설치를 넘어 전시 전반에 스며들면서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그의 작품과 호흡하도록 안내한다.
김수자는 “경흥각의 문을 열자마자 거울바닥 작업의 영감이 떠올랐다”고 했다. 고요한 건축과 반짝이는 거울이 만나, 시간과 기억, 존재와 정체성을 은은히 반추하는 장면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이번 전시에는 김수자의 대표 연작도 함께 소개됐다. <보따리>(2022)는 헌옷과 헌 이불 같은 일상적 직물을 이용해 물건을 싸고 묶는 행위를 조형 언어로 승화한 작품이다. 반복되는 싸고 묶는 동작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 내부와 외부, 나와 타인, 국가와 민족을 잇는 상징적 의미를 품는다. <연역적 오브제-보따리>(2023)는 달항아리를 모티프로 제작된 작품으로, 독일 마이센 도자기와의 협업을 통해 완성됐다. 보따리를 연상시키는 둥근 외형과, 작은 구멍만 남기고 텅 비워둔 내부는 어둠과 공허 속에서 논리가 형태로 귀결되는 연역적 사고를 조형 언어로 풀어낸다. 선혜원의 전시는 10월 19일까지 이어진다.
김수자 작가는 최근 강남 모처에 '스튜디오 김수자'라는 공간을 꾸렸다. 네온과 소음이 넘실대는 도심 한가운데, 스튜디오는 차분히 침잠할 수 있는 은신처가 된다. 총 2개층(지하 1층과 지상2층)에 전시 공간이 마련됐다.

지하 1층은 검정색 오브제와 작가의 손을 다룬 흑백 사진으로 채워졌다. 2013년 베니스 비엔날레 이후 작가가 천착해온 검정은 모든 것을 감싸 안으면서도 은은하게 빛을 내는 색이다. 보자기 작업과 맞닿은 검정의 깊이는 공간 전체에 잔잔히 퍼져, 관람객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인다. 2층에는 흑백의 공간과는 대조적으로 형형색색 유리 판넬 설치 작품이 전시됐다. 네모난 틀 속 다양한 색과 크기는 지하와 다른 공기를 만든다. 선혜원 경흥각에서 마주쳤던, 반사 설치 작품에 대한 경험도 여기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첨탑이 바닥에 끝없이 반사되는 설치물은, 거울 위 하나의 바늘로 서 있었던 기억을 관객에게 다시 환기한다.

선혜원과 강남 스튜디오는 서로 다른 얼굴을 지녔지만 같은 질문을 던진다. 예술은 어디에서, 어떻게 호흡할 수 있는 지. 고요한 한옥의 기억 속에서도, 빠른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예술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쉰다. 안과 밖, 전통과 현대, 고요와 소음, 실재와 반사, 삶과 죽음…. 선혜원의 거울바닥과 절제된 카타콤과 같은 강남의 공간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경계를 보여주며, 예술을 통해 우리가 숨쉬는 존재라는 걸 전한다.
이해원 기자

 1 day ago
2
1 day ago
2





![황보라 "이명 들리고 울렁, 공황장애인 줄 알고 병원 갔더니…" [건강!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510/03.35054006.1.jpg)
!["샤워는 하루에 한 번 아침에만 했는데…" 몰랐던 사실 [건강!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510/99.33832115.1.jpg)





![[단독] 만취해 운전대 잡은 30대 여성…중앙선 침범해 택시와 충돌](https://amuse.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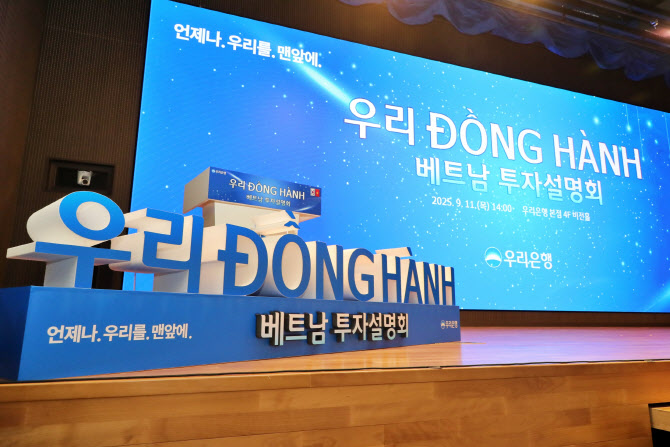
![JYP 박진영, 이재명 대통령 손 잡는다…“K팝 기회 살리려 결심” [이번주인공]](https://pimg.mk.co.kr/news/cms/202509/14/news-p.v1.20250910.34b4477db9874ff8a7eb9cb0d1087d7d_R.pn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