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개봉한 자파르 파나히의 ‘그저 사고였을 뿐’은 수수한 영화다. 스릴이 넘치지도 않고, 유머러스하지도 않다. 특유의 미장센이 돋보인다거나 영상, 음악적 쾌감이 뚜렷한 것도 아니다. 현실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적 리얼리즘이 유일한 무기다. 영화를 도구 삼아 억압적 현실에 맞서는 사회적 메시지로 관객 가슴에 불을 지른다.
시작은 이렇다. 늦은 밤 만삭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을 태우고 운전하던 에크발(에브라힘 아지지 분)이 떠돌이 개를 차로 친다. 야심한 시각이라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고, 개가 갑자기 뛰어들었을 뿐 목숨을 앗을 의도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나지막이 말한다. “그저 사고였을 뿐”이라고.
사고의 여파로 차가 고장 나자 에크발은 인근 정비소에 들른다. 정비소 주인 바히드(바히드 모바셰리 분)는 삐걱대는 소리를 듣는 순간 놀라서 얼어붙고, 분노에 휩싸여 납치극을 벌이기 시작한다.
에크발은 한쪽 다리가 없다. 그의 이름 ‘에크발’은 ‘의족’이라는 뜻이다. 절뚝이는 다리에서 새어 나오는 마찰음은 에크발이 만드는 소리다. 이 쇳소리가 바히드의 트라우마를 끄집어내는 방아쇠가 된다. 바히드는 늘 한 손을 허리춤에 짚고 다니는 습관 때문에 물주전자 손잡이라는 우스꽝스러운 별명을 달고 사는데, 이건 임금 체불 문제로 항의하다 수감된 그가 고문을 받아 생긴 신장질환 때문이다. 그리고 그를 고문한 정부 정보관이 바로 의족을 찬 남성이었다. 비록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바히드는 에크발이 자신을 잔인하게 괴롭힌 고문관이라고 확신한다.
바히드는 에크발을 납치한 뒤 친구에게 빌린 승합차에 싣고 고문 피해자를 찾아간다. 사진작가 시바(마리암 압샤리 분), 곧 결혼식을 올릴 골리(하디스 파크바텐 분), 시바의 전 연인이자 불같은 성격을 가진 하미드(모하마드 알리 엘리아스메르 분)다. 어두운 과거를 애써 외면한 채 살아가던 이들은 에크발(로 추정되는 남성)의 등장에 당황한다. 죽여야 할지, 살려서 돌려보내야 할지 딜레마에 빠진 그들은 갈등하고 반목한다.
영화는 로드무비 틀에 블랙유머를 곁들였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는다는 두려움에 떠는 시민들은 서로를 의심한다. 권력에 의한 폭력은 시민 사이에서도 전염병처럼 퍼져 나간다.
영화는 이란의 현실을 실감 나게 그려냈다. 파나히부터가 반정부주의자라는 낙인과 함께 오랜 기간 영화 제작 금지, 가택연금, 출국금지 처분 등 정부 억압을 받아온 터여서 연출은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당장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서사도 실제로 파나히가 반체제 운동 혐의로 체포됐을 당시 함께 수감된 이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반영해 만들었다.
파나히가 던지는 메시지는 “그건 그저 사고가 아니었다”로 요약할 수 있다. 폭력과 고통을 더 이상 신의 뜻이나 사소한 사고로 포장해선 안 된다는 것. 중요한 것은 그다음이다. 어제의 망령이 오늘을 붙잡고 내일까지 망가뜨리는 악몽 같은 현실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파나히가 제시하는 해답은 증오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용서할 줄 아는 용기’다. 영화에서 에크발을 나무 아래 묶어놓은 바히드는 상처와 의심, 보복의 욕망이 뒤엉킨 자리에서 “너 때문에 얼마나 고통 받았는지 아느냐”고 소리치면서도 결코 에크발이 했던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것처럼.
유승목 기자 mok@hankyung.com

 13 hours ago
2
13 hours ago
2




![황보라 "이명 들리고 울렁, 공황장애인 줄 알고 병원 갔더니…" [건강!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510/03.35054006.1.jpg)
!["샤워는 하루에 한 번 아침에만 했는데…" 몰랐던 사실 [건강!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510/99.33832115.1.jpg)






![[단독] 만취해 운전대 잡은 30대 여성…중앙선 침범해 택시와 충돌](https://amuse.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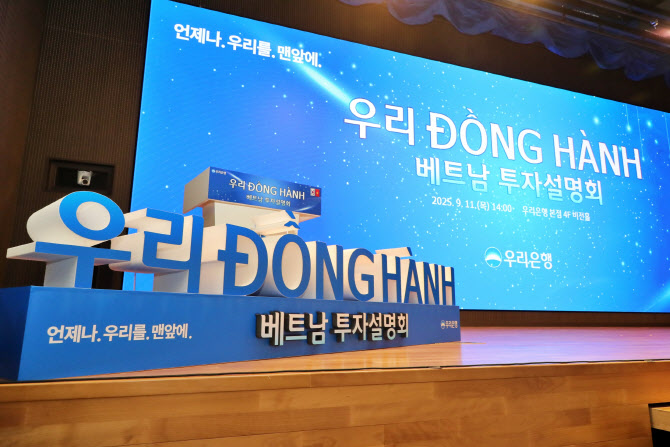
![JYP 박진영, 이재명 대통령 손 잡는다…“K팝 기회 살리려 결심” [이번주인공]](https://pimg.mk.co.kr/news/cms/202509/14/news-p.v1.20250910.34b4477db9874ff8a7eb9cb0d1087d7d_R.pn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