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4/28/news-p.v1.20250428.8c158face497460d86337837252d99b5_P1.png)
불경기가 아닌 적이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은 누가 느끼기에도 좋지 않다. 내수가 쪼그라들고, 소비가 줄고, 그래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더 고달프다. 이 위기가 빨리 끝나길 바라며, 일단 해야 할 일은 버티는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금융, 즉 대출은 어려울 때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이다.
은행권은 ‘역대급 실적’을 내며 호황을 맞고 있다. ‘라이선스’를 받아 한정적 경쟁을 하는 은행은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사람에게 대출을 내어주는 것이 의무이고 상생이다. 그런데 은행들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을 좀처럼 늘릴 생각을 안 한다.
은행의 탐욕 때문일까. 실상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르다. 은행이 중심이 되고 있는 금융지주들은 작년부터 꾸준히 ‘밸류업’ 압박을 받아왔다. 쉽게 말하면 기업가치를 높이자는 것인데, 그 핵심 중 하나가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다. 어려운 말 같지만 결국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은행이 망해나갔던 경험이 있는 한국의 금융당국이 자본을 최대한 확보해 위험에 대비하라고 하는 것이고, 은행 입장에선 이 CET1 비율을 높여 주주들에게 최대한 많이 환원해야 하는 숙제를 받아든 것이다.
CET1 비율은 위험가중자산(RWA)이 많으면 낮아진다. 연체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많이 내어줄 때 그렇게 된다. 당국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CET1 비율 13% 전후 선을 사수해야 하는 금융지주들은 돈이 있어도 이 비율이 깨질까봐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을 내어주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작년 말부터 뚝뚝 떨어진 원화값은 CET1 관리에 어려움을 안겼다.
13%라는 숫자는 무엇을 말해줄까. 은행이 보유한 위험자산 투자금액에서 보통주로 조달한 자본의 비율이다. 이것이 13% 전후면 대략 안전하다는 뜻이다. 은행의 자본건전성이 꽤 좋다는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이것이 금융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숫자인가. 그렇지 않다. 경기가 어려울 때 때로는 숫자를 넘어서는 금융의 역할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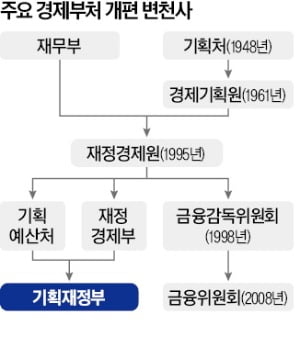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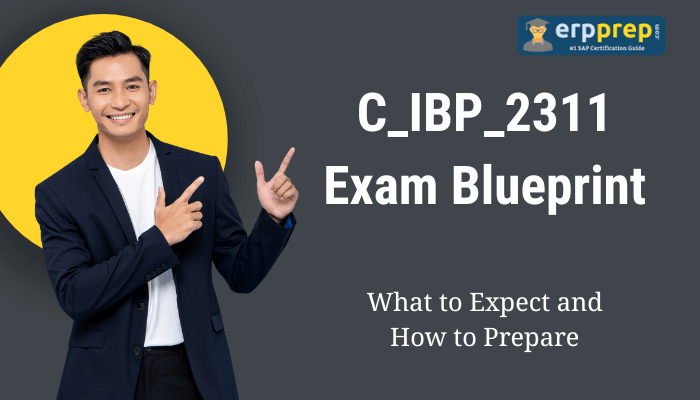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