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것은 물 위에서 시작됐다. 영원을 노래하던 제국이 무너지자 난민들은 찬란했던 문명의 씨앗을 품에 안고 도망쳤다. 걸음 끝에 마주한 건 아드리아해와 닿은 땅끝 늪지대. 로마의 후예들은 훗날 ‘라구나 베네타’(베네타 석호)라고 이름 붙인, 이 척박한 뻘밭에 발을 내디뎠다. 바다와 싸울 운명을 택한 그들은 배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무를 실어 날랐다. 나무 기둥을 박아 지반을 다지고, 그 위에 돌을 얹었다. 습지는 한 움큼의 땅이 됐고, 어느새 섬으로 커졌다. 그렇게 ‘물 위의 도시’(La città sull’acqua) 베네치아가 태어났다.


옛 서로마제국의 잔불에서 출발한 베네치아는 천 년 넘게 예술의 불씨로 타올랐다. 수평선 너머로 숨는 태양이 파도 위에 흩뿌린 황혼의 낭만을 작가들은 시로, 화가들은 그림으로 찬미했다. 틴토레토, 엘 그레코가 이곳에서 서양 회화의 뿌리를 내렸고 클로드 모네는 “이 도시는 너무나 아름답다”며 캔버스를 감탄으로 적셨다. 베네치아를 여행하며 음악가 구스타프 말러의 부고를 접한 소설가 토마스 만은 걸작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을 남겼다.
베네치아를 상징하는 깃발엔 사자와 여섯 기둥이 새겨진다. 오랜 세월 섬을 지탱한 여섯 개의 땅(sestieri)을 뜻해 왔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베네치아를 지탱하는 건 이런 물리적 기초가 아니다. ‘베네치아 비엔날레’라는 이름 아래 모인 미술, 건축, 무용, 음악, 연극, 그리고 영화라는 여섯 개의 예술 장르 축제가 만든 정신적 고양감이 21세기 베네치아를 달군다.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현대적인 예술은 영화다. 1932년 베네치아는 일찌감치 스크린이라는 빛의 장막을 껴안아 세계 최초의 국제영화제를 세웠다. 매년 여름 끝 무렵이면 거장 감독과 스타 배우들은 ‘택시 아퀘오’(수상택시)를, 시네필들은 ‘바포레토’(수상버스)를 타고 리도섬 ‘팔라초 델 시네마’(영화의 궁전)’로 발을 들인다. 수십 년째 되풀이되는 베니스영화제만의 오랜 풍경이다.
지난달 27일 개막해 11일간 펼쳐지는 올해 영화제에서 돋보이는 건 단연 한국 영화다. ‘미장센의 대가’ 박찬욱이 배우 이병헌, 손예진 등 동방의 별을 이끌고 등장해 신작 ‘어쩔수가없다’로 20년 만에 황금사자상 쟁탈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국 영화 르네상스이던 2000년대 초반 제작된 ‘지구를 지켜라!’는 할리우드 대작 ‘부고니아’로 다시 태어나 첫선을 보였다.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를 가봤다. 아드리아해의 바람이 뺨을 스치는 리도섬 해안가에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다. 이곳에서 한국 영화의 맥박이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음을 목격했다.
베네치아=유승목 기자 mok@hankyung.com

 2 weeks ago
3
2 weeks ago
3
![[오늘의 운세] 2025년 9월 23일 별자리 운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9/PS25092300086.jpg)
![[오늘의 운세] 2025년 9월 23일 띠별 운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9/PS25092300085.jpg)
![바흐부터 쇼스타코비치, 젊은 거장들의 클래식 향연[문화대상 이 작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9/PS25092300054.jpg)


![[포토] 서울숲재즈페스티벌2025](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9/PS25092201243.jpg)




![[속보] 특검 “윤, 계엄논의 작년 3월부터 시작…원내대표도 인지 가능성”](https://pimg.mk.co.kr/news/cms/202509/03/news-p.v1.20250903.0f7ed213f6e645018311c6ea68869499_R.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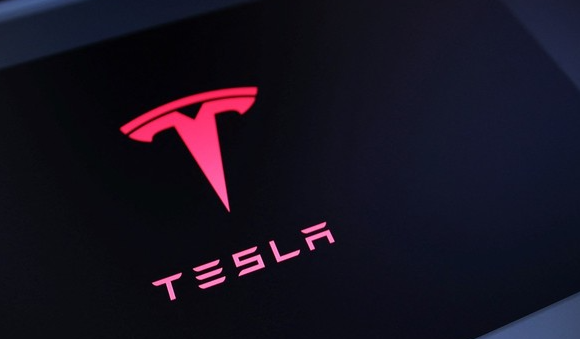
![생성형AI 끼고 상담하는 설계사…보험도 인공지능 혁신 진행 중[금융가 톺아보기]](https://pimg.mk.co.kr/news/cms/202509/04/news-p.v1.20250904.4e6ff2e473814eba97c10d2b6c1ee0e0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