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사모펀드(PEF) 업계가 회수 전략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추후 기업공개(IPO)를 통한 전통적 회수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00% 공개매수’ 의무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중견 운용사들을 중심으로 전략적 투자자(SI)에게 매각하거나 비상장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 (이미지=챗gpt) |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는 하반기 IPO를 계획했던 포트폴리오 기업에 대해 상장을 잠정 보류하거나, SI 매각을 통해 자산을 회수하는 구조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배당 수익과 비상장 자산매각을 병행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번 흐름의 중심에는 상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있다. 지난 3일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6월, 경영권과 무관하게 상장사 지분을 25% 이상 확보할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사실상 ‘100% 의무공개매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다.
한 PE 업계 관계자는 “상장 후 경영권을 넘기려는 상황에서 공개매수 부담이 강화되면, 재무적 투자자(FI) 입장에선 회수가 극도로 어렵다”며 “특히 지분 30% 미만을 보유한 구조에선 사실상 경영권 이전 자체가 막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상장 후 경영권 매각을 염두에 두던 다수 운용사들이 전략 수정에 나선 모습이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IPO 이후 FI 지분에 보호예수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100% 공개매수 원칙까지 적용되면 분산 매각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라며 “이런 환경에선 IPO보다 차라리 SI에 통으로 넘기거나, 비상장 상태에서 배당·자산매각 방식으로 회수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일각에선 제도 개편이 투자 전략뿐 아니라 PEF 업계의 판도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공개매수 의무가 강화될 경우, 시가총액 5000억원 기업의 경영권 인수를 위해 8000억원 이상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형 이하 펀드사로선 사실상 진입이 어려운 구조다.
중견 운용사 관계자는 “운용하는 펀드 사이즈에 따라 체감하는 정도가 매우 다를 것”이라며 “100% 공개매수는 회수 전략의 ‘장벽’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상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을 두고 업계에선 ‘변화의 전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제도가 확정되지 않아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고, FI로서의 투자·회수 방식은 점차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중형 PE 관계자는 “지금은 FI 입장에서 회수 전략이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민감한 시점”이라며 “지금과 같은 규제 환경이 유지되면, 대형사 중심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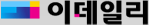 2 days ago
4
2 days ago
4


![[마켓인]KKR, 英 스펙트리스 인수 속도…글로벌 IB들 인수금융 가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7/PS25071000404.jpg)












![이준영·아이들 슈화·크래비티 앨런·키키 수이, 'ACON 2025' MC 발탁[공식]](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7/2025070309484071779_6.jpg/dims/optimiz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