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공급 수준을 따지는 대표적 통계는 '주택 보급률'이다.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해 산출한 값으로, 공급 현황을 보여주는 양적 지표로 널리 쓰인다. 주택 재고가 거주 가구에 비해 많으면 100을 넘고, 부족하면 그 아래로 떨어진다.
한국은 2023년 기준 전국 주택 보급률이 102.5%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2019년 이후 4년 만의 반등이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으니 공급이 충분한 걸까.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 주택 보급률 통계에 외국인 가구 등이 빠지는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 보급률 102.5%로 반등했다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주택 보급률은 2019년 104.8%를 정점으로 2022년까지 3년 연속 하락하다가 2023년 소폭 반등했다. 지역별로는 경북(113.1%), 전남(112.6%), 충남(111.7%) 순으로 높았다. 서울(93.6%), 대전(96.4%), 인천(99.1%), 경기(99.3%) 등 수도권과 대전은 100을 밑돌았다.
2019년만 해도 전국에서 주택 보급률이 100% 아래인 곳은 서울뿐이었는데 주택 부족 지역이 확대된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1인 가구 증가다. 서울 인구는 2015년 1002만2000명에서 2023년 938만6000명으로 6.3%(63만6000명) 줄었는데, 같은 기간 가구 수는 378만여 가구에서 414만여 가구로 9.5% 늘었다. 특히 1인 가구는 112만여 가구에서 162만여 가구로 44.6% 급증했다.
주택 수요는 단순한 인구보다는 가구 수에 더 민감하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구 수가 늘고 있는데 주택 공급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주택 보급률을 따질 때 실제 가구가 현실보다 적게 반영된다는 지적도 있다. 주택 보급률을 계산할 때 활용하는 '일반 가구 수'에 외국인 가구는 제외되고 있어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약 246만 명에 이른다. 단기 체류자뿐만 아니라 중장기 체류자도 있고, 이들도 가구를 구성하고 주택도 필요한데 보급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또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질'까지 담보된 수치는 아니다. 노후화된 주택이 늘어나면 더 넓고 쾌적한 곳으로 이사하려는 수요는 늘어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삼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437가구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하위권이다.
경북(509.6가구)과 전남(502.6가구)은 상대적으로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 많은 편이다. 반면 경기(395.5가구), 인천(406.8가구), 서울(413.3가구) 등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적다.
소득 대비 임대료는 15.8% 수준
2023년 기준 월 소득에서 월세 등 주택임대료로 지출하는 비율(RIR·월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은 15.8%로 분석됐다. 2022년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수도권은 2022년 18.3%에서 2023년 20.3%로 상승했다. 광역시도 같은 기간 15.0%에서 15.3%로 비율이 상승해 주거 부담이 늘었다.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6.3배로 전년과 같았다. 수도권 PIR은 8.5배, 광역시는 6.3배 수준이다. 수도권에서는 8.5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주택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하위계층의 PIR은 1년 전보다 1.3배 하락해 주택 구매 가능성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환경도 일부 개선됐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3.6%로 전년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이 비중은 2018년 이후 지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1인당 주거 면적은 31.4㎡로 전년(30.9㎡)보다 0.5㎡ 증가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1 day ago
2
1 day ago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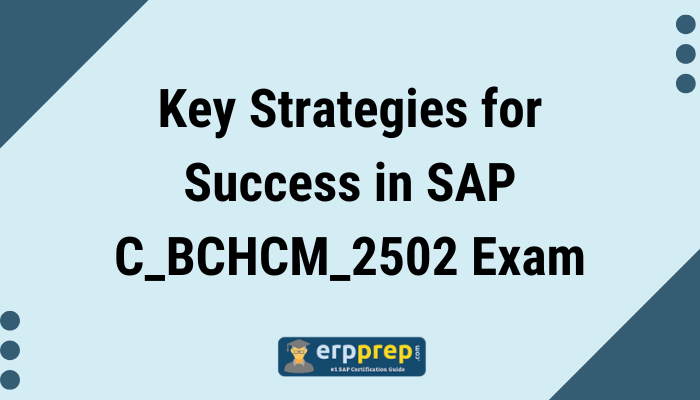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