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누구를 위한 정년 연장인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7.32519856.1.jpg)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5년 연장해 달라고 한다. 정치권도 원론적으로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정년 연장은 퇴직과 연금 개시 간 시차로 발생하는 퇴직자들의 소득 공백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2025년 현재 국민연금 개시 연령은 63세(1962년생)고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늘어난다. 또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이같이 적당한 명분이 있는 정년 연장을 정치권이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에서 정년 제도의 시작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먼저 공공기관이 적용했고 민간 기업이 뒤를 따랐다. 처음에는 55세로 시작해서 58세로 늘어났다. 관행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하던 정년 제도는 2016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통해 법제화되면서 동시에 정년도 60세로 늘었다.
한국의 정년은 정규직 및 호봉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나이를 우선시하는 문화에서 근속 연수에 따라 월급이 올라가는 호봉제는 자연스러운 임금체계였다. 하지만 호봉제는 나이가 들수록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높아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기업은 일정 나이가 되면 근로자의 고용을 종료하는 정년이 필요했고, 대신 근로자는 정년까지 해고로부터 자유로운 정규직의 안정성이 필요했다.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는 시기에는 정년, 호봉제, 정규직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 상황에 맞게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해졌다. 그렇지만 한국은 이 문제를 비정규직 도입으로 비껴가며 정년제 정규직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시작됐다.
문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아래 정년 연장은 기업보다도 잠재적 근로자인 청년층에 피해를 줄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기업이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대신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면, 청년이 원하는 정규직 일자리는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한다.
그와 같은 일은 2016년 정년 연장에서 실제로 벌어졌다. 최근 한국은행의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6년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을 심각히 위축시켰다. 특히 정년 연장으로 고령 근로자 한 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약 한 명이 감소했고, 이런 효과는 대기업과 같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한다.
물론 정년 연장은 기존 정년제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준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라는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이 혜택이 청년층 피해를 상쇄하고 남는다면 정년 연장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의 혜택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주로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에 국한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정년제를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21%에 불과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노조가 있거나 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이다.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에서는 정년제가 유명무실하다.
정년 연장으로 청년층 일자리가 감소하고 대신 대기업 근로자의 생애 소득이 증가한다면 소득의 한계효용 체감을 고려할 때 사회 후생은 감소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에 따른 양극화와 불평등 악화까지 고려한다면 현시점에서 정년 연장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새로 들어설 정권이 기득권층보다는 청년층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청년층의 희생으로 고연봉 노조원이나 대기업 근로자인 기득권층의 이권을 강화하는 정책임을 주지하기 바란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정년제 정규직을 유지하는 한 평균수명 증가와 인구 노령화의 물결 속에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지만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경직성을 오히려 강화하는 정년 연장 방안은 지양해야 한다.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자율적 재고용을 유도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선택지가 될 수 있다.

 7 hours ago
1
7 hours ago
1
![[서욱진 칼럼] '똘똘한 한 채'와 빈집의 나라](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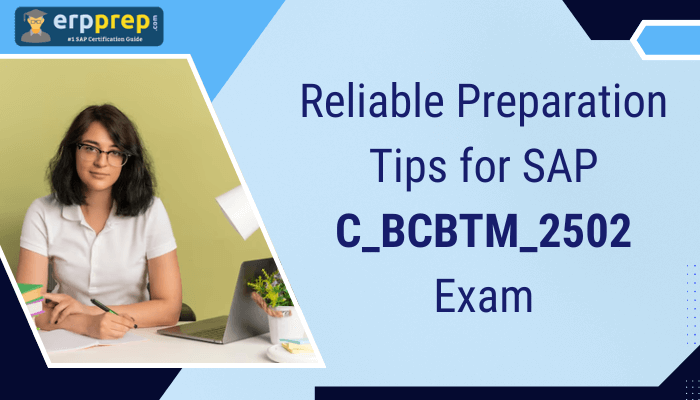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